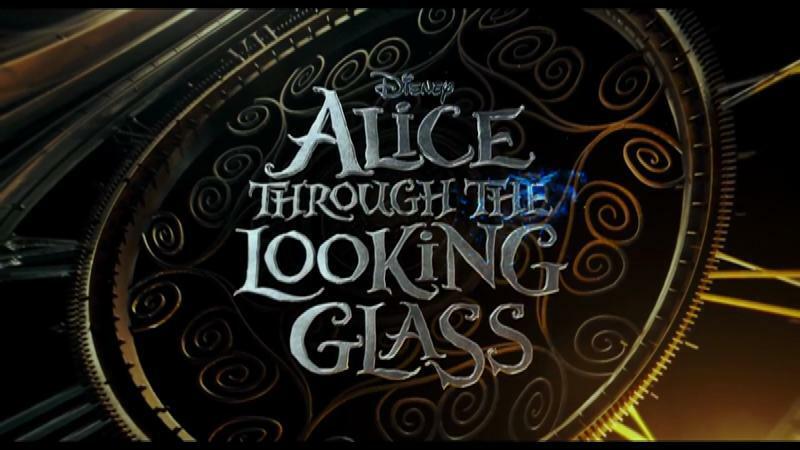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두 번째 이야기로 원작도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이야긴데 영화로는 거기에 보는 상상과 듣는 상상을 덧입혀서 만들었다. 루이스 캐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피터 팬을 만들어낸 제임스 배리의 이야기인 ‘네버랜드를 찾아서’를 보면 이 상상력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잘 나와 있다. 네버랜드를 찾아서는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작품보다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피츠 제럴드도 그렇고 헤밍웨이, 백석이나 조지아 오키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는 시간, 시계에 관한 이야기다. 하루키의 에세이 ‘시계의 조촐한 죽음’을 읽어보면 단순한 시계이야기를 이렇게 빠져들게 써놨다니 하면서 읽은 기억이 있다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온 시계, 요즘의 똑똑한 디지털시계가 아닌 태엽을 감아주어야(만) 하는 시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계의 죽음. 덜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한 것이 낫겠지만 똑똑함이 생활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시계를 통해서 잘 전달해준다
태엽을 감아주면 하루 동안은 꼬박 영차영차하며 시간을 알려주니까 다음 날 그 시간이 되면 태엽을 감아준다. 그건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을 보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릴 때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 외할머니의 손목에 매달린 손목시계에 시선이 가곤 했다. 금색바디에 검은 가죽의 손목시계. 외할머니는 시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차고 다녔던지 가죽은 낡아서 손목에 힘을 주면 곧 끊어질 것처럼 보였다
외할머니를 자주 볼 수 없었지만 시골에서 내가 사는 집으로 왔을 때는 외할머니 손목에 찬 손목시계에 관심을 가지곤 했다. 요즘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초침시계를 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의 손목시계가 다른 전자시계보다 좋아 보였던 건 무엇 때문일까
외할머니는 매일 비슷한 시간이 되면 시계태엽을 감아 주었다. 시계의 밥을 주는 거란다. 사람이 밥을 먹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시계가 밥을 매일 먹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외할머니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나에게 차 주었다. 가볍지 않고 묵직한 무게의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반짝이는 금색이 빛을 받아서 빛났다. 나는 시간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걸 차고 학교로 갔다. 시계가 손목 밖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매일 밥을 줘야 하기에 편리하진 않지만 그 불편함이 시계와 좀 더 친밀하게 하는 관계를 형성시켜 주었다. 태엽을 감는 것은 귀찮지만 뿌듯한 행위라고 한 하루키의 말이 떠오른다. 드르륵 드르륵 태엽을 감다보면 느슨하게 풀려있던 것이 점점 팽팽해지면서 딱 고정되는 그 의식 속에서 나와 시계를 인지한다. 시계는 또 하루를 성실하게 움직인다
요즘처럼 몇 년에 한 번 전지를 갈아주면 되는 시계는 편리하지만 시간이 뚝 끊기면 그것대로 시계가 죽어버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요즘도 손목시계를 오른 쪽에 차고 다니는데 외할머니가 그렇게 차고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희미하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