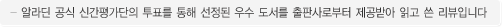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김연수 지음 / 자음과모음 / 2012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김연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미국으로 입양된 카밀라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 카밀라, 그녀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엄마의 삶에 의한 것이지만 자신의 생의 의미이기도 했던 과거들에 의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미래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을 질문인 "나는 왜 카밀라인가?"에 대한 대답은 지금까지 늘 "카밀라니까, 카밀라지"라는 대답뿐이었으나 이제는 그녀만이 존재의 이유가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보다 더 나이가 든 카밀라는 진남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가 바라봤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카밀라에게는 '그 시절에는 그랬지'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상처는 아팠다는 말로 시작할 수 없었지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신의 근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에릭이 보내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추억들이 카밀라에게는 어린시절을, 자신의 근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유이치도 함께 하게 됩니다. 카밀라와 유이치,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더 단단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어떤 사랑이든 카밀라에게는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카밀라의 곁에 유이치가 아닌 지훈이 있어 안도하고 있습니다만 카밀라 아니 희재, 그녀에게 유이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는 없지 않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카밀라의 한국이름은 희재입니다. 카밀라라는 이름도 예쁘지만 희재도 예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길 기다리며 이름을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랐던 한 여인의 삶은 온통 슬픔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때만이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희재가 들려주는 이야기, 희재의 엄마 정지은이 바라본 세상, 정지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점의 변화가 많아 누가 이야기하는지 생경하기도 했지만 정지은이 바라본 세상이, 희재가 바라본 세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재의 눈을 통해, 지은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재의 엄마는 정지은입니다. 그러면 희재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진남여고의 교장 신혜숙이 희재를 처음 만난 날 보여준 열녀비의 의미를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신혜숙에게도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언제이든 말입니다. 희재의 아빠가 아닐까 짐작되는 신혜숙의 남편 최성식의 마음 또한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정지은에게 낙태를 강요했을까요. 정지은의 오빠는 왜 최성식을 칼로 찔렀을까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희재의 출생을 둘러싸고 미스터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가 김연수는 독자들에게 속시원하게 해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해무처럼 보여주는 것만 보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가지의 사건들이 하나로 증폭되어 지금의 희재가 카밀라가 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말 아카이브'에서 전시된 것들은 뭘까요. 정지은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독자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건가요. 참으로 불친절한 작가가 아닙니까.
카밀라가 엄마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느새 그녀의 아빠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모여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며 정지은이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외면했던,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진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지만 희재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엄마를 알아가는 시간은 온통 아픔만이 가득했지만 자신을 품은 시간만큼은 행복했던 엄마의 삶은 그리 차가운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