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독한 이방인의 산책
다니엘 튜더 지음, 김재성 옮김 / 문학동네 / 2021년 2월
평점 :




이방인은 자고로 외로운 법이다. 오래전 이방인 생활을 하던 시절에 느꼈던 바이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홀로 지내다 보면 참 벼라별 생각이 다 들곤 했다. 그 땐 진짜 시간이 넘쳐흐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되돌아보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영국 출신 이방인 다니엘 튜더와의 만남은 오래 전 그의 첫 번째 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책은 다 읽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왜 다 읽지 못했을까? 궁금했다. 이번에는 다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우선 들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단상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양태와 사유들이 어디서나 사는 건 다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대학 옥스퍼드 출신의 이방인은 저널리스트로 한국을 찾은 모양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주말 7시에 등산가니 나오라는 말에 식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는 분명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른 거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근대화에 성공한 한국에서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직장상사는 무소불위한 권력의 화신이다. 까라면 깐다의 은근한 비판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그는 이방인이니 봐주지, 같은 얼굴을 한 이들에게 자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처리즘의 세례를 받은 글쓴이의 아버지 역시 신자유주의 치하에서 역시 각자도생이 최고라는 프로파간다를 받아 들였지만, 정작 당신이 실직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국가 공동체의 혜택을 많이 받은 대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저자는 증언한다. 이제는 희미해져 가는 공동체 의식의 부활이야말로 삶에 있어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는 전도에 그만 항복하게 된다. 초코파이 선전에나 나올 법한 정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떤가. 조금은 지저분하고 불편하지만, 情이 있었던 공간들은 죄다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정감 어린 공간들이 철거된 후에 그 곳을 채우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맛과 스타일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들이다. 우리의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런 게 좋냐고 묻는다. 이방인에게 情에 대한 레슨을 받게 될 줄이야. 그가 말한 아현동으로 대표되는 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를 엿보자.
이방인의 차별과 모욕에 대해서도 저자는 솔직한 고백을 보여준다.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지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은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사다. 이방인은 솔직하게 고백한다, 자신이 아무리 한국말을 하더라도 자신보다 태생적으로 잘하는 닝겡들이 최소한 5천만 명은 된다고. 문득 그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조금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역시 강대국 출신의 백인들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너무 솔직해서 더 정감이 간다고나 할까. 바로 이거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류에게 자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점점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충실한 분석을 보여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빛처럼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전자 기기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게 됐다. 낯선 이들과의 대화는 기피하게 됐다. 카톡도 좋아하지만, 역시 진정한 관계는 대면에서 비롯된다는 나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물론 요즘 같은 코시절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말이다.
사실 다니엘 튜더가 지적하는 대로 관계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는다는 건,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낼 시간이 없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전에 유럽 여행에서 만난 동생의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신랑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예식장에 가려니 그렇게 꺼릴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 마음을 접고 갔다 오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아 초반에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는데, 현대인들이 점점 더 관계에서 오는 친근함을 원하지만 또 동시에 그런 관계 설정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감정의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는 안아주기 같은 서비스들이 창궐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작고한 김광석의 목소리를 샘플링해서 인공지능이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부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를 보았는데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더라. 한편으로는 너무 똑같은 고인의 음색에 신기하면서도 아니 어느새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을까?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네 삶을 바꿀까하는 노파심이 불쑥 들었다. 지금도 버거킹에 등장한 키오스트 주문대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이 주문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린다고 하지 않은가 말이다. 누군가의 편리함이 또 누군가의 실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우리가 사는 지구별에 언젠가 고별하고 소멸해야 할 존재인 나의 죽음에 대한 자세도 마음에 들었다. 죽음이라는 소멸을 거부하고 영생불사가 과학의 힘으로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현실이 저만치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아니 영사불사는 아니더라도 수명연장의 꿈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글쓴이의 할머니처럼 치매에 걸려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 보지 못하며 빈껍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무용을 전공한 다니엘 어머니의 말처럼도 싫고. 그저 적당하게 살다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뭐 그것도 어떻게 되겠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글쓴이의 말처럼 삶의 어느 부분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
길게 돌아왔다.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외로움 공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생각해 본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21세기 문명은 인류 협동의 소산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종래의 공동체 정신을 부인하고, 혼자 사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노년의 삶을 위해서도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에서 은퇴 또는 해고되었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운단 말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나에게 묻는다.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느냐고. 외롭거나 심심할 때면 나는 책을 읽는다. 그거면 됐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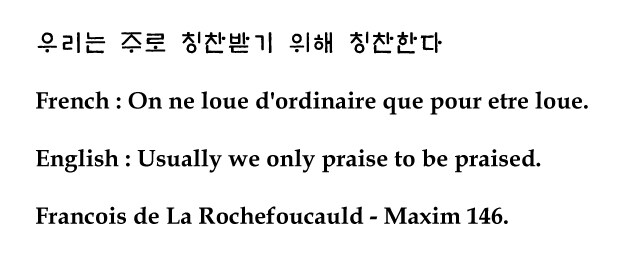
[뱀다리] 홋타 요시에 작가의 <라 로슈푸코> 전기를 읽는 중이라 그런지,
책의 도중에 만난 프랑수아 라 로슈푸코의 <막심>에서 인용한 문장은
정말 인상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