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년 시절 ㅣ J. M. 쿳시 자전소설 3부작
J. M. 쿳시 지음, 왕은철 옮김 / 문학동네 / 2018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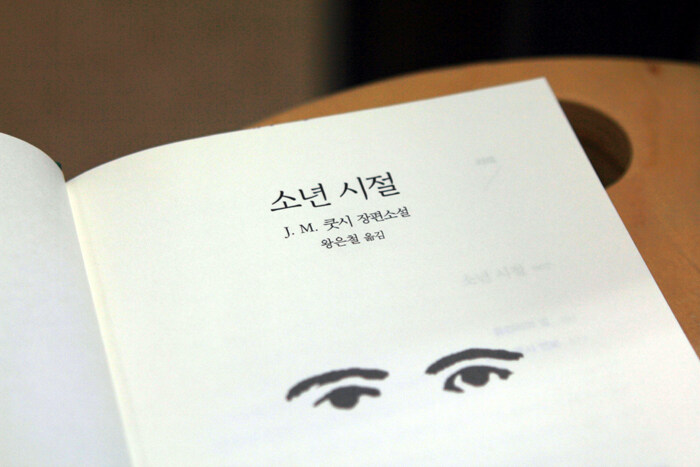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다. 그런데 재출간된 쿳시의 <소년 시절>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책을 빌렸고, 바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일이나 걸려서 다 읽었다. 사실 그동안 <페테르부르크의 대가>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산 책 보다 빌린 책을 먼저 읽어야 해서 우선 순위가 좀 바뀌게 됐다. 작년에는 이언 매큐언의 책들을 섭렵했는데 올해는 존 맥스웰 쿳시와 로맹 가리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 중이다. 세 작가 모두 대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이고 국내에 소개된 책들이 제법 많아서 컬렉션하고 읽는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좋다.
국내에 소개된 쿳시의 책들을 거의 도맡아서 번역하고 있는 왕은철 교수의 후기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한 작가의 책은 여러 작가가 돌아 가면서 번역하는 대신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역자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나 직접 저자와의 연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 보기도 한다고 하지 않은가.
<소년 시절>은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저자의 십대 시절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전적 소설이라고 한다. 정말 생소한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너들이 사는 방식이 그래도 등장하고, 대도시 케이프타운에서 변호사로 잘 나가던 아버지 잭 쿳시가 시골동네 우스터로 낙향하면서 생긴 일들이 그려진다. 어머니의 욕망은 자전거 배우는 일이었다고 했던가. 저자는 유대인도 기독교도 아닌 로마 가톨릭을 종교로 삼았다가, 다른 우악스러운 아프리카너 친구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한다. 자신들과 다른 인종과 섞여 다른 말을 해야(영어) 하는 상황에서부터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던 게 아니었을까.
가족들과 함께 카루 혹은 펠트에 위치한 농장에 가서 지내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어려서부터 삭막한 시멘트 포장 위에서 자란 나에겐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름방학만 되면 한 달씩 시골 할아버지네 가서 지내다가 왔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나의 할아버지네는 거의 같은 도시라서 내가 살던 곳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살풍경한 곳이었다. 바닷가에 간 친구들은 불가사리며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동식물들을 채집해 왔고, 시골로 간 친구들 역시 잠자리와 풍뎅이 같은 녀석들을 핀으로 박제해서 곤충 채집 숙제로 제출하곤 했다. 그 때 난 뭘 채집했더라. 고작 흔해 빠진 매미나 잠자리였겠지. 지금도 꼬맹이에게 잡아 준다는 핑계로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 다니다 보면 가끔씩 그 시절로 타임슬립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 나만 즐겁다 됐냐?
변호사이자 부사관으로 2차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저자의 아버지 잭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는 정말 빵점이었던 모양이다. 푸엘폰테인 시골 농장의 일상적 인종차별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교사였던 어머니의 이중적 모습은 역설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남편 같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의사가 변호사 같은 먹물이 되어야 한다는 편견에 젖어 있었다. 유색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은 ‘비정한 유대인’에 대한 아프리카너들의 편견도 주목할 만하다. 편견에도 피부색에 따른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는 걸까.
한편, 존 쿳시는 당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러시아인을 선호했지만, 이미 그는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면 안된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반에서 공부 잘하던 소년은 수학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시험을 잘 치렀지만, 역사와 지리 같은 암기 과목에서 소질이 없었노라고 고백한다.
<소년 시절>의 후반에서는 우스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갔지만,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세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빚을 지고 결국 파산으로 내달려 가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조의 글들이 이어진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할수록, 어머니는 억척 같이 저자와 동생을 돌보기 위해 전력투구에 나선다. 어느날 아버지가 자살하지나 않았는지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이는 꼬마 존이 품은 생각을 들려주는 부분에서는 정말 짠했다. 모든 가정마다 그 나름의 고민이 있다고 하던 톨스토이의 말대로 쿳시 집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으리라. 그리고 잦은 이주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존 쿳시는 철부지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너들이라의 삶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이질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네 일반적인 삶을 관통하는 원류로 회귀하는 과정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년의 진술을 듣다 보니 어느새 소설의 결말 부분에 도착해 있더라. 그리고 아마 다음 이야기는 역자가 예고한 대로 <청년 시절>과 <섬머 타임>으로 이어질 모양인가 보다. 앞으로 절판된 쿳시의 책들이 연달아 나올 모양인데,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