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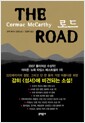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핵전쟁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이건 인류가 멸망한 후의 모습을 담은 작품은 수없이 많다. 대부분 전쟁이거나 아님 환경의 재앙이 원인이 된다. 때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좀비’들만이 지구상에 남는 작품들도 있다. 물론 그럴 때는 무슨 전염병이 원인이 된다. 아무리 봐도 지구는 살만한 곳은 못되는 모양.
『더 로드』역시 잔혹한 핵전쟁 이후 살아남은 극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식량과 물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며 나아간다. 정확한 목적지는 물론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도 않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날만큼만 걸어가는 것이다.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가는 길마다 위험이요. 어려움이다. 정작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역설적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보다 무서운 것을 여지껏 나는 본 적이 없다. 아비는 아들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때로는 살인까지 저질러야 한다. 하지만 아들은 사람을 돕고자 한다. 사람에게 빵을 주고 싶어 하고, 물을 주고 싶어 한다. 자신이 아직 인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소년이 고개를 돌리더니 남자를 보았다.
뭘 물어볼지 알고 있어. 하지만 답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뭘 물어볼 건데요.
우리가 저 노인을 데려갈 수 있냐는 거잖아. 못 데려가.
알아요.
알지?
네.
그럼 됐다.
다른 것도 줄 수 있나요?
일단 저걸 어쩌는지 보자.
그들은 노인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다 먹자 빈 깡통을 쥐고 앉아 혹시 더 들어 있지 않나 들여다보았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혹은 얼마나 단순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화재가 난다면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깔려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다. 온갖 고상한 척을 다 하는 인간이라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이내 쉽게 동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적어도 자신이 죽을 정도의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어찌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기 시작한 그 때부터 우리는 동물임을 자각한 것일지 모른다. 이성을 갖춘, 예술을 사랑하고 이타심이 넘치는 인간이 실은 무수히 많은 동물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동물보다 더 미개한 종일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라는 것을 통해 슬그머니, 혹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동물들은 집단적으로 동족을 학살하지는 않기에.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학살을 저질러야만 야만적인 것은 아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시간에 서서히 살육하는 것 역시 엄연히 학살이자, 범죄다. 우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살의 공범이 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5조 원이 넘는 돈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퍼부으면서도, 정작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넘친다. 연말이 되면 버릇처럼 정치인들은 검댕이를 얼굴에 묻혀가며 달동네에 연탄을 나른다. 사랑의 연탄이란 이름으로. 하지만 서울시는 아이들 급식비를 줄여가며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하고, 서울시를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꾸민다. 아이들의 생명을 갉아먹어가며 아름답게 꾸미는 서울이다.
때로는 지구상이 한 번 크게 요동쳤다 제자리에 돌아왔으면 하고 바란다. 가끔 어르신들이 요즘 세태를 한탄하며 하는 소리. “전쟁이 한 번 나야 정신을 차리지.” 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어느 덧 내가 중얼거린다. 이래서 애들은 뭐든지 잘 배운다.
평화는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 정권 들어 더욱 절감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 평화의 대상이, 평화를 누리는 대상이 지구상 전체 인구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는 분명 봐야 한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폭격으로 죽어나갈 각오를 해야 하고,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폭탄이 되어 이스라엘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라크 아이들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기간 중, 단지 이라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나갔다. 수백만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하찮은 질병에 죽어나간 다음, 부시 대통령은, 아니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다시금 폭격을 퍼부었다. 물론 뒤처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대가 동원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등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나부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평화가 요즘처럼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북의 핵 무장, 실험에 호들갑을 떨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얼마나 빨리 튀어야 우리가 먼저 태극기를 꽂을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비정규직 800만이 목숨을 바쳐가며 투쟁하는데, 차가 막힌다고, 뉴스에서 나쁘다고 떠드니까. 욕한다. 시발놈들이라고. 욕하는 사람 중 정규직이 있다는 것이 더욱 서러운 지금이다.
『더 로드』는 지구 멸망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눈물겹게 간직하는 모습들이 담겨있다. 모든 인간들이 사라진 다음에야,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도와줌이,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친다. 원래 인간은 멍청하고, 늦되다.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린 베스트셀러란다. 곧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또 공감했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책을 덮은 다음, 그 사람은 웃으며 티브이 토크쇼를 볼 것이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할 테다. 시위 때문에 차가 막히고, 집회 때문에 경찰들이 모이면, 또 다시 “에이 시발, 또 데모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정작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알아야 할 이유다.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난 참 다행이다. 적어도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니까. 그리고 책을 덮은 다음 바로 토크쇼를 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심하진 않으니까.
난 이 땅의 주인 노동자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