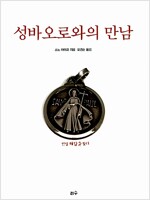소노 아야코와 거리를 둔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에세이를 쓴 소노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정권에 자문역도 했던 극우 인사라는 내용이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71039
평소 ‘일상생활에 주는 지혜로운 말씀’같은 가벼운 에세이는 전혀 읽지 않는 편이라서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그다지 관심 없이 흘려보았던 책이다. 그러나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제목은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하얀색 수영모를 쓴 여성이 무릎을 높게 들어 올리면서 물속을 보행하는 일러스트의 표지는 꽤 상큼하고 제목과 잘 어울려서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은 꽤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이다. 알라딘 검색 결과에 의하면 에세이 주간 7위, 세일즈 포인트는 무려 82,828점이나 된다.
대한민국에서 잘 팔리는 책이 일본 극우 인사의 작품이라니 꽤 흥미 있는 지점이다. 글이란 결국 자기표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진대 이 기사가 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가 특별히 마음 심란한 사실 하나도 알게 되었다. 내가 지난번에 포스팅 했던 오에 겐자부로는 극우 인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글을 써서 평생 테러 협박에 시달렸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오키나와 노트』 사건인데 이 책에서 오에 겐자부로는 전쟁 말미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오에는 당사자로 지목된 이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이때 맨 처음에 나서서 오에의 책이 부실한 취재와 왜곡으로 얼룩져있다고 주장한 이가 바로 소노 아야코이다. 이쯤 되면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나는 ‘작가=작품’이라는 평면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작가가 어떠한 사람이든 일단은 작품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편 가르고 규정하는 그 규율의 바깥을 보는 것이 문학일진대 어떻게든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섬세한 결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선은 정나미 떨어진 마음을 살짝 한쪽에 밀어놓고 소노 아야코의 책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다. 그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도서관에 예약이 밀려있어서 빌릴 수가 없었다. (아무리 궁금해도 사서 보기는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둔다』 대신에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베스트셀러인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를 대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에 소개된 소노 아야코의 책이 매우 많아서 깜짝 놀랐다. 동네 도서관의 에세이 코너에만도 10권 정도의 책이 꽂혀있었다.)
2005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일본에서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인 1972년에 발표되어서 초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원제는 『계로록 戒老錄』 인데 ‘늙음을 경계하는 책’ 정도로 번역이 되겠다.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보다는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 정도가 더 원래 뜻에 가깝다고 하겠다.
우선, 목차를 일부분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남이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일단 포기할 것
노인이라는 것은 지위도, 자격도 아니다
가족끼리라면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생애는 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한가하게 남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생활 방법을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할 것
푸념을 해서 좋은 점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명랑할 것
‘삐딱한 생각’은 용렬한 행위, 의식적으로 고칠 것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할 것
- - - - - - - - - -
어떤 사람에게는 하품이 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격언에서 감동을 얻는 사람이라면 가끔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자신의 생애 단계에 맞춰서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나이 대에 대입해도 옳은 말들이다. 각 꼭지의 전개는 대체로 이런 식이다. ‘이런이런 노인들이 있다(내가 보았다). 그러한 자세는 이러이러해서 좋지 않다(남우세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이러이렇게 나이를 먹어갈 일이다.’ 옛 경세서들의 간략함을 따르려고 한 듯하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서지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1972년에 노인이거나 노인에 막 접어들려고 하는 나이였다면 도대체 지금은 몇 살이라는 건지 잘 계산이 되지 않았다. 책을 쓸 때 55세나 60세 정도 되었다고 하면 지금 벌써 100세가 훌쩍 넘었다는 소리인데 .... 어라~~ 1931년생, 그리고 출판년도가 1972년도. 그러니까 소노 아야코가 이 책을 낸 것은 자기 나이 41살 때의 일인 것이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앞서 읽었던 글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40대가 어떠한 나이 대인가? 머리가 굵어도 여전히 돈이 들어가는 자식들 뒷바라지가 힘겹고 예전 같지 않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별을 예감하는 마음은 졸아든다. 그 많은 책임감 앞에서 지금 일터에서 몇 년이라도 더 버틸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젊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지만 이 나이에 준비해야할 노년은 돈의 문제이지 아직은 마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하물며 잘 늙는 일에 대해서 꽤 잘 안다고 행세까지 하는 건 너무 건방진 일이 아닌가.
아무리 좀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일찍이 노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이고 보면 당시에도 41살의 소노 아야코가 노년에 접어들 나이로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책은 노년 당사자의 자기 성찰이 담긴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안의 노화의 기미를 채서 윗세대의 모습에 비추어 고찰해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늙음은 어디까지나 관찰한 늙음, 남의 늙음인 것이다. 그런데 소노 아야코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p. 253
<노년의 고통이란 인간의 최후 완성을 위한 선물>
------------ (중략) ------------
그러나 인간은 행복에 의해서도 충족되지만, 괴로움에 의해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도 아니며, 까닭도 없는 불행에 직면했을 때만큼 인간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도 없다. 노년에 일어나는 이런 저런 불행도 바로 이러한 시련인 것이다.
만일 내가 그러한 불행을 젊었을 때 경험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서 자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40년, 50년, 60년 혹은 그 이상의 체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마련한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노년의 고통에 대해 소노 아야코는 이렇게, 겪어본 일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노년의 고통은 신의 축복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고통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남의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는 일은 반드시 어긋나거나 미치지 못하게 마련이다. 언젠가 겪을 경험이라 해도 아직 겪지 않은 자는 그 고통의 면면을 알 수가 없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무력감,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무엇보다도 당장의 빈곤. 그 높은 노인 자살률이 시련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지 못한 무능력 때문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타인의 고통 앞에서 겸허해야만 한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그럴 줄 아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경계하는 마음만 있고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 모든 걸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 짓고 쉽게 훈계하는데 옳은 소리만 넘치고 그런 결론에 이른 마음의 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글이 자못 담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4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소노 아야코의 다른 책들은 좀 달라졌을까? 내가 살아보며 얻은 몇 안 되는 진리 중의 하나는 ‘늙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글이란 어떻게든 글을 쓴 이의 정체를 드러내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 나는 소노 아야코에게 가졌던 궁금증을 내려놓는다. 대신에 (일본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작가의 책이 십수 종이나 번역되어 나올 정도인 대한민국이 궁금하다.
소노 아야코와는 거리를 두려고 한다.
덧붙임 : 『약간의 거리를 둔다』의 원제는 『人間의 分際』이다. ‘인간의 분수’ 정도로 옮길 수 있겠다. ‘니 분수를 알아라’ 할 때의 그 ‘분수’이다. 조금 시니컬하고 꼰대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이 『계로록 戒老錄』과 뉘앙스가 비슷하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로 제목을 바꾼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표지 그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출판사의 마케팅은 주목할 만하다.
살펴보니『약간의 거리를 둔다』이후에도 같은 출판사에서 두 종의 책이 더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