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을 읽고(보고) 너무 레트로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분위기의 그림을 너무나도 애정하게 되어서, (어렵게) 고해상도 파일을 구해 데스크탑 커버로 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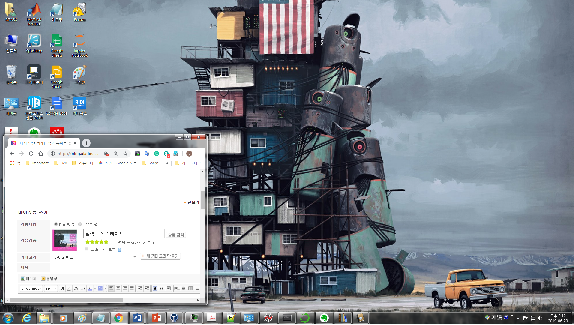
배경은 1990년대지만, 세상은 이미 겪을 대로 겪어 종말로 치닫고 있는 중, 길거리에는 머리에는 뉴로캐스터라는 장비를 쓰고 반쯤 죽은 송장들이 널부러져 있고, 슈퍼마켓의 매대는 텅텅 비어 있으며, 먼지 스톰으로 뒤덮힌 길은 한치 앞도 보기 힘들다. 텍스트는 짧지만, 한두 장 혹은 챕터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해야 할 배경과 분위기는 모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걸 아트북이라고 하나. 그림책을 보는 느낌으로 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 배경 정도를 파악하게 되고, 주인공 여자 아이가 살아온 삶,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소녀가 향한 포인트 린덴이라는 곳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는 알 길이 없다.
이 소녀와 동행하는 것(?)은 한 로봇인데. 그림이 없었다면 훨씬 어린 동생벌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인격적으로 대하고, 스킵이라는 이름도 있다. 소녀가 향한 곳은 바로 그 스킵이 지도 상에 표시해둔 태평양과 맞닿은 서부의 저 끝 어느 작은 마을의 한 주소다. 왜 그곳을 향하고 있을까.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거나, 혹은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일까. 그녀는 착한 아이가 아니다. 차를 훔치고, 돈을 훔치고, 양엄마를 폭행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종말에 닥친 세계는 작은 로봇 하나와 동행하는 틴에이저에게 그 어떤 온정도 없으며, 적대적이고 악의를 품고 있다. 자연도 무섭고,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공적인 장치들도 무섭지만, 미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들이다. 스킵과 미쉘은 훔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피해 모하비 사막을 지나고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포인트 린덴으로 가고 있다.

인간의 의식은 뇌신경과 그 복잡한 연결이다. 그게 전부일까? 소설을 통해 작가가 묻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일 뇌신경의 모든 시냅스 연결의 디테일을 과학 기술적으로 모두 풀어 조작할 수 있다면, 정신이 지배하는 인간의 몸은 무엇일까. 소설은 그것을 묻고 있는 듯하다. SF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 비교적 재밌게 본 <얼터드 카본>에서는 사람의 의식을 작은 스택에 담아 뒷덜미에 심는다. 옷을 갈아입듯 죽은 사람의 몸을 사서 그 스택을 심으면 그 사람의 자아가 되돌아온다.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았지만, 드라마 너머 풀 텍스트에 담긴 작가의 정신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읽고 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둘이 서로 다른듯 하며 비슷하지만 책은 책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재밌다고 한다. 먼저 드라마를 본 경우는 고착된 배경 이미지가 상상력에 굴레를 씌우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책을 먼저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경우), 풀 텍스트로 모두 아는 내용에 상상으로는 맛보지 못한 시각적 경험까지 덧붙여서 그야말로 착붙는 조합이다. 아무튼 이것저것 읽는 바람에 진도가 잘 안나가지만, 시즌2가 나온다고 하니, 얼렁 읽고 다음 편까지 읽은 다음에, 드라마를 봐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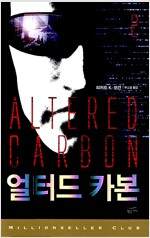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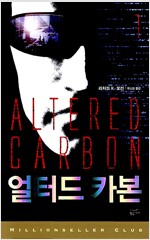
두 편의 전혀 다른 장르(SF 적으로는 같은 장르지만 톤은 매우 다르다)의 드라마 두 편이 교차하는 지점은 바로 인간의 의식이 몸과 결별하는 지점이다. 하나는 의식이 머리에 쓰는 장치를 통해, 전기줄 같은 물리적 연결선을 통해 서로 흐르며 가상 세계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현실(자신의 몸을 포함한)을 유기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그 의식을 스택에 넣어 영원히 저장하고, (죽은 사람의) 몸을 사서 바꿔가며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결국 무드셀러라는 계층의 부자들은 수백년간 몸을 바꾸어 가며 살면서 축적된 재산과 권력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 지상이 아닌 구름 꼭대기 하늘에 지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살며 (더러운) 땅을 밟지 않는다.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읽는 과정, 그림이 보여주는 대체 역사의 종말론적 분위기 만으로도 충분히 읽을만하지만, 대체 왜 이들이 이 곳에 가려고 하는것인가 하는 수수께끼에 대한 힌트는 전혀 거의 보여주지 않는데,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 같은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서야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더욱 더 충격적인 결말을 그림으로 확인하게 된다. 우와 이 작품이 휴고상을 타지 않았다면 대체 다른 어떤 작품이 휴고상이든 뭔 상이든 탔단 말인가.
얼터드 카본은 넷플릭스 드라마 특유의 밀당을 보여준다. 작은 반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 드라마에 질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 넷플 드라마를 끊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충격과 반전을 적절히 적당한 때에 내놓는 것이 상업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궂이 드라마로 본 이야기를 책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원작에서도 이런 식의 공식화된 밀당으로 승부하지는 않았을 거 같다는 거다.
두 작품 중 하나는(스포가 될 까봐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쓴다), 아니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제의식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식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만 줄구장창 하다가, 어느날 머리와 정신이 인터넷의 어딘가에 틀어박혀져 서, 모니터 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사람의 정신이 소프트웨어 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소프트웨어적인 존재가 어떤 틀 안에 들어가면 뭐 대략 인간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라면, 절대로 삭제할 수 없다 겠지만, 정신이 떠난 몸이 황당그레 남겨져 있다면, 그건 무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