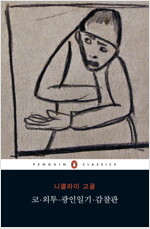어이없는 이야기를 더 어이없이 만드는 건 환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다. 소설은 이반이라는 한 이발사가 아침에 빵굽는 냄새를 맡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커피도 사양한 채 갓 구운 빵을 먹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세부적인 디테일로 시작한다. 날짜와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서술되는 이 부분은 사실상 보통의 미스터리 서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상황의 작은 디테일들에 주목하게 하여 긴장감을 유발하시키지만 그렇게 조심조심 읽어가며 갑자기 맞닥뜨리는 건 건 황당함 자체다. 마치 어둠속에서 더듬어 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기분이랄까. 그러면서도 그 엘리스처럼 그 이상한 세계를 배회하며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기대하며 글자들 사이를 움직여보지만 결국 작가에게 유린당하는 건 독자다.
이발사 이반은 갓 구운 빵속에서 나타난 코가 자신이 이발한 코벨레프 8등관료의 코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면도하다가 잘못해서 베어낸 걸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한다. 이 때 아내는 쓸데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반에게 온갖 구박을 다한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 거 없다. 마치 어떤 영화에서 초반에 지나가는 행인이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데 관객은 그게 맥거핀인 줄 알고 잔뜩 주목하는데 단지 그 씬을 길게 잡았을 뿐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소심한 이발사 이반의 성격을 나타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소설 전체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는 정성들여 설명을 하고 객관적 정보와 세부사항을 전달하지만, 중요한 것, 가장 궁금한 것에 관해서는 설명이 야박하다. 모든 불가능한 일이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인 듯 천연덕스럽게 간략하게 말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천조각에 싸서 이를 몰래 버리고자 거리로 나가지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경찰관 때문에 쉽지 않고, 결국 다리 밑으로 던졌지만, 경찰에 걸리고 만다.
한편 여자를 밝히는 8등관 코벨로프는 아침 잠에서 깨자 자신의 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는 좋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레로 변신하는 그레고르 잠자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고골(1809~1852)은 카프카(1883~1923)보다 훨씬 전에 태어났다. 카프카가 고골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비현실적 세계와 맞닥뜨리는 시작이 비슷하다. 물론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 그 모든 면에서 둘은 완전히 다르다.
《코》를 읽게 된 계기는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느크(1906~1954)의 책날개에 소개된 작가 소개의 첫줄로부터다. “러시아 작가들이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면, 터키 작가들은 모두 사이트 파이크의 우산 아래서 나왔다.”[1]. 찾아보니 고골의 러시안 문학적 위치에 대한 저 말은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이었다. 고골에 대한 이러저러한 평가는 이 말과 더불어 여러 핵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 쪼가리들을 인용한 한 논문을 인용하면 설명이 될 듯하다. 아바스야느크의 첫 작품을 읽고 나서 뭔가 조금 기괴한 느낌이 들어, 작가 소개를 펼쳤다가 발견된 고골 <외투>의 문학적 위상이 그렇다는 걸 발견하고는, <외투>를 읽으려고 고골을 펼쳤다가 <코>에 빠졌던 것이다.
러시아 문학사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가장 독특한 해석과 창조의 전형인 고골의 문학은 예로부터 낭만성, 현실성, 상징성, 심리성, 신화성, 종교성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채롭게 교차하는 수수께끼의 세계로 널리 평가되어 왔다.2) 일찍이 도스또옙스끼(Ф. М. Достоевский)가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Все мы вышли из гоголевской “Шинели.”)”라고 말했듯이, 작품 「외투 」는 고골 문학의 독창성과 풍부함을 함께 지닌 ‘가장 심오하고 가장 뛰어난 작 품의 하나’3)로서 러시아 문학사에서 실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코대신 코가 있던 자리가 평평해진 걸 발견하는 코벨로프는 황당하고 낙심하고 무엇보다도 수치스러워 코(가 있던 자리)를 손수건으로 감춘 채로 돌아다니다가 마차에서 내리는 5등관료를 발견하는데, 그 5등관이 자신의 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코에게 가서 당신은 내 코이니 자신의 위치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코는 자신은 당신의 코가 아니며 자신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그러던 중 어떤 여자에 눈이 팔리는 동안 자신의 코이자 신사는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나서 코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코면 코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자신보다도 신분이 높은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코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면 일단 스케일이 맞지가 않고, 물리적으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없는데, 바로 알아보다니,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는 곳곳에서 벌어진다. 후에 경찰이 코를 가져와서는 이발사 이반이 꾸민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욱이 코를 발견한 당시 경찰관의 눈에도 코는 신사로 보였다는 것이다. 마차에 타고 있는 '그'를 길에서 잡았다고, 처음엔 자기도 그가 평범한 신사로 보였지만, 근시여서 코나 수염 같은 건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이 안경이 있었기에 그가 코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냈다고 말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깨알같은 디테일이라니.
하지만 정작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빠져있고, 장소와 시간 혹은 그 외에 쓸데 없는 부분에서만 객관성과 정교함을 유지한다. 즉 코가 어떻게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렇게 보인건지 혹은 변신한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빵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반을 잡은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코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가장 황당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이 뭉텅이로 빠진채, 화자는 자기도 이 이야기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작가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소재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며 발뺌하면서 미스터리를 푸는 대신 메타소설의 형식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재기발랄한 문체와 다중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거리를 줄 것 같지만, 19세기 초, 이러한 소설을 썼고, 결국 판타지와 현실의 경계에 있는 오늘날의 소설들도 다양한 경로로 고골의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오래된 작품이라 조금은 고리타분한 문체를 예상했는데, 하도 황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황당한 방식이 그 옛날 것인데도 낯설고 새롭게 느껴져서 흥미롭게 읽혔다.
[1] 현대문학단편선 11 사이트 파이크 아바스야느크 : 세상을 사고 싶은 남자 외 38편 - 세계문학단편선 11
[2] 은닉된 논쟁: 고골의 「외투」와 체홉의 「관리의 죽음」의 비교 분석, 오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