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권이 묶여져 있는 세트를 샀는데 그 중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를 먼저 읽었다. 첫번째 평은 짧다는 것. 아주 짧다. 텍스트의 양은 세 권 묶인 것 다 합해서 일반 서적 한 권 분량. 그림은 판화로 정선껏 제작했다지만 조금 정적이고, 그닥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하루키의 사생활이나 평소 하는 생각들을 엿볼 수 있고, 그런 그의 특성이 소설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고양이와 함께 하는 고적한 시간, 평소에 말이 없고, 특히 소설가와 문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들도 딱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글들을 쓰려면 힘들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를 펼치자 마자 내막이 나온다. 이런 글의 소재가 한 50가지 정도 쌓여 있다고 한다. 거기서 골라 쓰면 된다고.
에세이건 소설이건 하루키는 제목을 참 잘 뽑는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빤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지루하지도 않고, 살짝 쿨한듯 하면서, 한마디로 그답다. 세트 상품인 하루키의 무라카미 라디오 3부작이라는 뻣뻣한 제목으로 상품이 포장되어 있는데, 세트 내의 세 권은 다 따로따로 나온 책으로 각자의 제목이 있다.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대충 에세이에 나온 내용이다. 하루키의 이런 유쾌한 에세이들이 잘나가면서, 김중혁 작가 같은 국내 작가들도 가볍고 재치있는 에세이 모음들을 자주 묶어 낸다. 좋은 현상이다.
섹스를 한 다음날 티셔츠와 헐렁한 사각 팬티를 차림으로 오믈렛을 만들고 큼직한 남자, 면셔츠를 잠옷 대신 입고 침대에서 눈비비며 나온 여자가 함께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들으며 아침을 먹는 광고에서 본 듯한 장면은 그의 상상 속에서 오믈렛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다. 영어권 나라의 레스토랑에서 soup or salad? 라고 묻는 웨이터의 질문을 슈퍼 샐러드? 라고 이해하고는 그거 좋겠네요 슈퍼 샐러드주세요 하는 장면을 실은 핀란드 영화 애기. 또는 헬스클럽의 바이크에서 생산되는 노동력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성욕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있다.
어떤 책에도 다른 책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터프한 아프리카 대륙 종단기인 폴 서루의 <아프리카 방랑> ,과학자들의 실화를 모은 《세상을 살린 10명의 용기 있는 과학자들>,트루먼 카포티의 단편소설 <마지막 문을 닫아라>를 카트에 담아둔다. 카포티 책이 하도 많아, <마지막 문을 닫아라>가 실린 단편을 찾느라 손가락 품 좀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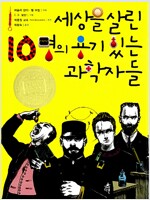

《아프리카 방랑》 속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폴은 동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다. 참으로 살벌한 지역이어서 오락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마을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남아돌아 진절머리가 나던 참에 한 일본인을 만났다. 일본 기업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로 영어를 상당히 잘했다. 폴은 기뻐하며 대화를 시작했지만, 이내 상대가 말도 안 되게 지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얘기가 틀에 박혀 있다고 할까, 조금도 깊이가 없다. 그는 이러느니 혼자 벽 보고 있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한다.
투루먼 카포티의 단편집은 꼭 읽고 싶다. 그의 소설 제목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카포티의 단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트루먼 카포티의 단편소설 <마지막 문을 닫아라>의 마지막 한 줄, 옛날부터 왠지 이 문장에 몹시 끌렸다. Think of nothing things, think of wind, 내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도 이 문장을 염두에 두고 붙인 제목이었다. nothing things라는 어감이 정말 좋다.

토르 고타스의 <러닝>을 읽고 커다란 귓밥을 파낸 듯이 개운하게 풀린 오래 묵은 의문 하나가 풀리는 대목.
고타스 씨에 따르면 그리스에서 전령은 온전히 직접 달리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 그냥 달리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말을 타고는 가지 못할 좁은 길이나 험한 길도 거침없이 갈 수 있다. (..)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필리피데스라는 전령은 마라톤 전쟁 전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서한을 들고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이틀에 걸쳐 약 466킬로미터를 달렸다. (...) 그러나 스파르타 왕의 대답은 “노”였다. 지원군은 보낼 수 없다. 필리피데스 씨는 실망하면서 같은 길을 또다시 달려서 돌아왔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 길로 마라톤까지 40킬로미터 넘는 길을 달려 전쟁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다시 달려서 아테네로 돌아가, “이겼다!” 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그럼 죽을 만도 하지,
존 어빙의 <곰 풀어주기>(직접 번역한 소설)은 못찾았고(국내 번역본이 없는 것 같아), 책보다 영화와 음악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어 있다.
저자가 언급한 기야마 쇼헤이의 <가을> 라는 짧은 시가 좋아서 옮겨본다.
새 나막신을 샀다며
친구가 불쑥 찾아왔다.
나는 마침 면도를 다 끝낸 참이었다.
두 사람은 교외로
가을을 툭툭 차며 걸어갔다.
미국의 작가 도로시 파커가 자신의 묘비에 써지기를 희망한 말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내게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이 얘기에서 나아가 자신의 묘지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저 바람을 생각해라.'라고 적으면 어떨까를 생각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이 문장이 제일 좋았다. <노르웨이의 숲>의 분위기를 이 평범한 문장 하나에 고스란히 옮겨온 듯하다.
스무 살 전후였던 나는 사귀던 여자친구하고도 잘 안 되고, 학교에도 흥미를 잃고, 좀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오후의 양지에 고양이와 둘이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시간은 나름대로 부드럽고 따스하게 흘러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