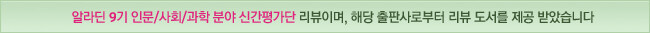[직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직설]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직설 - 한국 사회의 위선을 향해 씹고, 뱉고, 쏘다!
한홍구.서해성.고경태 지음 / 한겨레출판 / 2011년 8월
평점 :



한겨레 신문에 매주 연재되었던 꼭지를 모았다. 신문에선 눈에 띄는 초청자가 보일 때마다 가끔 읽었고, 보통은 슬쩍 넘겼다. 커다란 지면 하나를 가득 매운 넘치는 언어를 다 쫓아가기가 벅찼다. 구어체로, 쉬운 언어로 늘어놓았다곤 하지만 저들끼리 떠드는 말을 꼼꼼히 쫓아가는 것은 조금 버거웠다. 모름지기 말이란 함축적이고 생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함의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문어체로 길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글이 이해하기 쉬운 법이다.
기분탓일까. 책으로 나온 ‘직설’은 신문보다 읽기가 편했다. 일단 글자가 커졌고 자간도 벌어졌다. 내용상의 편집은 직접 대조를 해보지 않아 어떻게 바뀐건지 잘 모르겠다. 매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한홍구와 서해성이 정리하는 나가는 글, 혹은 남은 글은 인터뷰를 읽는 내내 품었던 느낌을 정리하거나, 보듬거나, 혹은 더욱 불사지르거나, 흔들거나 했다.
말 그대로 ‘직설’이다. 사회 현안에 대하여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보인다. 또한 저들끼리 떠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를 직접 앞에 앉혀 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어떤 인사가 나올 때는 서해성과 한홍구가 쿵딱쿵딱 장단을 맞추어 이야기에 흥이 돋았고, 어떤 인사가 나올 때는 둘의 쏟아지는 물음과 비난에 대면했다. 어떤 방식이었든 속이 시원했다. 그런 점이 좋았다.
어찌보면 요즘 유행하는 ‘나꼼수’와 비슷하다. 정론지나 진보언론지에 정치 관련 글은 쏟아지지만, 일반인들에게 그것은 어렵다. 사건은 알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 답답한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나꼼수’였다. 흔한 시민들이 술집에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정치에 대해 이빨을 까던 것 처럼,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김어준이 나와 격식은 집어 치우고 수다를 떤다. 청취자들은 그들의 테이블 옆에 작은 간이의자를 놓고 그들의 노는 꼴을 엿본다. 흥미진진한 광경이다. ‘직설’의 모양새가 꼭 그렇다. 서해성, 한홍구를 중심으로 매번 다른 인사가 나와 일상어로 그들의 사연을 풀어놓는다. 독자들은 귀로 듣진 못하지만 눈으로 듣는다.
꼭지 하나하나가 너무 짧은 점이 아쉽긴 했지만, 더 많은 인물들을 만나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다. 총 50회동안 수많은 계층의 다양한 인물을 만나면서도 서해성과 한홍구 두 구라의 입담은 거침이 없더라. 특히 서해성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스펙트럼에 혀를 내둘렀다. 어느 인사가 와도 그 풀에 첨벙 뛰어들어 함께 놀 수 있는 그의 지식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있었기에 많은 초청인사로부터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대화는 두레박이다. 혼자서는 풀어놓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가슴 속 심연의 이야기들을 대화는 끌어올린다. 혼자서 머리 싸쥐고 헤메어봐야 떠올리지 못했을 말들을, 대화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길어 올린다. 이 책이 가진 힘은 그런 것일 게다. 그들이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글을 썼더라면 도출하지 못했을 말들을, 한데 모임으로써 기워내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서해성의 말 하나를 던지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
|
|
| |
죽음이 죽음다워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죽음은 사회적이죠.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았다’ 첫 단락이 이렇게 끝나죠. “몇 년 만에 보는 자연사였다.” 얼마나 많은 타살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죽음이 원통한 사회가 나쁜 사회거든요. 어떤 자살도 타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법이죠. 만인이 자연사하는 사회가 곧 민주사회인 거죠. p.315 - 서해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