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양방랑
후지와라 신야 지음, 이윤정 옮김 / 작가정신 / 2018년 5월
평점 : 


40년 전에 출간된 여행서적을 읽는다는 건 책이 쓰여진 시대를 안다는 것.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에 우리는 감동하고 다시 여행에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 방랑이라는 말 자체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을 뜻한다. 후지와라 신야의 400여 일간의 방랑의 기록이자 동양 여행기 3부작 중 마지막 편이다. 한 겨울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여행은 앙카라, 이슬람, 콜카타, 티베트, 버마, 치앙마이, 상하이를 거쳐 홍콩과 한반도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향했던 여정의 기록이다.
그의 기록을 보자면 후미진 뒷골목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번화한 도시보다는 후미진 뒷골목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폈다. 사창가의 뒷골목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의 민낯을 찍었다. 가슴을 드러내는 사진도 마다하지 않았다. 창녀들의 벗은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 섹스어필하다기 보다는 오늘을 사는 그네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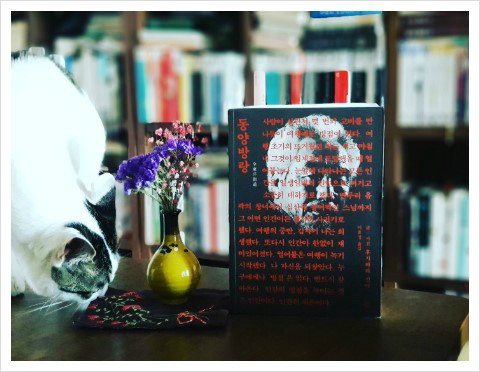
어느 식당에서 손님의 옆자리에 앉아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거구의 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식당측으로부터 손님의 접시가 비워질때마다 그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 먹고 살기 위해 손님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여자. 그게 신기해 자꾸만 접시를 그 여자 쪽으로 보냈던 후지와라 신야의 호기심을 엿볼 수 있었다. 장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또한 음식을 먹어치우는 그 여자에게서 삶의 고단함을 엿볼 수 있다.
후지와라 신야는 한 겨울의 서울, 돼지 머리가 진열되어 있는 시장 한복판에서 순대와 간을 먹으며 사람들을 만났다. 그 전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한이 서려있는 듯한 읖조림이 판소리라는 것. 판소리는 전라도의 음악이라는 것. 판소리를 듣고 마음을 후벼파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방문한 시기가 1981년의 서울이었다. 지금과는 다르게 1981년 서울의 시장은 남루하다. 치열하게 몸싸움하며 달아났던 창부와의 사투에서 어떤 처절함을 엿보았다. 눈내린 한 겨울 서울의 모습은 어쩐지 그 시기 만큼 시린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울을 소울(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그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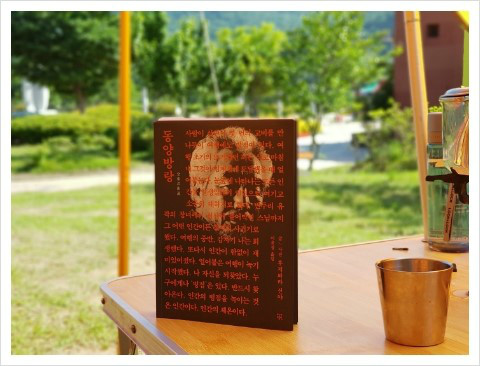
나는 그저 '길을 걷는 자'였고 보고 느낀 것들을 '보고하는 자'에 불과했다. 사진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알아차렸을 텐데, 나는 지난 1년 동안 누구나 들고 다니는 평범한 카메라 한 대와 렌즈 하나만 써서 대부분의 사진을 찍었다. 삼각대도 사용하지 않았다. 삼각대는 기계의 다리지 내 다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477페이지)
그가 방랑했던 장소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 도시의 풍경들에서 드러나는 장면들. 때로는 감추고 싶은 장면일지라도 그가 머물렀던 시간에의 사유로 비춰졌다. 때로는 여행자에 의해 그 도시의 민낯이 드러나는 법이다.
고지대 산사에서의 며칠을 묵었던 그의 기록을 보자. 40세가 넘어서도 더이상 승려를 할 수 없다며 떠나는 자들. 열두어 살 먹은 소년 승려의 이탈. 한번 나간 자는 다시는 승려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떠날 수 밖에 없는가. 그저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또한 막지않은 산사에서의 기억은 마지막 노승의 얼굴에서 드러난다. 모든 것을 통달한 자의 모습이 이렇던가. 작가가 이만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했을 때 누운 채 그를 바라보는 승려의 사진 한 장에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진다. 산다는 게 이런 것인가. 많은 것을 체념하고 살다보면 이런 얼굴이 될 것인가. 마음이 복잡해진다.
사람이 살면서 몇 번의 고비를 만나듯이
여행에도 빙점이 있다.
여행 초기의 뜨거웠던 피는 식고
마침내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얼어붙는다.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든 시들하다.
(중략)
누구에게나 '빙점'은 있다.
반드시 찾아온다.
인간의 빙점을 녹이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의 체온이다.
어쨌든 사귀어보라. (514~515페이지)
인간에게 실망하다보면 다시는 인간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또 마음을 여는 건 인간때문이다. 다시금 인간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그. 사진속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루한 인간이든, 그들이 창녀든, 시장 사람들이든. 다시금 인간에게 마음을 여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그의 사진 속에서 발견한다.
그는 그저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했다. 남루한 일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그의 글에서 삶의 한 부분을 엿보았다. 일상을 떠난 가까운 여행지에서 이 책을 읽었다. 작가처럼 여행의 기록을 사진과 함께 남기고 싶다. 오래도록 읽힐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비로소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여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