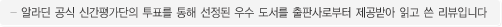[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김연수 지음 / 자음과모음 / 2012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지난 해, 일본의 쓰나미를 tv에서 처음 봤을 때, 놀라움에 앞선 눈으로 보고도 이해할 수 없어 의아했던 것은 바로 그 ‘시커먼 덩어리’들 자체였다. 끈적끈적한 검은 그 실체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고, 입을 벌린 채, 그 참상, 그 비극을 막연하게 바라보았다. tv 영상 속, 그 불가사의한 이미지가 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때로 그리워하던 바다의 푸른빛이 아니었다. 바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전부인 냥,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 지난 해 쓰나미가 몰고 온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 심연의 바다 속의 제 빛깔은 상상 조차 못했던 전혀 다른 빛으로 나는 그 심연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리라. 아니 우리는 그 심연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였다. 아닌 자각한 적이 있기는 할까? 그래. 설사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깊은 심연을 어떻게 넘나들 수 있을까? 심연을 건너 타인에게 오롯이 가닿을 수 있는 마법의 날개가 있다면? 그 희망은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일시적이나마. 마법의 날개가 내 등에. 오늘 앞뒤 정황과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이해에 앞서, 그저 어떤 문자에 노발대발 화를 낼 뻔했다. 천만 다행이도, 나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고, 마음속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오해는 사람 사이의 심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저 심연보다는 드러나는 일부의 외양이 모든 것인 듯 우리는 쉽고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합리화하기 바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 감각의 예리함에 앞서 그저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으로 왜곡한다. 동시에 타인에게는 더욱 매서운 잣대로 제단할 뿐이다. 그러나 그 심연의 존재, 그 심연 속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날카로움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또한 가슴 먹먹한 이야기로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여고생 ‘정지은’은 미혼모로 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가 수면 위에 떠 있는 어떤 일부의 사실이다. 그리고 한 여선생은 ‘정지은은 아빠가 자살하는 걸 무력하게 지켜봤지요’라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 날 그녀는 ‘난 최선을 다할 거야’를 외치며 어둠을 달리고 있었다. “거기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은 고통스럽지 않고, 슬프지도 않다. 우리와 그 아이의 사이에 심연이 있고, 고통과 슬픔은 온전하게 그 심연을 건너오지 못했다. 심연을 건너와 우리에게 닿는 건 불편함뿐이었다.” (286) 그리고 많은 우리들은 늘 그렇게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외면하고 자신의 불편함만을 자각할 뿐이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엉키고설킨 관계의 틈 속에서 과연 타인만의 고통과 슬픔일까? 그렇게 타인만의 고통과 슬픔인 채로 20여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행복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푸른빛이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시의 회색빛이 감도는 푸른빛, 그런데 점점 마음은 평온하고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우울의 깊은 수렁이 아닌 차분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 여정에 빨려 들어간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픈 호기심에 앞서, 마음 끝을 간질이는 표현들에 설레고, 여러 인물들이 빚어내는 진실의 다른 빛들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내가 작가 김연수의 알게 된 지는 조금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만나 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첫 느낌은 모호한 것이었다. 뭔가 매력적이라면서도 낯설고 애매했다. 그리고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란 신간을 접하면서도 ‘음~ 나중에 읽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양 갈래머리를 한 소녀의 뒷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그래도 거기까지였다. 그런데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라는 문구에 마음이 조바심을 쳤다.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이 가을의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랑살랑 흔들리며 따끈따끈 아련한 연애소설을 탐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로, 그 의아함은 더 큰 호기심을 낳았다. 그리고 ‘카밀라’라는 한 입양아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선 여정, 그리고 미혼모인 엄마를 찾는 과정 속 많은 이야기들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들이 고개를 들 때면, 그 이야기 자체에 함몰되었다.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을 느끼면서, 그 어떤 사랑이야기보다 가슴이 시려왔다. 단지 진실을 드러낸 듯 툭 던지고 끝을 맺는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서술에 시선을 사로잡혔다. 또한 충격적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앞서, 그 드러난 사실 이면의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증언과 이야기 전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도록 팽팽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야기를 이끌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무척이나 흥미진진하게, 그 미지의 심연의 세계를 탐하고자 했다. 그런데 나는 작가가 쓰지 않은 이야기를 읽었을까? 그는 묻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아쉬워 나는 다시금 펼쳐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