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읽는 스릴러. 이러면서 집어든 책이 넘 두꺼워 그만 주말을 넘겨 오늘까지 읽고 있다. 하긴 존 카첸바크의 책을 스릴러라고 한다면 좀 섭섭한 일일 수 있겠다. 스릴러의 재미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내밀한 본성을 아주 섬세하고 짜임새 있게 묘사하는 작가니까. 나는 아마도 스릴러라고 집어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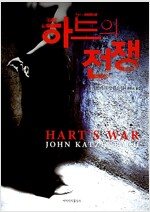
이 책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다. 일종의 법정 드라마.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공군항법사였던 토미가 연합군 수용소에 들어가 체류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백인의 죽음을 만나게 된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전부터 그 백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흑인' 군인 링컨 스콧. 하버드에서 법을 전공한 토미에게 이 흑인의 '형식적인' 변호사 역할이 주어지면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되었다. 흑인에 대한 여전한 편견이 여과없이 나타나고 토미는 그의 무죄를 믿고 변호를 준비하는 장면...까지를 읽어내었다. 아마도 이 뒤에는 뭔가 무서운 음모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흥미진진해. 뒤 내용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존 카첸바크의 번역된 책은 다 가지고 있다. 다 재미있게 읽었고 <어느 미친사내의 고백>이나 <애널리스트>는 소장하고 싶은 책이기도 해서 절대 중고샵에는 내놓지 않을 작정이다.




스콧이 눈을 가늘게 뜨고 늙은 영국군 조종사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다른 미국인 동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동안 말입니까?" 그가 눈에 띄게 신랄하게 말했다. "내가 알기로 믿음이란 신뢰를 얻은 사람에게 남아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요구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상공에서 나란히 비행하는 중에 심한 옆바람에 흔들리면서, 메서슈미트와의 싸움에 함께 뛰어들며 생기는 거죠. 믿음은 가지기 힘들지만 한번 가지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 존 카첸바크, <하트의 전쟁 (Hart's War)> 중에서.
믿음에 대해 참 공감가게 쓴 글이라 옮겨 놓는다. 믿음은 가지기 힘들어서 한번 가지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이 배신으로 다가올 때는 정말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냉정함으로 바뀌기도 한다. 여러번 경험했고 그게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이 책, <하트의 전쟁>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브루스 윌리스와 콜린 파렐이 주연으로 나오는. 역시나 책보다는 한참 못했고. 책보다 나은 영화가 어디 흔하던가. 그 때 포스터를 보니, 브루스 윌리스가 10년 전만 해도 참 젊었었구나 라는 뜬금없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