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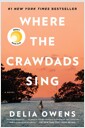
-
Where the Crawdads Sing (Paperback) - '가재가 노래하는 곳' 원서
G. P. Putnam Sons / 2019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평소에는 눈물을 자주 흘리는 편이 아니나 이 책을 읽으며 후반부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이 자주 붉어졌다. 책 전체에 외로움과 무서운 편견이 관통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슬픔은 마음 졸이게 하지만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법정 공방을 겪고 승화가 된다. 법정 소설이나 영화는 항상 매력적이다. 해피엔딩이 불안 불안 하다고 느끼며 마지막 장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반전이 있었다.
모든 책이 교훈적일 수 없으나 반전으로 인해 나의 눈물이 멈추며 허탈한 심정도 들고 왜 작가는 그런 결말을 택했을까 궁금했다. 단순히 도발적인 끝맺음으로 독자에게 흥미를 더해주기 위한 장치였을까? 반전이 아닌 무죄 판결의 행복한 결말에서 끝났어도 충분히 좋았을텐데 마지막 주인공의 치밀한 필살기 복수를 생각하니 그녀를 향해 있던 일관된 가련한 마음이 희석되기도 했다.
물론 나는 읽는 내내 주인공 Kya편이었다. 가정 폭력과 편견으로 인해 외롭게 습지에서 삶을 살았던 Kya는 자신이 곧 외로움이자 고립이라고 말한다(I am isolation).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그녀가 사랑한 습지, 갈매기, 조개, 학 등을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그녀. 아빠의 알콜 중독과 폭력으로 모든 가족이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자연이 기르고, 가르치고, 보호한 그녀이다. 갈매기 외에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평생을 필명으로 시를 써서 출판사에 기고한 그녀는 작가이기도 했다. 습지에 홀로 살며 습지 전문가, 화가, 작가가 되어 책까지 출판했지만 여전히 습지 소녀(marsh girl)로 불리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로운 성장과정을 통해 뒤늦게 만난 오빠 Jodie는 그녀가 사람들을 증오할 모든 이유를 가진게 당연하다 위로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한 것이라 말한다. 그녀가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것일까 아니면 배척을 당해서 달라진 것일까라는 표현이 마음 아프다. 책 전반에 흐르는 편견(prejudice)은 누구의 자화상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지 상기시킨다. 시대적 배경이 52년으로 시작하지만, 21세기라 해서 우리의 사고가 반드시 업데이트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책의 백미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넘쳐 흐르며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 이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는 묘사 장면이 어려웠으나, 동물행동학자이며 야생생물 과학자인 작가가 일흔 가까운 나이에 처음 펴낸 이 소설 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었다. 습지 전문가인 Kya가 모든 상황에 생물학적 원리를 적용하며 인간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The Selfish Gene’이 생각났고, 동식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 부분에서는, 이끼(moss)연구에 대한 소설이었던 ‘The Signature of All Things’도 오버랩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도 7년이나 보냈고 넌픽션을 많이 썼던 작가가 소설의 옷을 통해 흥미를 더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도시에 살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길 바라는 나의 이중적 삶이면서도, 나는 항상 환경에 관심이 높으며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 식물이나 환경에 대한 나의 관심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Kya의 불행한 환경과 외로움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생태학자/자연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녀의 삶을 위한 고군분투가 너무 눈물겹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줄 모르는 그녀가 Tate Walker를 기다리다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결국 돌아온 그의 진심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도 애잔하다. 상처를 준 것은 Tate Walker인데 왜 여전히 피흘리며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녀에게 용서의 책임을 떠맡게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주인공의 슬픔, 외로움, 자연에 대한 애정, 사랑을 들여다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소문난 책 평점에 비해 진입장벽이 어려웠던 초반부를 지나서는 기다림과 인내의 소중함도. 나의 이런 배움들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를!
He was a page of time, a clipping pasted in a scrapbook because It was all she had. (p. 198)
Why should the injured, the still bleeding, bear the onus of forgiveness? (p. 198)
You can‘t get hurt when you love someone from the other side of an estuary. (p. 354)
Nature had nurtured, tutored, and protected her when no one else would. If consequences resulted from her behaving differently, then they too were functions of life‘s fundamental core. (p.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