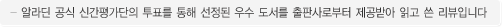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 박찬일 셰프 음식 에세이
박찬일 지음 / 푸른숲 / 2012년 7월
평점 : 


'그때가 좋았지.'하는 미련과 아쉬움이 잔디처럼 쑥쑥 자라나는 나이가 되면 웬만한 기억들은 아름다운 빛깔로 채색되기 마련이다. 조금은 생략되고 뒤틀릴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잘 꾸며진 추억들이 남겨진 삶을 지탱하는 자양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누구나 가슴 한가득 추억의 꾸러미들을 끌어 안고 사는가 보다. 그러나 생살을 찢는 듯한 아픈 기억은 저 무의식의 심연에 묻혀 정처없이 떠돌 수밖에 없음을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음식이나 요리와 관련된 책을 읽었던 경험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잊혀질 만도 하건만 그때의 기억은 트라우마처럼 남아 시간을 부표처럼 떠돌다가 가끔씩 마음을 훑고 지나갈 때면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곤 했다.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은 내가 요즘의 어린 학생들에게 내 유년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면 '설마'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곤 한다. 아이들은 내 얘기가 아주 오래 전, 조선시대의 어느 산골에서나 있을 듯한 이야기쯤으로 들리는 모양이다.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었음직한 잔뜩 부풀려지고 과장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식하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나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현 시대와는 동떨어진 고립된 삶을 살았던 듯하다. 그랬음에도 나는 내 또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려니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고, 여러 책들을 읽고나서야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조차 대개는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실이 나를 몹시 당혹케 했고, 내 기억 속의 어린 내가 한없이 측은하고 안타깝기만했다.
내 추억의 일부로서 음식을 기억하는 것은 극히 적다. 의식적으로라도 지우고 싶어서였겠지만 내게 있어 음식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다. 지금 생각해도 까닭을 알 수 없지만 나의 아버지는 식사시간마다 어머니와 다투셨고 급기야는 매번 폭력으로 이어졌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가족들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숨 죽인 채로 자신 앞에 놓인 음식을 어떠한 맛도 느끼지 못하고 식사를 마쳐야 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공포가 스며든 음식. 모든 감각은 오직 다가올 공포에만 집중되고 음식을 통하여 즐겨야 할 맛의 축제는 사라진다. 여유가 없는 팍팍한 삶이었지만 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가난이나 배고픔이 결코 아니었다. 맷돌에 간 옥수수에 감자를 섞어 약간의 찰기를 더한 밥이 우리 가족의 주식이었다. 내가 쌀밥을 처음 먹어 본 것은 국민학교 일 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반찬이 더 있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때 먹었던 흰 쌀밥은 왜간장만으로도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
작가 박찬일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책에서 그는 유년 시절에 자신이 맛보았던 추억의 음식과 시칠리아 유학시절의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문학 작품 속의 맛을 소개하고 있다. 제목에서 말하듯 '추억의 절반은 맛'일지 모른다. 그러나 맛의 절반은 사랑이다. 어쩌면 맛의 전부는 사랑일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책을 읽는 내내 동그마니 외로운 내 유년의 아이는 그 형체마저 아스라히 멀어져만 가고 그 가억의 작은 조각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은 페이지를 세어야만 했다. 사랑이 없는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는 오래도록 허방을 디딘 사람처럼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게 마련이다. 우리가 추억하는 것은 즉물로서의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에 곁들여진 사랑의 분위기였다. 결국 맛의 절반은, 또는 전부는 사랑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