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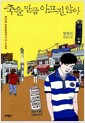
-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 제16회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작
황현진 지음 / 문학동네 / 2011년 9월
평점 :



지금까지의 내 삶에 큰 굴곡이 없어서인지(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엔 큰 굴곡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망각하고 있는지도!) 성장소설을 읽을 때면 늘 올바르고 밝고 희망찬 얘기들이 채워져 있길 바라고 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만족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학교를 다니면서 보충수업조차도 땡땡이 한 번 치지 못하던 내가, 그러면서 공부는 못했던 내가 조금은 발라당 까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날 때면 눈살이 찌푸려지곤 한다. 정말 고리타분하게 ‘그러면 못써!’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독립을 하지도 못했는데 부모가 이민을 가고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쾌재는커녕 제발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어떻게 부모란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악다구니를 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태만생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며 자신에게 닥친 자유를 만끽하기로 다짐한다. 이태원 짝퉁가방 가게 알바생이자 용화공고 3학년인 태만생과 곧 재개발이 될 용산구 한강로 101번지 주민들 이야기를 배경으로 얽혀 들어가는 이야기는 묘하게 다르면서도 닮아있었다. 태만생의 주거지에서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짝퉁가방 가게의 삶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태만생이 알바하는 곳은 왜 하필 이태원의 짝퉁가방 가게였을까?
조선시대의 고아원이었던 이태원. 생긴 모양이 다른 아이들을 키워냈던 곳. 그곳에서 태만생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방을 파는 알바를 하고 있다. 이태원이란 공간도 진짜가 아닌 짝퉁 가방을 파는 것도 현재 혼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태만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20살이라는 경계를 넘어야 하고 대학이라는 관문을 넘다 못해 부모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태만생. 어쩌면 누구나 그 시기에 가졌던 혼란을 대변하듯 이태원과 짝퉁가방 가게는 묘하게 맞물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짝퉁가방 가게 사장에게 키를 1cm 속였다는 이유로 B급 짝퉁이 된다는 잔소리를 듣는 곳. 그곳은 정글로 비유되는 사회의 한 부분이었지만 꼭 그렇게 사회란 곳이 짝퉁과 진퉁으로 나뉜 곳은 아니란 점을 말해주고 싶기도 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서 잠도 못 이루고 내 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혼란스럽던 시기에 일어나면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었다. 태만생에게도 이민 간 부모, 알바생활의 힘듦도 있었지만 알쏭달쏭한 연애 이야기도 있었다. 순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 이야기들. 내 경험을 뒤져봐도 지우고 싶던 순간과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확연하게 나뉜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한 연애라면 늘 실수와 후회가 동반되고 감정이 쉼 없이 바뀌기도 한다. 진로, 연애, 현재 자신이 처한 자리들을 보니 내가 저 나이 때 저랬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부산스럽기도 한 이야기들이었다.
들쑥날쑥한 인물들의 마음의 변화만큼이나 실감(?)나는 거친 언어를 듣고 있으니 그들이 처한 현실이 조금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했다. 무엇하나 밝고 맑고 명랑하게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했고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나올 수 있을까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 또한 그런 시기에 결코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으니 뭐라 진부한 말을 끌어내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은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연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 대로 행동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도 별 특징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랬다면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란 아찔함이 인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썩 유쾌하진 않지만 하나의 과정으로 보려한다. 지금 이렇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