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첸바크의 <하트의 전쟁>을 읽고 있다. <어느 미친 사내의 고백>때도 그랬다. 디따 재미없어 보이는 표지;; 엄청난 분량.
사고 나서 한참 지나서야 읽고 마구 재미있어했더랬다. 그 다음에 읽은 <애널리스트>는 사자마자 읽었지만, 재미는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고,
그렇게 두 권의 카첸바크 책을 읽고, 또 한 번 기대하며 <하트의 전쟁>을 구매했다.
여기서 하트는 토마스 하트, 주인공의 이름이다. 2차대전 당시 항법사로 공군에 있다가 비행기 격추후 바다에서 구출되어 독일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이야기는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숨막히는 법정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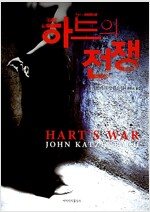 이제 초입 부분인데, 흥미진진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무지 많다. 나는 전쟁소설을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잘 써진 전쟁소설은 좋다.
이제 초입 부분인데, 흥미진진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무지 많다. 나는 전쟁소설을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잘 써진 전쟁소설은 좋다.
카첸바크의 책은 재미없어 보이지만 ;;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 줄거리만으로도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또한 대단하며, 캐릭터의 심리묘사가 그야말로 최강이다.
재미난 미스터리들은 많지만, 흡입력 강한 이야기. 이야기에 빨려드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를 써낸다.
<하트의 전쟁>은 이전에 읽었던 <어느 미친 사내의 고백>과도 <애널리스트>와도 또 다른 느낌의 이야기이다.
법정드라마로 들어가기 전에 포로수용소에서의 일상을 묘사하는 디테일이 무척 훌륭하다.
토미는 침대 옆 선반에서 <버크의 형사 소송의 요소>를 집어 들고 101막사에서 나왔다. 막사 앞에는 그가 직접 만든 의자가 놓여 있었다. 스탈라그루프트 13 수용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적십자에서 보내온 구호품이 들어 있던 나무상자의 판자를 이용해 만든 의자로, 전미 철도여객수송공사에서 사용하는 의자와 비슷한 모야이었다. 포로수용소에서는 누군가 가구를 만들면 많은 사람이 감탄하면서 그 즉시 비슷한 모양으로 따라 만들곤 했다. 의자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있었다. 의자를 고정하는 못도 여섯 개만 있으면 되었고, 실제로 완성된 의자는 제법 편안했다. 토미는 자신이 수용소 생활에 유일하게 공헌한 게 있다면 그 의자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낮의 햇살이 드는 자리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책을 펼쳤다. -49-
포로 수용소에서 가구를 만드는 군인들 이야기라던가,
크리기들은(수용소의 포로들) 싸우지 않았다. 협상을 했고 토론을 했다. 이 안에서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 수용소에 작은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들이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일 뿐만 아니라,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항상 충돌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거나 주도면밀하게 피해 다녔다. 분노를 참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철조망이나 독일군들, 즉 여기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불운에 대한 분노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격추당했다는 불운이 결과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85-
군인의 절도를 지키며 싸우지 않는 포로수용소에 갇힌 거친 남자들 이야기.
포로 수용소 안에서 계급은 유지되고, 최고위 직급인 맥나마라 대령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독일군에게도 존중받는다.
흑인인 스콧 중위가 수용소 안의 트레이더이자 백만장자였던 빈센트를 죽인 혐의로 처형에 처해지기 직전. 하버드 로스쿨 재학중에 군대에 지원해 포로가 된 하트가 스콧의 변호를 맞게 된다.
이제 1/5 정도를 읽었을 뿐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야기가 무척 많다. 하트가 도움받게 되는 영국군 고위장교이자 명변호사였던 필립, 하트를 도와주는 캐나다 경찰출신 휴, 그리고 상대편이지만 범상치 않은 독일장교 피써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펼쳐지고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두 번, 세 번 읽어도 두근거리는 이야기의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디테일과 감동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읽는 카첸바크의 책에서 새삼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상치 않아 보이는 독일군 장교 피써가 하트와 휴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 앞의 상황과 대사는 다 짤랐지만, 이 상황에서의 이 대사가 뭔가 뭉클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불운에 사로잡혀 있지. 안 그런가?"
그간 재미나게 읽었던 전쟁소설.이라고 한다면 잭 히긴스의 독수리 정도인데, 이 책도 내 빈약한 추천 전쟁소설 리스트에 들어가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