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야자키 하야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미야자키 하야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7권이고, 홈즈 전집 같은 양장에 (반양장은 아니지만, 양장도 아닌데, 양장이라 우기면 열받고, 반양장이라 하면, 좋은걸? 싶은) B5 판형이라 크고, 종이질도 좋다.
다들 극찬하고.. 그러니깐, 책 읽다 보면 어찌나 이 책 저 책에서 회자가 되는건지 말이다.
왠지 품절될 것 같고... 해서 후회하기 전에 사 둔
그런 책인데,
지난 밤 읽으며 펑펑 - 눈물 질질 -
애니를 보고, 만화를 보면 좋다고 하는데 ( 애니가 만화의 발끝이나 겨우 따라 온다는)
만화를 보고, 애니를 보려니깐, 아.. 나는 애들 다 죽는꼴 진짜 다시 못 보겠다.
너무 힘들게 본 만화라서 애니로 그걸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다.
책을 읽고 나서 ' 아 - 좋았다' 하는 책이 있고, 읽으면서도 '진짜 좋다' 열광하는 책도 있는 한편 몸에 남는 책이 있다. 머리나 마음에 남는게 아니라 몸에 남는 지독한 책
이 책이 나에게 그렇다.
펑펑 운건 그렇다 치고, 이 세계에서 나는 쉬이 발을 뺄 수가 없어서, 다른 책을 읽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문득 내가 나우시카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책이었다.
 사사키 조 <제복수사>
사사키 조 <제복수사>
주재소 경관이 주인공인데, 이 주재소 경관은 15년 형사 출신이라 보통 주재소 경관이 아니다.
주재소 경관이 뭐냐면, 동네 순경 아저씨. 라고 역자후기에 써 있다. 근데, 동네 순경아저씨라는게 있나?? 지구대 경찰 아저씨 이야기하는거야? 언제쩍 동네 순경 아저씨람
여튼, <폐허에 바라다>가 예상외로 너무나 맘에 퍽 하고 와 닿았어서 말이다.
<제복수사>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다. 사사키 조의 다른 경찰소설인 <경관의 피>보다는 <폐허에 바라다>에 가깝다. 단편이기도 하고. 그 단편들이 연결되는 면도 없지 않고.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기'라는건 <폐허에 바라다>가 훨씬 강하다.
그러나 <제복수사>도 좋긴 돟다. 400페이지라고 하는데, 판형이 작아서인지, 정말 금새 읽었다. 기분상 한 200페이지대 책 읽은 것 같다는. 별 다섯개지만, <폐허에 바라다>는 별 다섯개 중 여섯개인 작품이었어서 아무래도 ...
 브루노 무나리 <디자인이 디자인을 낳는다>
브루노 무나리 <디자인이 디자인을 낳는다>
아 ... 실패... 책은 예쁘고, 안에 글도 보려면 못 볼 껀 아닌데, 에세이.. 같은 거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실무 방법론 같은게 아주 딱딱한 글로 나와 있다. 다행히(?) 그림이 많아서 -_-;; 그림에 의존해가며 보고 있다. 그림이 많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 ( 틀려서가 아니라 몰라서 'ㅅ') 이 많아서 멍 때리며 술술 ㅡㅜ 넘기고 있다.

스티븐 킹 <죽음의 무도>
한동안 손에서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오늘 아침에 읽은 꼭지는 '지킬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헤헤 이 책 정말 최고다. 레퍼런스로도 글과 장르와 문화로도. 읽으면서도 이건 아주 많이 괜찮은 책이군 고개를 노혼혼마냥 끊임없이 끄덕이고 있다. ....... 게다가 재미까지 있어! 뭐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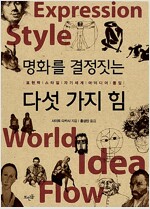 사이토 다카시 <명화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힘>
사이토 다카시 <명화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힘>
앞에 좀 들쳐보니, 도판이 영 별로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꽤 재미있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명화를 보는 결정짓는 다섯 가지는 스타일, 자기세계, 아이디어, 몰입, 표현력의 다섯가지이다.
저자의 명화감상 이야기는 마구 신선한건 아니지만, 함께 가슴 뛰는 정도는 되어서
게다가 그 다섯 가지 힘은 '명화' 뿐만 아니라, 세상만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 좀 좋아한다), 이리저리 메모하며 재미나게 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