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트 사이드의 남자 1, 2]의 서평을 써주세요.
[이스트 사이드의 남자 1, 2]의 서평을 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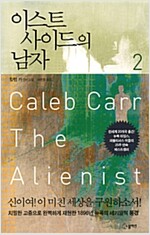
세상은 넓고, 책은 많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책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남들이 다 좋다는 책이거나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권하는 책을 읽더라도, 그 책과 자신과의 궁합은 어찌될지 알 수 없으며, 그 궁합이라는 것이 '맞춰봐야지만', i.e.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이라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루먼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는 이 전과 이 후에 이미 사이코패쓰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연쇄살인범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픽션, 논픽션 가릴 것 없이 질리도록 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 이 책은 논픽션이긴 한데, 소설의 작법을 이용하여, 신저널리즘을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다고 한다. 소재 자체가 요즘의 독자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은 해가 되면 됬지, 득은 없다고 본다.) 그가 이야기 하는 방식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읽은 에릭 라슨의 <화이트 시티> 역시 논픽션이고, 그 자신이 트루먼 카포티의 <인 콜드 블러드>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 바도 있듯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인 콜드 블러드>만큼은 못하지만, 대신 <화이트 시티>는 그 소재가 대단히 흥미롭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논픽션인 것이 더 큰 재미를 줌) 19세기 후반의 미국. 지금의 젠체하는(난 이걸 좋아함) 겉모습 전에 날 것의 미국이 있었고, 그것이 19세기 후반이다. 이 시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대단히 흥미롭다. 무튼, 미국의 19세기 후반의 그 분위기에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 시카고를 배경으로 세계박람회를 기획한 건축가와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홈즈박사의 이야기이다. 실재하는 연쇄살인범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책은 세계박람회, 시카고, 건축가들,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동시에 함으로써, 묘한 패치워크, 매력적이고 독특한 전체그림을 보여준다.
<인 콜드 블러드>와 <화이트 시티>를 항상 함께 이야기하곤 했는데, 여기에 더해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발견. 야호-
이번엔 픽션이다. 칼렙 카의 <이스트 사이드의 남자 / 원제 :Alienist> 가 그것인데, 배경은 역시 19세기 후반이다.
TR( 테어도르 루즈벨트)와 신문기자 범죄 담당 무어, 에일리어니스트 크라이쯜러 박사 (정신 병리현상의 연구가 막 시작될 때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에일리어니스트, 지금의 말로는 정신과 의사라고 불렀다.) 가 소년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일단, 칼렙 카가 19세기 뉴욕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리서치를 했음을 소설 곳곳에서 알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당대의 애티튜드를 잘 살렸고, 그것이 또 재미의 포인트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 살해에 대한 작금의 미드나 스릴러에 익숙한 나에게 그깟 하류층 어린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뭐. 하는 분위기. 미디어도 경찰도 죄다 외면. 그런 현실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맨땅에 헤딩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이다.
더럽고, 범죄의 온상, 부패, 광기, 갱, 빈민, 정신병자들, 등등이 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뉴욕의 19세기 후반 모습이 엿보이는 역사적 팩트들을 보는 재미, 사이코패쓰라던가 프로파일링 기법이 처음 생길랑 말랑 할때의 그 논의들!(아, 이런거 너무 재밌다!) 법의학 소설의 창시자라는 오스틴 프리맨의 <노래하는 백골>의 경우, 20세기 초의 첨단과학기법( 지문감식이라던가 섬유분석 등) 이야기는 상당히 지루했다. CSI류의 드라마로 인해 눈만 잔뜩 높아진 독자에게 뭐랄까, 역사의 시작을 본다기보다는 너무 적나라하게 '이게 시초였어' 하는 듯한 이야기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이코 패쓰, 프로파일링의 시초쯤으로 보이는 정신병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롭다.
"아니요, 할머니." 나는 빠른 걸음으로 두툼한 페르시아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가며 대답했다. "홈즈 박사예요." H.H. 홈즈 박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학적인 살인마에 사기꾼으로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범죄자다.
-> 무어가 홈즈박사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는 할머니에게 농담을 건네는 장면인데, 여기 나오는 홈즈 박사가 바로 <화이트 시티>의 주인공인 최초의 연쇄살인범 홈즈 박사다. 바야흐로 미국은 이런 시기였던 것이다.
크라이즐러가 창가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블라인드를 완전히 걷었다. "존, 기억할 걸세, 몇 년 전 리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넨 런던에 있었잖아."
"당연히 기억하지." 나는 부루퉁하게 대답했다. 그 사건 때문에 휴가를 망친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1888년 런던에서는 굶주린 흡혈귀가 3개월에 걸쳐 이스트엔드의 매춘부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살해한 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 잭 더 리퍼사건이 언급된다. 세계는 바야흐로 연쇄살인범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
"설마 그 윈슬로가 자네한테 길을 제시해줬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나는 놀라며 물었다.
"순전히 우연이네. 그는 리퍼에 대한 터무니없는 논문 하나에서 사건 용의자를 지목하면서 만약 자신이 살인자의 익히 알려진 습성에 맞아떨어지는 '가상의 인물'(그래, 그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표현했어)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보다 더 낫게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했지. 물론 그가 염두에 둔 용의자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난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네." 크라이즐러는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범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네. 게다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기껏해야 빈약한 정황상의 근거만 있을 뿐이지. 범인은 어쨌든 몇 년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의 테크닉을 완벽하게 갈고 닦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인간 유형을 그려보는 걸세. 그 그림이 완성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증거가 극적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네.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 찾는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볏짚 다발에서 바늘 찾는 일이 되는 거지."
-> 아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로버트 레슬러의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보다 더 전에 시작은 이랬다. 이랬을 것이다. 그러니깐, 프로파일링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다. 읽으면서 막 오- 오- 이러면서 읽었다는 ^^;
이 외에도 이 책의 미덕은 더 많다. 나머지는 리뷰와 책에서 확인하시랍- <인 콜드 블러드>에서 <화이트 시티>로, 다시 <이스트 사이드의 남자>로 이어졌는데, 이 라인이 또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이 책의 장점은 생생한 캐릭터와 플롯이라고 한다. 더 기대된다.어여 마저 읽어야지-
이 작가의 <셜록 홈즈, 이탈리아인 비서관>도 일단 보관함으로 들어간다. < ㅑ 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