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리브 키터리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지음, 권상미 옮김 / 문학동네 / 2010년 5월
평점 :



그녀는 외로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올리브는 생이 그녀가 ‘큰 기쁨’과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큰 기쁨은 결혼이나 아이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작은 기쁨도 필요한 것이다. 브래들리스의 친절한 점원이나, 내 커피 취향을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의 여종업원처럼. 정말 어려운 게 삶이다.
목련이 지고 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도 봄날인지라 순백의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아리따움의 절정을 이루더니 이내 불어온 북풍에 여리게 떨어져 바닥으로 분분히 낙화한다. 목련은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을 잊지 말라는 자연의 교훈처럼 목련의 아름다움은 봄의 극치를 이루고 떠나간다. 불현듯 목련처럼 청아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지내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낙화한 꽃잎에 불과하지 않을까하는 슬픔이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요즘이다. 불혹 不惑이 아닌 부록附錄 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나는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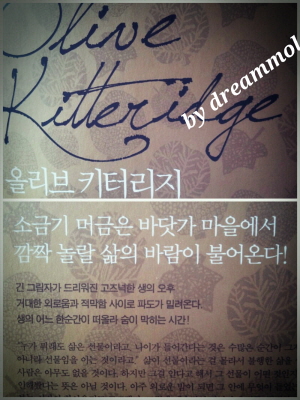
《올리브 키터리지》에는 열세편의 단편들이 실려 있다. 단편들은 각자 독립적이면서 한 명의 주인공 올리브 키터리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편<약국>은 올리브의 남편 헨리 키터리지의 이야기이며 <작은 기쁨>은 올리브 키터리지의 아들 크리스의 이야기이다. <밀물>의 주인공인 케빈은 어머니의 자살이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과거 수학선생님이었던 올리브와 해변에서 조우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피아노 연주자>의 앤지 또한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어른아이이다. 노년의 사랑이야기인 <굶주림>과 <다른 길>에서는 ‘빈등지증후군’이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하먼과 거식증에 걸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무쌍하고도 예측 불가한 삶의 이면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의 상실과 아픔에는 항상 올리브가 존재한다. 그녀는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존재감을 내세우지도 않지만, 심지어 무감할 정도로 보여지지만, 아주 조금씩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실제로 올리브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신경하다. 아들 크리스와의 불화는 그런 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남을 위해서는 발 벗고 나설 정도로 정 많고 이타적이지만, 사회에서 도덕적이고 완벽한 이성의 소유자로 완벽함을 추구해왔기에 아들이 자신을 변덕스럽고 이상한 성격으로 몰아대거나 거리감이 있는 것을 못견뎌한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한때 우울증을 앓던 아들과 절연을 하다시피 하고 남편 헨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올리브의 외로움과 고독은 극에 달한다. 그때 올리브는 72세였다. 갑작스럽게 나이듦과 외로움을 참아내려 애쓰는 올리브를 보면서 내 나이듦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삶에 자주 등장하는 올리브 키터리지는 한국에서 소위 ‘아줌마’라 불리우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강하고 욕도 잘하고 억척스럽지만 내면에는 섬세한 여성성이 잠들어 있다. 올리브의 섬세하고도 여성스러운 감정표현에서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그려질 때마다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느껴진다. 가령 아들의 결혼식에 입은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를 입었다고 며느리에게 뒷 담화하는 좋은 기회를 주었을지라도 올리브에게는 드레스가 더 소중했던 것처럼 비록 몸은 비대해지고 예전과 같은 아름다움은 없을지라도 여성에게는 미美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올리브 역시 자신의 늙음에서 찾아 온 노화의 모습에 끔찍해하면서도 나이듦이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듯이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려 애쓰는 모습은 먼미래의 내모습과도 닮아있다. 72세가 되어도 똑같이 외롭다고 말할 때는 더욱....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이 남자의 곁에 누우며, 그의 손을, 팔을 어깨에 느끼며 올리브는 생각했다. 오,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모른다. 그들은 이 커다랗고 늙고 주름진 몸뚱이들이 젊고 탱탱한 그들의 몸만큼이나 사랑을 갈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내 차례가 돌아올 타르트 접시처럼 사랑을 경솔하게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른다. 아니, 사랑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선택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그녀의 타르트 접시는 헨리의 선량함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부담스러워 올리브가 가끔 부스러기를 털어냈다면, 그건 그녀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알지 못하는 새 하루하루를 낭비했다는 걸.
내가 걸어 온 발자국을 되짚어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일상을 이루고 일상이 매순간 모여 삶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올리브 키터리지》는 삶의 사소한 것이 일상을 이루고 그 일상이 삶이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마치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일상이 만들어내는 슬픔의 씨줄과 나이 들어가며 더해가는 외로움이라는 날줄을 얽혀 삶이라는 무늬를 완성해가는과정과도 같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의 붓끝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운 삶의 서사는 그저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멀리서 보는 삶과 가까이에서 보는 삶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오히려 매순간들이 소중해지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어차피 삶에서 슬픔이라는 씨줄과 외로움이라는 날줄이 얽히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수 없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내 삶에도 부록附錄 만 남아있을지라도...... 삶을 완성하기 까지 외로움과 슬픔에 익숙해져야겠다. 별이 바람에 스치우듯 올리브가 남긴 삶의 바람이 내 곁을 스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