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 파리에 간다면 - 혼자 조용히, 그녀의 여행법
모모미 지음 / 이봄 / 2013년 10월
평점 :

품절

나는 파리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셀부르의 우산,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레미제라블, 모나리자, 토탈 이클립스(랭보), 물랭루즈, 몽마르뜨, 전혜린, 바르세이유의 장미, 고흐 형제, 그리고 달빛 흐르는 세느강의 밤 배.
파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다. 언젠가 아내랑 둘만의 여행을 갔을 때 아내는 파리가 별로라고 했다. 지저분하고 불친절해서 싫단다. 하긴 몽마르뜨로 갈적에 탄 택시의 운전사가 아랍인이었다. 그는 이리저리 골목길을 빙빙 돌면서 난폭하게 운전했고, 도착해서는 미터 요금보다 더 많이 요구했고, 게다가 팁까지 달라고 버티는 것이었다. 어디 그 뿐인가? 말도 통하지 않은 것은 이해한다 쳐도 태도가 영 시원찮았다. 그러니 아내가 질렸다는 표현 대신 파리가 싫다고 했을지도 몰랐다.
난 왜 파리가 좋으냐고 누가 물어온다면 망설임 없이 개방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 내게 파리는 예술의 도시요, 육감적인 도시요, 풍요로운 도시였다.
개인적으로 파리에는 출장과 여행을 합쳐 모두 5차례 이상 갔었다. 게 중에 한 번이 앞서 말한 아내와 함께 한 거였고.
모모미가 쓴 책,《다시 파리에 간다면》을 혹~하게 읽었다. 나도 파리에 대해선 제법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저자가 발품 손품 팔아 파리 구석구석을 누빈 정성이 온통 묻어나 있었다!

파리에서 머물렀던 스튜디오에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빛이 들었다.
자신의 방에 언제 빛이 드는지 안다는 것은
아마도 그 공간을 사랑하는 뜻일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 유난히 애착을 보인다. 후라이 팬도 하나 덜컥 사고, 스튜디오의 주인 베르나르와 니콜 부부를 비롯해서 이웃들과도 살갑게 지냈던 모양이다.
그녀의 친구 y는 파리에 오면 에펠탑은 못 봐도 ‘로댕 미술관’만은 꼭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난 그러질 못했다. 루브르, 오르세, 피카소는 둘러보았지만 로댕은 놓치고 말았다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못내 아쉽다.
y를 따라 로댕 미술관의 어느 전시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고 말았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내 시야에 맺혔다. 그것은 빛이었는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었다.(45쪽)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빛.‘ 그래,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그냥 느끼고 또 느끼는 거지. 지중해에 가면 강렬한 빛의 향연에 압도되듯이 말이다.
특이했던 풍경은 쉬는 날만 열린다는 카발로티 거리의 ‘휴일 미술관.’ 이 곳은 젊은 여성 예술가 두 명이 아이디어를 내어 상가 셔터문에 고갱, 모딜리아니, 로트렉 등 많은 에술가들의 작품을 그려 놓았다고 한다. 그러니 상점이 문을 열면, 곧 셔터가 올라가면 볼 수 없으니 이른 아침이나 일요일 오후에 찾아야 한다고 한다. 거리의 낙서(그래피티)와는 조금 색다른 느낌이 나서 좋았다. ^^

이제 완연히 가을이다. 이 맘 때 파리에서라면 어디가 좋을까? 저자가 추천하는 곳은 와인 파티가 열리는 베르시 공원이다. 이 공원은 한 때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이너리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400그루의 포도나무가 남아 있다고 한다.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이 공원에서 매년 와인과 관련된 큰 파티를 연다고 하니 벌써 내 마음은 현지에 달려가 있다.
이외에도 모모미는 발품으로 찾아낸 빌라촌, 거리 등등 탐나도록 이쁜 곳들을 두루두루 소개한다. 가령, 지도를 보아 우연히 ‘꽃들의 도시’를 발견하고 무작정 찾아가거나, 바스티유 근처 주말 시장에 갔다가 저 멀리 고가도로 위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그쪽으로 향한다. 여행이란 이런 것일 테지? 꼼꼼하게 일정과 볼거리를 체크하고 나서는 것도 알뜰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겠지만, 무작정 발가는 대로 맘가는 대로 길을 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내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곳은 스튜디오의 안주인 니콜이 소개해 주었다는 ‘파리의 고양이 마을’. 이 곳은 파리 19구에 있는 빌라촌으로 건물에 아르튀르 랭보, 클로드 모네, 폴 베를렌, 펠릭스 포르, 사디 카르노 등 프랑스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마을의 진짜 명물은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애교 넘치는 고양이들. 골목마다 많게는 서너 마리의 고양이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집주인들의 취향이 엿보이는 정원들이 세심하게 가꿔져 있다고 한다.
그녀는 살림꾼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벼룩 시장이나 재래 시장을 찾아다니며 그 풍경을 멋지게 스케치해서 보여준다. 시장 만큼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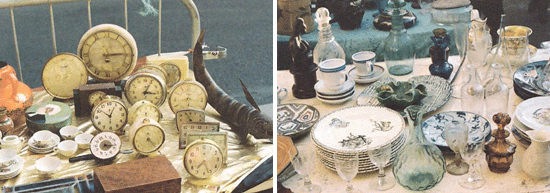
우리 가족이 영국에서 매주 일요일이면 인근 공원이나 공터에서 열리는 카 부츠 시장(차 드렁크에 물건을 싣고 와서 파는 벼룩시장)에 거의 빠짐없이 들러 어린이책, 장난감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한아름 사오곤 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게’도 실은 영국의 ‘옥스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파리지앵도 아나바다 정신이 몸에 배여 있는 모양이다. ^^
이 책을 읽다 보니 그간 파리에서 내가 놓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내가 다시 파리에 간다면, 그녀가 했던 것처럼 따라 해 보고 싶다. 게 중에서도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비오는 날 미술관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것, 트램을 타고 파리 외곽을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커피가 맛있는 카페에 앉아 거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녀는 책 부록편에 직접 둘러보고 꼼꼼하게 체크해 봤음이 틀림없을 진짜배기 카페, 레스또랑, 베이커리, 상가(벼룩 시장까지) 그리고 숨어 있는 볼거리들을 잔뜩 채워 놓았다. 이만하면 팬서비스도 만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