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想 셋. (2022년 5월 23일)


《서울리뷰오브북스 5호》의 리뷰를 읽다가 《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를 다룬 서평의 한 문장에 오래 눈길이 머물렀다. "빈자의 몸은 외부인이 망치를 힘껏 내리칠 때마다 ‘희망‘이나 ‘절망‘을 뱉어 내는 두더지 게임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 여러 형태의 폭력이 누적되고 마모되어 무엇 하나 쉽게 도려내기 힘든 끈끈이에 가깝다."(163쪽) 피해자다움, 빈자다움, 소수자다움과 같이 약자에게 특정한 윤리적 지위를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랬을 것이다. "가난한 개인을 등장시키는 순간 빈곤의 구조 대신 빈민의 품행을 왈가왈부하는 위험천만한 공론장"(160쪽)은 이미 실효성을 다한 근대 사회의 노동 윤리를 빈자들에게 휘두르며 그들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의 구조를 닮았다. 약자라면, 피해자라면 으레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혹은 이런 언어를 발화해야 한다는 막연한 감각이 얽히고 설킨 구조의 문제를 가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꿀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정치의 현실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진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이 꾸준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독립출판물 《IMO: 평택 기지촌 여성 재현》에도 눈길이 가는 이유다.
가난과 싸워 온 사람들이 가난한 개인을 전면에 등장시켰을 때, 이 개인의 몸이 다른 사람, 사물, 법, 정책과 연결되면서 펼쳐지는 세계를 서사화·역사화할 때, 우리는 은막의 구조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배치(assemblage)를 들여다보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 거대한 불평등의 시대, 선진국 진입을 자축하는 나라에서 이 배치가 정말 최선인지, 우리가 이 배치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어떤 연결이 생명에 대한 동료 인간의 예의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169~170쪽)
단想 넷. (2022년 5월의 어느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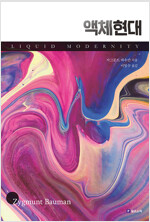

신간알리미를 통해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가 《액체 현대》로 다시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녘 출판사에서 '지그문트 바우만 셀렉션 시리즈'로 과거에 나온 저서의 개정판이 나오고 있었기에, 《액체근대》를 고되게 읽었던 경험이 떠올라 같이 번역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새 책은 필로소픽 출판사에서 나왔다. 바우만의 대표적인 개념인 'liquid modernity'는 셀렉션 시리즈에서 '유동하는 현대'로 통일되었으나, 이번 책에서는 '액체 현대'로 번역되었다. 용어 통일의 길은 요원해보인다.



책소개를 보면 개정판은 2012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번역되었고, 개정판 서문과 옮긴이의 글이 추가되었다. 이미 고되게 읽은 적이 있기에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지만([리뷰]불확실성의 세계 한복판에서) 문장들이 얼마나 다듬어졌을지는 궁금하다. '액체 현대'와 '유동하는 현대'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액체처럼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해버린 질서를 표현하는 데 동사가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출간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그의 성찰과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처 다 읽지 못하고 쟁여둔 그의 저서들도 읽어야할 텐데라는 부담을 가지고 마무리해야겠다. 힘들겠지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와있는 책들을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서 전집으로 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