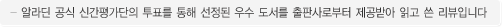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이건 취미인걸까? 직업인걸까? 아니면 취미가 직업이 된 걸까?
책장을 넘기면서 나무가 이렇게 매끄럽게 무언가로 형상화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내게 있어 나무는 가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는데 ‘나 참 삭막하게 살았구나!’ 싶었다. 그러면서 문득 어릴 적 인형놀이가 떠올랐다. 작가는 이야기를 상상한 후 나무를 깍았을까, 나무를 깍으면서 이야기를 상상했을까?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어릴 적 내가 가진 마론 인형은 3개였다. 제일 처음 유치원 때 선물 받았던 인형, 국민(초등)학교 3학년쯤 작은 엄마께 선물 받은 인형,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용돈 모아서 샀던 인형 이렇게 말이다. 첫 번째 인형은 너무너무 갖고 놀아서 나중엔 눈썹이 지워지고, 다리가 툭하면 빠지고 할 정도로 내 사랑을 받았었고, 두 번째 인형은 비주얼이 제일 이뻤었다. (작은엄마가 첫 선물이라며 인형을 사줬던 시장의 인형가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마지막 인형은 4학년쯤 갖게 되서 그런지 욕심에 샀던 것 같은데 앞의 인형에 비해 시들했던 것 같다. 인형을 갖고 놀기엔 나이가 좀 들긴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왜 그리 인형에 연연했었던지.. 그건 그렇고 아무튼 난 이 인형을 갖고 정말 수만수천가지 이야기를 만들었었다. 동화책 속 많은 공주도 됐다, 엄마한테 혼나는 어느 날의 내가 되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날마다 끝없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지금 어디로 가버린걸까?
어쩌면 이 책도 어릴 적 인형놀이의 좀 더 고급화된 어른 버전이 아닐까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놀이도,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마는데 작가는 그 놀이를 계속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참 부러웠다. 난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었던 소중한 인형이 어느 순간 어떻게 사라져버렸는지 기억조차 없는데 작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니 말이다.
기계라는 단어는 쇠붙이, 딱딱함이란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이야기를 만드는 기계’라니 기계가 돌아가면 이야기 보따리들이 둥실둥실 떠다닐 것 같다. 이야기가 모두 아름답거나 행복하진 않지만 부지런히 기계가 돌아가면 결국 나무는 어떤 형상이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인간의 삶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유한한데 비해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뻗어갈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이 기계는 충분히 멋진 것 같다. 나도 이런 기계 하나 갖고 싶다. 잃어버린 내 시간을 찾아 둥실둥실 시간여행을 떠나보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