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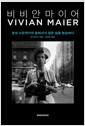
-
비비안 마이어 - 보모 사진작가의 알려지지 않은 삶을 현상하다
앤 마크스 지음, 김소정 옮김 / 북하우스 / 2022년 8월
평점 :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진을 찍히는 대상을 독점하는 것이다.
즉, 세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On Photography』
책 시작 전에 수전 손택의 인용구가 더 크게 다가오는 듯하다. 내가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7년 전 『비비안 마이어 나는 카메라다』였다. 그때 한 보모이자 가정부인 작가의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 현상되며 알려졌다. 그 후 같은 해 그녀의 '셀프 포트레이트'까지 보며 사진을 접했던 것 같다. 먼저 읽은 책은 스냅사진을 업으로 하는 친한 동생에게 선물로 줬고, '셀프 포트레이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책은 사진이 위주가 아닌 은둔의 사진가인 비비안 마이어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라 읽게 됐다. 사진집을 읽는 것과 다른 태도로 전기에 다가간다. 앞서 인용된 수전 손택의 말이 가슴에 닿는 것은 우리가 그녀가 독점하고, 세상과 특별하게 맺은 관계에 함부로 끼어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서문을 읽으며 7년 전 처음 접했을 때보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그녀의 생애를 엿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찍은 사진 중 4만 5000장은 현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비로웠다. 그리고 그녀가 찍은 사진을 통해 삶을 추적해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대단한 노력이 이 결과물을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권 다툼의 문제도 피할 수 없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는데 그녀가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보다는 결국 소유권을 얻으며 그녀를 세상에 알린 아마추어들의 공이 크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불운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책임을 지지 못할 불장난은 과거나 현재나 문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한다. 그래도 자식을 지킨 그녀의 외할머니가 있었기에 그녀의 작품들을 보게 된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녀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에 대한 결핍이 그녀의 직업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유년기의 삶도 그녀 자체의 이야기 보다 주위의 친척 친지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래도 비비안이 어린 시절 카메라를 접할 일이 있었다는 것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외할머니의 지인이자 어린 시절을 잠시 보낸 잔 베르트랑이 사진을 찍는 것을 어린 비비안은 보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그녀의 어머니인 마리의 카메라도 일상 속에서 그녀에게 존재감을 알리며 후일을 기약했는지도 모르겠다.
뉴욕에서 보낸 십 대 시절도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의 가족력 같은 정신병력은 분명 그녀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래도 주변에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훗날 그녀가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고, 사진을 찍는 데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초기 작품 : 프랑스' 드디어 그녀의 사진이 시작된다. 나와 다르게 제대로 스승을 두고 사진을 배운 듯하다. 내겐 책이 사진 스승이었는데... 뭐 결국 많이 찍어보는 게 답이라는 진리는 피해 가기 어려웠다. 초기에 찍은 사진들은 부끄러우면서도 애착이 가는 것은 다르지 않을 듯하다. 원샷 사진은 내가 추구하는 사진과도 비슷하다. 뭐 디지털이 되고는 셔터를 아끼지 않으나 다른 이들에 비해서는 많이 아끼는 편이기에... 요즘은 사람은 초상권 때문에 잘 안 찍고 꽃이나 하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 시기는 뭔가 활달한 작가의 표정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열정의 흔적을 들어 알게 된다. '초기 작품 : 뉴욕'에서는 그녀의 성격이 드러나는 지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녀와 뗄 수 없는 롤라이플렉스가 등장한다.
롤라이 플렉스는 역시나 캔디드 샷에 최적이었을까? 과거 지인의 카메라를 잠시 잡아봤던 순간을 떠올려 보게 된다. 사진작가로 성공하려는 야망은 없었다지만 사진에 대한 야망은 있었던 것 같다. 사진과 관련된 이들 곁에 맴도는 것은 내가 시인들을 여전히 주위에 두는 것과 비슷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진 부탁은 사진을 한참 열심히 찍는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당연시가 되는 일도 생기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번 파트는 롤라이 플렉스로 시작해 롤라이 플렉스로 끝난다.
'거리 사진'은 그녀 작품의 아이덴티티 같은 부분이 아닐까? 그러나 스스로를 찍은 사진에서 간간이 느껴지는 차갑거나 무뚝뚝한 그녀의 모습은 이 파트 마지막에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최고의 해'에서 만나는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하다. 제목 때문인지 그녀의 사진들이 많이 보인데 낯익은 사진은 과거 그녀의 사진집에서 봤던 작품들인 듯하다. 반영 자화상은 사진을 찍기 시작한 초반에 꼭 찍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사진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책에서 소개하는 스타일의 사진은 나도 사진 취미 초반에 종종 찍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를 향하여'는 의외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비안에게는 강렬하게 남은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을 만나게 된다. 디즈니랜드의 개장이라니... 내 어린 시절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장하고도 첫 방문까지는 몇 년 걸린 것 같은데(물론 그때 나는 어렸기 때문에 )... 사진으로 남은 행복한 모녀의 씁쓸한 이야기는 안타까울 뿐이다. '시카고와 겐스버그 가족'에 나오는 p.199의 자화상 2.0 사진들은 간혹 찍게 되는 내 셀카를 떠올리게 한다. 겐스버그 가족이 그녀에게 준 평온함과 그에 따른 비비안 태도의 변화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이 장에 거의 마지막에 실린 '플로리다의 밤'은 묘한 매력이 있어 눈이 갔는데 책에서도 호평을 한다. 너무 또렷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이라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세계를 여행하다'를 보며 비비안 마이어가 꽤 좋은 경험의 시간을 만났을 것이라 예상했고, 책에서 만나는 초점이 나간 그녀의 사진에서도 묘하게 그 기분이 드러난다. 하지만 처음 시작의 인용 멘트처럼 그녀는 살기 위해 일하게 된다.
'1960년대'의 행복은 아이들이 자라며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을 맞게 된 것 같다. 안정된 가족 사이에서의 이탈은 비비안의 내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왔던 게 아닐까?
'다시 시작하다'에서 새로운 뮤즈를 얻은 듯했으나 그녀의 아바타로 만들어 갔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비비안이 가진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증언을 통해 짐작하게 한다. 저장 장애에 대해서는 종종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는 '저장 장애'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떠오르게도 한다.
'어린 시절 : 여파' 앞 부분의 일화를 읽다 보면 비비안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 정리가 된 것을 보더라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커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저장 장애와 분열성 장애의 증상을 보면 비비안에 대해 앞에서 전해 들은 모습이 떠오른다.
'여러 매체를 실험하다'이제 그나마 나와 비슷한 35mm 카메라 컬러 필름에 집중하는 비비안을 만난다. 뭐 내게 있어 필름 사진은 그리 오래 찍은 게 아니나 현재 DSLR도 풀 프레임 사이즈니 가장 비슷한 화각이 아닐까 싶다. 뒷부분의 자화상 사진들을 보며 내게 있는 마이어의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집을 꺼내봐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가족 :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비비안의 가족들의 씁쓸한 마지막이 정리되어 있다. 조금의 교류가 있었더라면 비비안의 삶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말년' 1999년에 그녀가 카메라를 영원히 손에서 놓고 만다는 내용은 안타깝다. 조금 더 일찍 조명을 받았더라면 그녀의 그 이후의 작품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그래도 그녀의 마지막을 그녀가 사랑했던 겐스버그 형제들이 함께했다는 것이 위안을 될 수 있었을까 싶다.
'발견'에서는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다룬다. 그녀에 대한 간략한 평가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뒤에 부록으로 비비안 마이어의 유명세와 사후 유산에 관련된 논쟁 등이 부록으로 담겨 있다.
처음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접했을 때와 다르게 그녀의 생애를 활자로 읽게 됐다. 어둠이 있을 것은 예상했으나 참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대단하게 여겨진다. 비비안 마이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라면 그녀의 생애도 접하며 작품을 대하면 또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읽는 전기 오랜만에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집을 꺼내봐야 할 시간이라 생각하며 리뷰를 줄인다.
*이 리뷰는 책을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