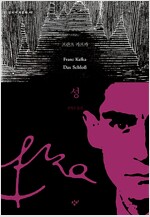"선생, 네덜란드는 한갓 꿈이에요. 황금과 연기로 된 꿈이에요. 낮에는 연기같이 더욱 칙칙하고 밤이면 더욱 금빛으로 빛나지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그 꿈속에선 로엔그린이 살고 있지요. 마치 핸들이 높직한 검은 자전거를 타고 꿈꾸듯이 가는 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불길한 흑조떼처럼 바다 주위로, 운하들을 따라, 온 나라를 쉼 없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 그들은 더이상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킬로나 떨어진 자바로, 그 머나먼 섬으로 떠나고 없는 겁니다. " (p23)
몇 달 전, 알베르 카뮈의 여정을 담은 「나눔의 세계」를 읽을 때 카뮈의 「전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54년 10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잠시 체류했던 카뮈는 암스테르담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전락」의 무대에 관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 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책 속에서 인용된 문장들을 읽는 동안 이상할 만큼 쓸쓸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강렬한 태양빛으로 가득하던, 그동안 읽었던 카뮈의 작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도처에 싸늘한 물이 흐르고 있는, '물과 안개의 수도' 암스테르담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을 읽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변호사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관 겸 참회자지요. " (p18)
알베르 카뮈의 「전락」은 온통 말로 가득한 감옥이다. 주인공 클라망스의 집요한 독백은 뛰어가듯 단숨에 읽히지만 달리고 난 후의 개운함 같은 건 느낄 수 없다. 전력질주하여 도착한 곳은 클라망스가 용의주도하게 놓은 덫 한가운데이기 때문이다. 마치 중세시대 사람들이 '말콩포르'라 부르던 땅 속의 독방처럼 눕지도 서지도 못 한 채 자신이 유죄라는 걸 깨닫게 된다. 겸손한 이든, 오만한 이든 우리는 모두 유죄라는 걸 말이다.
가도 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물컹물컹한 지옥과도 같은 곳, 아니 지옥으로 들어서기 직전의 대기실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다. 타인을 심판하려 할수록 자신의 더 큰 잘못을 발견하게 되는 그곳은 고상한 방법으로 남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지식인들이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것이다. 다른 이들을 심판하려면 먼저 자신을 고발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등 뒤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웃음소리를 듣게 되는 곳이며, 자신이 방관한 익사자의 마지막 비명이 숨통을 죄어오는 곳이다.
"왜 우리가 언제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정당하고 관대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가만 놔둡니다. (...) 그들이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의무이겠는데, 우리의 기억력은 짧아요. 정말이지,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이제 금방 죽은 친구, 그래서 고통이 아직 생생한 그 주검, 즉 우리 자신의 감동, 요컨대 우리들 자신이라구요! " (p41)
겸손과 겸양, 덕망을 갖춘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나면 실은 그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익사하는 사람의 비명소리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된다.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타인을 심판하려 들고, 관계가 멀수록 그에게 더 관대해진다. 하지만 이런 것도 그나마 좀 숨 쉬고 살 수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지금의 우리들은 저마다 비명을 지르고, 동시에 그 비명을 못 들은 체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아니, 들을만한 여력이 없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익사하는 사람의 비명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다리 위에 있어야 하지만 고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할 귀가 닫혀 있고, 같이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심판하고 혐오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작 참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만족감에 취해 있고, 양심을 돌아보려는 사람들은 비교적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혹시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된 암스테르담의 운하들이 지옥의 둥근 테두리들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착안해보셨는지요? " (p24)
"인간이 맛보는 최대의 고통은 율법도 없는 가운데 심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는 바로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 (p120)
카뮈가 묘사한 그때의 그곳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역시 암스테르담의 '멕시코 시티'인 것 같다. 홀로 말하는, 독백하는 인간 클라망스처럼 우린 모두가 서로의 거울이며 초상화다. 바다와 운하와 안개로 둘러싸인, 사방이 온통 물컹물컹한 지옥을 향해 흘러든 사람들로 가득하다. 권력자들에게 멸시당하고 강제당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들은 이젠 이곳에서 당연한 듯 서로를 멸시한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는 저마다 피해자이며 가해자이고 동시에 방관자이며 재판관이다.
"나는 끝이요 시작입니다. 내가 율법을 선포합니다. 요컨대 나는 재판관 겸 참회자다 이겁니다. " (p121)
혐오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는 사회, 그들 중 한 사람이 지금의 내 모습인 듯싶다. 저마다의 피난처로 숨어들어 오직 입만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말과 글의 홍수를 만들며 그 안에서 속절없이 떠밀려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모두 공범자이자 조난자인 것 같다. 도처에 흐르고 있는 분노와 혐오의 강물에서 서로를 구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내 이 요상한 입심에 도취해버린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믿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도록 행복하다 이겁니다! 오오! 태양이여, 바다여, 그리고 무역풍에 씻기는 섬들이여, 생각만 해도 가슴 질리는 청춘이여! 다시 좀 눕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때로는 혼란에 빠지는 때가 있고 (...) " (p145)
행복하다는 말이 울음처럼 느껴지는 건 나의 착각인 걸까? 마치 클라망스의 쉼 없는 독백이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알베르 카뮈의 「전락」은 무거운 안개 속, 겹겹이 조여드는 운하의 한가운데에 갇힌 듯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한 줄기 빛이 흘러드는 것 같다. 카뮈의 글답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면 그건 지옥의 마지막 테두리에서 들려오는 경각의 외침이 아니었을까?
무더위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한없이 추락하듯 읽었지만 한편으론 적절했던 독서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의 경이로움은 그동안 읽었던 글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카뮈의 작품 중엔 가장 난해하다는 평을 듣는다는 「전락」을 읽는 동안 문득 카프카의 「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도 가도 도착할 수 없었던 성으로의 여행, 미로를 헤매는 기분, 그때의 무력감이 말이다. 더 이상 카프카는 읽지 않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다른 관점에서의 '성'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카프카의 글이 그렇듯, 카뮈의 '전락'이 그랬듯, 출구가 없는 곳에서 낙오될 것이 아니라 명철한 의식으로 직시하며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 체념하지 않는 것, 카뮈가 말하는 '반항'이란 그런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