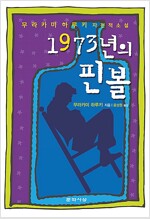˝나는 낯선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병적일 만큼 좋아했다. (...) 그들은 마치 말라버린 우물에 돌멩이라도 던져 넣듯이 나에게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한결같이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두 번째 소설인 「1973년의 핀볼」의 첫 문장인데 마치 나의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도 하루키의 글을 읽으면 그와 나는 기질적으로 닮았다는 기분이 든다. 담고 있는 내용은 달라도 색인 구역이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루키의 소설은 「1Q84」를 시작으로 꽤 많이 읽어왔는데 특히 일본의 군조 신인상을 수상한 그의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몇 년 전 처음 읽은 뒤로 지금까지 세 번을 읽었다. 소설로는 불충분하다는 평가들도 있지만 나는 어쩐지 하루키의 불완전한 첫 소설이 좋았다. 스토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내 성향 탓도 있겠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매력을 느꼈다. 따지고 보면 넘치는 것보단 다소 부족한 걸 나는 더 선호하는지도 모른다.
「1973년의 핀볼」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좀 더 구체화시켜 진행시킨다. '핀볼'이 그렇고 '나'와 '쥐'도 그렇다. 그리고 「상실의 시대」에 등장하는 '나오코'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초기의 두 소설 모두 부엌 테이블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20대에 재즈 카페를 운영했던 하루키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중에 부엌 테이블에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특히 「1973년의 핀볼」은 쓸 때 힘들었다는 기억이 없었다는데 쓰고 싶어 견딜 수 없었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때와는 달리 술술 써나갔다고 한다. 그의 첫 소설과 마찬가지로 아직 습작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기면서도 하루키는 「1973년의 핀볼」에 적잖은 애착을 갖고 있단다. 소설 자체의 힘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읽은 후 나의 감상 역시 같았다.
˝여기에는 테제(결과적인 테제)가 풀이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테제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테제가 희박해짐에 따라, 자발적인 스토리가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소설이 자립하여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 -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1973년의 핀볼」에 나름의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어서 나중에 전집을 묶었을 때 그의 단편들은 다소나마 손질을 가했지만 이 두 작품에 한해서는 전혀 손질을 하지 않았단다. ˝이것이 당시의 나였고, 결국은 시간이 흘러도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말이다. 흔히 사람들은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지만 나는 자신만의 특별한 색을 갖춘 사람들이 더 좋다. 사람이란 이미 충분히 다양하기에 한 사람 스스로 지극히 다양해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경우보단 자신의 색 안에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걸 더 선호하는데 이런 삶에는 나름의 철학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루키의 소설을 되짚어 나가며 느끼는 감상은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구체화시키고 있음에도 하루키가 말하고 싶은 것,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무얼 말하고 싶은 지는 사실 인생의 초반부에 대부분 정해진다. 이후로의 경험은 그 폭을 넓혀 줄 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루키뿐만 아니라 모두의 슬픔이자 피할 수 없는 근원이다. 멀리 간 듯싶다가도 어느새 다시 출발점인 것 같은 게 인생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처음의 그것과는 다른 지점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우물을 발견하고 구석구석 탐색하다 보면 빠져나오는 길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에 들어서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빛줄기를 찾을 수 있는 내면을 키우게 된다. 살아가면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우물에 다시 빠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렬함을 만나지 못 했다면 적어도 한 발, 한 발 내딛게 해주는 자신만의 빛줄기를 찾아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하루키는 그것을 해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평범을 넘어선 게 아닐까 싶다. 나는 그의 소설을 읽으며 이야기를 쓰고 또 쓰는 하루키를 만났고, 그에 적잖은 위로를 받았다. 나만 끊임없이 우물에 빠지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말이다. 그의 에세이 「슬픈 외국어」에서 하루키는 이런 고백을 한다.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배운 것은 필사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육체노동으로 보낸 20대의 나날이었다고. 그에게 있어서 노동은 가장 좋은 교사였고, '진짜 대학' 이었다고 말이다. 그는 재즈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의 가게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단다.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소수파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 명의 손님 가운데 한두 사람만이 가게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 한두 명이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가게에 와야겠다고 생각해 준다면, 가게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나가게 마련이다. 열 명 중에 여덟이나 아홉 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열 명 중 한두 사람만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그런 것을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부로 절실히 느꼈다. 정말이지 뼈를 깎듯이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내가 쓴 글을 형편없고 시시하다고 깎아내려도, 열 명 중 한두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자 했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굳게, 일종의 생활 감각으로서 믿을 수가 있다. 나에게 그런 경험은 다시없는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소설가로서 살아가기가 훨씬 힘들었을 테고, 이런저런 면에서 내 본래의 페이스가 깨졌을지도 모른다. ˝ 「슬픈 외국어」
실제로 그는 매일 뛰거나 수영을 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이어가는 듯하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키가 말하는 열 명 중 한두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가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상이나 심오한 철학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을 나는 존경한다. 자신의 색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용기를 좋아한다. 지금도 또 다른 열 명 중 한두 명은 하루키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자신의 농도에 맞는 부분과 공명하며 필요한 위로를 얻고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