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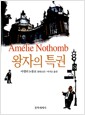
-
왕자의 특권
아멜리 노통브 지음, 허지은 옮김 / 문학세계사 / 2009년 9월
평점 :



평소 소설에 그다지 열광하지 않는 나에게
아멜리 노통브의 <살인자의 건강법> 이란 소설은 신선한 자극이었다.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던 동생이 책꽂이에 꽂아놓은 <살인자의 건강법>을, 언제 한 번 읽어야지 생각만 하던 그 책을,
일단 한 번 펼치고 나니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 그런 기대감으로 그 작가의 책을 골라 읽었는데,
사실 처음의 그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런데 이 책의 겉표지에 보니 이런 말이 있다.
"11월이면 으레 보졸레 누보를 맛볼 수 있듯이
8월 말부터 독자들은 가슴 설레며 노통브의 신작을 기다린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매년 새로운 작품을 출간한다는 것이 꽤나 벅찬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는 얼굴도 예쁘고 글도 잘 쓰고, 부럽기 그지없다.
사실 이 책은 시작부터 흥미진진했다.
보통은 머릿말이나 작가의 말 같은 것으로 책의 서두가 장식되어있는데,
바로 소설이 시작되어서 마음의 준비없이 소설에 빠져들었다.
"만약에 누가 선생님 집에 찾아왔다가 느닷없이 죽으면,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택시를 불러 타고, 친구가 몸이 불편하니 병원으로 가자고 하세요. 사망은 응급실에서 확인될 테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 사람이 병원으로 오는 길에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확실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은 조용히 마무리 되는 거지요." (7p)
누군가와의 대화로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주인공은 당연히 경찰을 부르거나 의사를 불렀을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소설의 소재가 되고, 소설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쉬운 느낌도 들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처음의 의문점과 소설의 진행속도 때문에
마지막 장을 넘기기 아쉬워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한 번 쯤 꿈꿔보았을,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 그게 좋을 지 나쁠 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하며 커피나 한 잔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