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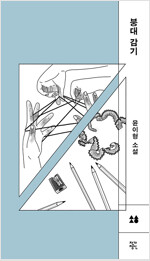
최근 "타인의 해석"으로 번역 발간된 말콤 글래드웰의 최신작 Talking to strangers와 윤이형의 소설 '붕대 감기.' '타인에게 말걸기'라는 기존 소설이 떠오르던 글래드웰 신작 번역 제목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던 차에 윤이형 소설 '붕대 감기'를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읽었다.
'붕대 감기'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하고 친해질 듯 친해지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종횡무진 계속된다. 이십대인지, 삼십대/사십대/오십대인지, 고졸인지, 대졸인지, 학벌은 어떤지,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전업맘인지 직장맘인지. 여성들은 이렇게 편을 갈라 서로 어우러지지 못한다. 여자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란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여자들은 자매애는 커녕 서로에게 무관심함을 넘어서 거의 적대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가. 자매애라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붕대 감기'라는 소설은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을 꿈꾸어야 하는가.
작년에 타인의 해석을 읽을 때도 들었던 생각이라 '붕대 감기'를 읽으면서 내내 '타인의 해석'을 떠올렸다. 낯선 이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성별, 나이, 인종, 학력, 학벌, 직업 등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공통점이 아무 것도 없는, 아니 없어 보이는 타인과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소통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다양한 사례들로 가득찬 '타인의 해석'. 성별, 인종, 사회적 명성 등등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와 편견으로 판단하는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읽는 내내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책이 바로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이었다. 무수한 사연들로 만들어지는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인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되고 구획되어 취급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타인의 그 기나긴 사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하는 것인가.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정말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볼 수 있기는 한 것인가.
흔히들 언어는 소통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 오히려 언어가 같아서 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언어는 소통의 수단일 뿐이고 언어 이외에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외국어에 서투른 우리가 외국인들과의 소통이 되었던 경험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 말을 잘 못해도 이해시킬 수 있구나. 한국인이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데도 같은 공간에 있을 뿐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다 집으로 돌아오는 소통 불능의 경험이 쌓였던 와중에 서투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소통을 경험해 보면 정말로 언어가 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얄팍한 이해만이 가능한 것 아닌가. 언어가 같든 다르든 결국 타인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해석은 결국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넘나드는 요즘이다. 소통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전혀 연관성없어 보이는 책 두 권으로 오만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친구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정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인가. 아니 근처에 있으니 공을 들여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고독과 사이 좋게 우정을 쌓아가야 하는 것인가. 늘 회의로 가득 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