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아무튼 시리즈 새 책 출간 소식을 접하면 미리보기를 한다.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분량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다. 우선. 이 책은 무려 '까뮈의 흰 양말'로 두번째 챕터를 시작한다. 세상에 까뮈의 흰 양말이라니. 가난했던 까뮈가 자존심을 위해 늘 새하얗게 세탁된 흰 양말을 신었다는 이야기가 그 골자인데(최수철의 '까뮈'를 읽고보니 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하지 못했던 어머니와 빈민촌에서 자랐던, 그리고 거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가난과 함께 했던 까뮈에게 '흰 양말'이란 너무도 처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아무튼, 양말'이 아니라 '까뮈의 흰 양말'로 각인되었다. 그래서 까뮈의 흰 양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책을 구해 읽게 되었다. (저자의 192,000원이었던 인세수익을 올려드리기 위해 구매해서 읽어야 하는데 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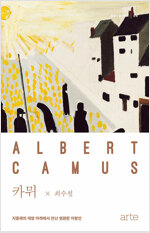
무언가를 애호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름답기에 이 시리즈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양말과 얽힌 저자의 에피소드를 읽노라면 정말 말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면서 함께 키득거리지 않을 수 없다. 덕분에 나도 구글에서 'trudeau socks'를 검색해 보았다. 멋내기 포인트는 단연 양말이기에. 구글링 결과는 당연 멋졌고.
500원짜리 캐릭터양말부터 20만원짜리 구찌양말까지. 뭔가를 극도로 좋아한다는 것은 지리멸렬한 우리의 일상에 탄산같은 것이기에 왠지 나도 이참에 땡땡이 양말을 한 번 사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소유욕이라고는 별로 없는 나도 베이비핑크에 아주 작은 꽃무늬가 있는 양말을 난생 처음 구매해서 신을 때마다 기뻤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삼단으로 곱게 접어 모셔놓고 아껴 신고 있다.) 이 책을 읽노라니 다시 한 번 그 경험에 도전해 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쁜 속옷 입고 혼자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양말은 살짝살짝 보이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착용감이 은근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의류나 가방보다는 속옷, 잠옷, 침구, 양말 등에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저자의 양말홀릭이 마음에 든다.
저자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철양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철과일도 제철음식도 아닌 제철양말이라니. 정말 귀엽다.여름에 시스루 양말까지는 못 해도 가을에 밤색 면 양말, 겨울에 포근한 앙고라 양말은 대찬성이다.
+

최근에 이 책이 나왔다. 역시 미리보기는 다 했다. 처음에는 '반려병'이 '반려동물에 대한 심각한 애정'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병을 반려삼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거 또 다른 나를 보는 느낌이라 얼른 읽고 싶다. '아무튼, 골골' 보다는 더 나은 작명인 것 같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