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튼 시리즈를 좋아해서 무작정 읽었다. 새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싶었다. 저자가 새 전문가인가 싶었고. 하지만 워낙 딱따구리를 좋아해서 계속 읽어나갔는데 이 책은 딱따구리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딱따구리는 그저 거들 뿐.
딱따구리의 그 특유의 소리를 좋아한다. 타향살이 속에서도 즐거움은 있는데 그 즐거움 중 하나가 집앞 공원을 산책하며 딱따구리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것이나 쪼아대는 덕분에 우리집 물받이 연통을 부서져라 쪼아대던 재밌는 모습도 보았다. 이 책에 보니 딱따구리는 소리가 잘 울린다 싶으면 뭐든지 쪼아댄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통 쪼는 소리는 정말 시끄러웠다.
워낙 해외를 많이 오가고 특히나 영국에 많이 체류하므로 영국 이야기가 많은데 영국 이야기 중 '정크 푸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다. 여기서의 정크 푸드는 인스턴트 음식을 가리키는 원래 의미가 아니라 유통 기한 직전의 식재료를 가리키며 이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공급자는 음식물 처리 비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겠다. 읽고 보니 내가 보았던 푸드 레스큐와 닮았다. 말 그대로 버려질 음식들을 구제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십여년간 자원봉사로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한 할아버지는 푸드 레스큐 활동도 했었다. 미국인들에게 차는 발과 같은 것이고 노인이어도 운전은 다 하니까 시간만 맞으면 점심시간이 끝나면 버려지는 구글과 같은 회사의 구내 식당 점심 재고를 극빈층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 할아버지는 그 활동을 통해 구글 구내 식당의 음식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취지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여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할아버지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의 할아버지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를 줄이는 것이 저자의 삶의 목적인 것 같았고 그것은 영장류 학자인 그의 배우자 김산하도 마찬가지였고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인 시동생 김한민도 마찬가지였던 듯 하다.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 같고.

이것이 바로 박규리 구리구리 딱따구리 씨의 시동생 김한민 씨가 쓴 '아무튼, 비건'이다. 최근 들어 문학계에서도 비건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한데 읽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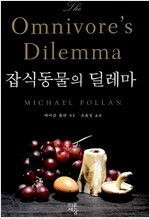
불현듯 떠오른 책은 내가 좋아하는 저자인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우리는 잡식동물이라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닌지. 전세계 식품 산업의 알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 책에서 나는 동물 사육의 문제점을 처음 접했었던 것 같다.
What you eat, who you are.이니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냥 귀여운 딱따구리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쌓아볼까 하면서 읽었던 책이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