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간의 대지 ㅣ 펭귄클래식 9
생 텍쥐페리 지음, 윌리엄 리스 해설, 허희정 옮김 / 펭귄클래식코리아 / 2009년 6월
평점 :

절판

인간의 대지-생텍쥐페리
우리는 모두 대지의 자식이다. 대지의 자식이자 흙의 자식인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의 결집체인 대지로 흘러들어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대지에 묶여 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지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 발버둥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지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하늘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몸짓이, 하늘을 넘어 우주를 꿈꾸고 우주로 향하는 행동이, 단지 대지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행동들은, 그 몸부림들은, 그 몸짓들은, 대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룰 수 없는 지평으로의 발돋움은 우리 삶의 시선을 확장시키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지속적으로 대지를 벗어나려는, 불가능하지만 유의미한 행동을 이어나간다. 인간의 역사에는 그런 행동들이 무수히 아로새겨져 있다.
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세상의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이는 대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p.9)
그러나 때때로 대지에서 태어났지만, 대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분명히 대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대지의 자식에 어울리기 보다는 대지를 벗어난 곳들에 어울리는 존재들이다. 존재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 듯, 그들은 끊임없이 대지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에 어울리는 곳으로 나아간다. 생텍쥐페리. 그도 대지에서 태어났지만 대지의 자식에 어울리기 보다는 다른 곳에 어울리는 존재였다. 그는 하늘을 꿈꾸며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다녔고, 지속적으로 하늘을 묘사하고, 하늘에 관련된 삶에 대해서 글을 써나가면서 자신이 하늘에 어울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늘의 자식 생텍쥐페리.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늘의 자식 생텍쥐페리는 하늘을 날면서 하늘뿐만 아니라 대지도 끊임없이 바라봤다. 하늘의 자식으로 하늘을 날 수밖에 없지만, 대지의 삶이라는 중력에 이끌리는 역동적이고 모순적인 그의 삶. <인간의 대지>는 생텍쥐페리의 그 모순적인 삶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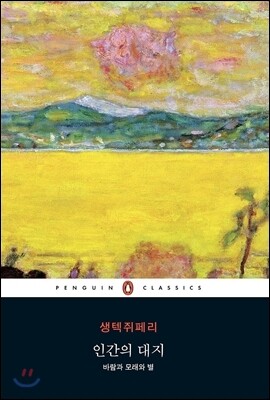
생텍쥐페리는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자신의 숙명을 따라서 비행사가 되어 하늘을 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끊임없이 대지를 바라본다. 그의 눈 아래에 펼쳐진 대지. 아름답고, 순수하고, 장엄하고, 놀랍고, 위험하고, 신비하고, 이상하고, 숭고한 대지. 벗어나고 싶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을 묶어두면서도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용인하는 넓고 넓은 대지. 그에게 그 대지는 그저 그런 대지였지만 또한 인간의 대지였다. 그 자신이 살아가는 대지이자 그 자신이 바라보는 대지이자 그 자신을 얽어매는 대지이자 벗어나고 싶은 대지이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대지. 인간의 대지는 그에게 감옥이자 낙원이었고, 유배지이자 은신처였다. 저주이자 축복인 대지에서의 삶을 극복하고자 선택한 하늘에서의 삶도, 대지에서의 삶의 모순적인 역동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생텍쥐페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날고, 날고, 날고, 또 날았다. 그리고 그 삶을 쓰고, 쓰고, 쓰고, 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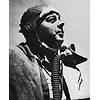
대지에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대지를 바라보는 비행사의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겪고 느낀 것들에 대한 기록이자 그런 삶의 총체적 발자취로서의 글인 <인간의 대지>는 서정적인 철학의 대지이자 성찰적인 아름다움의 하늘이 펼쳐진 책이었다. 비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생과 사를 경계를 넘나들고,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료들과 살면서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것이 삶이 된 남자의 삶은 당연하게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의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서정적인 글이 되어 표현된다. 그것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자 현재라는 고정된 시간을 벗어나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건 아름답지만 깨달음을 주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의 충격이었다.
가장 위대한 것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으며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도 포용되는 것, 그것이 신적인 것이다.(p.7)
나도 대지를 벗어나고 싶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지로 상징되는 삶의 중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삶은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삶의 관성에 찌들어갈수록 삶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닫힌 순환. 여기서 맴돌다 참을 수 없을 때 <인간의 대지>를 펼쳐든다. 책 구절구절, 구석구석 마다 삶의 닫힌 순환을 깨부수는 힘이 스며 있어 그것이 마음으로 파고들어 삶의 활력이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대지>가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다.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벗어남과 더불어 되돌아감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 이 삶의 지혜를 절절히 전해주는 <인간의 대지>를 읽다보면 삶의 중력이란 삶에서 벗어나는 것과 돌아오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덮으면 내가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무섭지만 친근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새 책은 마지막 페이지를 향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나는 ‘인간의 대지’를 떠나 ‘나의 대지’로 돌아간다. 그런데 문득 또다른 깨달음이 떠오른다. <인간의 대지>를 읽는 것이 나만의 비행이라는 깨달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