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학한 무지 ㅣ 지만지 고전선집 673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지음, 조규홍 옮김 / 지식을만드는지식 / 2011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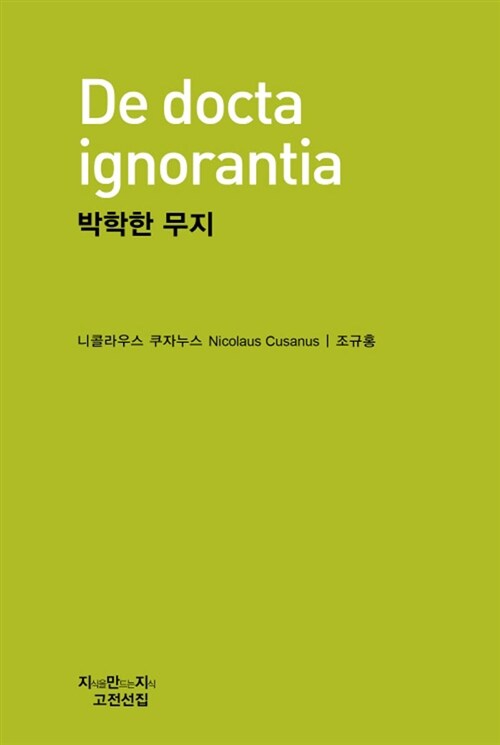
8047.박학한 무지-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우리의 무지가 분명해질수록 그만큼 '진리'에 보다 더 가까워진다(11)
<박학학 무지> 같은 책들을 읽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가?'. <순수이성비판1>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읽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읽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독려하며. 독려를 계속 하다보면 깨닫게 됩니다. 독려가 고문이라는 사실을. 무지를 감추고, 이해못한다는 고통을 겪다보면 따라오는 '독서의 무의미성'을 무마시키는 고문. 때로는 무지가 생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가 생의 무의미성을 불러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독려는 무시하고 독서를 강행시킵니다. 독려의 의도에 따르면, 계속 읽다보면 적응도 되고, 독서의 굳은 살이 박힌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저한테는 그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읽어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잘 안 읽히네요. 다행인 건, 읽어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계속되니 이 '무지의 상태'에는 익숙해진 거 같습니다. '무지의 상태'에 익숙해지니, 몰라도 읽고, 안 읽혀도 읽습니다. 읽다보면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책 한 권은 일단 다 읽게 되니까요. 그걸 얼마나 이해하는지와는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박학한 무지>가 <순수이성비판1>처럼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해설이 아닌, 본문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무지의 세계'로 저를 인도한 <순수이성비판1>은, 지속적으로 '무지의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책을 덮을때 쯤에는 저를 순수한 '멘탈붕괴'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분명히 다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신이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그 세계로. <박학한 무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학한 무지>가 어려운 건, 지금은 쓰지 않는 순수한 논리적 증명이 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됨에서 비롯하는 하나 됨의 낳음은 하나 됨의 유일한 반복으로서 단 한 번(태어난) 하나 됨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두 번 혹은 세 번 혹은 그 이상 여러 번 하나 됨을 반복한 것이라면, 이미 그 하나 됨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낳은 것이 될 것이다. 그로써 두 배 혹은 세 배 혹은 그 이상의 배수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 반복된 하나 됨은 '하나 됨이 하나 됨을 낳는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하나 됨의 동등성을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낳음은 분명 영원하다.'(58) 라거나 '그렇지만 먼저 있음이 영원성 안에서 [마치] 나중 있음과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파악될 만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와 다른 식으로는 먼저 있음과 나중 있음이 무한한 것 및 영원한 것 안에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성부(아버지)는 성자(아들)보다 앞서거나 성자보다 뒤에 계시지 않고, 다만 성자가 뒤에 있지 않는 차원에서 성부가 앞서 계신다. 그렇게 성부는 첫 번째 위격으로 말하되, 성자가 그로 인해 그(성부) 뒤에 있는 것이 아님을 내포한다. 하지만 마치 성부가 먼저 있음과 무관하게 첫 번째 위력인 것처럼, 그렇듯 성자 역시 나중 있음과 무관하게 두 번째 위격이요, 성령 역시 같은 형식으로 세 번째 위격인 셈이다. 이 설명은 위에서 말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80~81)라는 말이나 글을 지금 누가 쓰겠습니까? 중세 철학의 영향이 배여 있는 15세기 유럽에서야 신과 신학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 당대 성직자나 지식인들 사이에서야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미 신과 신학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과거의 했었던 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박학한 무지>에는, 그 사실이, 신과 신학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는 듯이, 생명력을 가진 채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듯이. 그래서 고전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과 너무 다른, 과거의 삶과 지식과 생각과 사고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삶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고전에 살아 숨쉬는 과거의 삶과 지식과 생각과 사고가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우니까요.
<박학한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신학에 대한 논리 증명으로 가득한 이 책은 읽기도 어렵고, 문장도 딱딱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 벽을 넘을수만 있다면 새로은 그 무언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무언가 모순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이 책의 벽을 넘을 수 있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제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라서 명확한 무언가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간 그 세계를 들여다본 인물로서 제가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네요. 제목부터 드러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론적 한계와 그러한 한계가 가진 유한한 인식 때문에, 절대적 존재인 신에 대해서 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이고 완벽한 존재인 신에 대해서 다 안다고 떠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고백할 수록, 그는 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걸 '무지의 지' 아니면 '박학만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는 척 하지 않고, 모르면 모를수록 알아가는 역설. 신에 대한 앎은 이런 역설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해 아는 건, 신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과는 다릅니다. 신에 대해 아는 건, 내가 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그나마 아는 것에 속하고, 안다고 시작하면 무지한 것입니다. 알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게 아는 것인 신에 대한 앎의 세계. 쿠자누스의 말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쿠자누스를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박학한 무지>를 읽다보니 점점 머리가 아파지고 뇌 속이 무지해지는데, 이런 '무지의 고백'이야말로 '아는 것'일까요? 그것이 <박학한 무지>에 대한 앎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무지를 통해 '앎'의 시작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고 나니 무언가 기분이 찝찝해지는 건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