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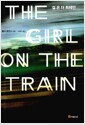
-
걸 온 더 트레인
폴라 호킨스 지음, 이영아 옮김 / 북폴리오 / 2015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소설이나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스릴러 소설 한편 읽는 것도 좋아요. 이런 소설들의 묘미는 '대체 범인은 누구인가'란 기본 명제로 끝까지 읽게 되는 힘이 있죠. 주인공 '레이첼'은 실직한 상태로 하릴없이 매일 아침 런던행 통근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술에 절어 기억을 잃기도 하고, 그로 인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파탄 났으며 지금은 친구 캐시 집에 얹혀살고 있는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레이첼의 삶을 좀 먹고 있는 무언가는 서서히 레이첼을 잠식하고, 그나마 하루의 유일한 낙은 기차 안에서 철로변 집들을 관찰하는 일뿐입니다.
제목 《걸 온 더 트레인》에서 알 수 있듯이 기차 안에 있는 레이첼은 철로변의 집들을 보면서 묘한 안도, 쾌감, 관음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 갇혀 멋대로 '제스(메건)'와 '제이슨(스콧)'이라는 이름을 짓고, 직업, 성격, 두 부부의 사생활을 지어내게 됩니다. 매일 아침 부부를 관찰하던 레이첼은 제스(메건)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 말죠. 그 이후 제스(메건)는 실종되고, 범인을 찾기 위한 주변인들의 알리바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마구잡이로 파헤쳐 진 레이첼은 두 사람을 통해 대리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패턴은 '알프레도 히치콕'의 <이창>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매일 밤 건너편의 여자를 훔쳐보던 남자가 어느 순간 그녀와의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걸 온 더 트레인》의 레이첼과 메건, 애나의 교차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혼랍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치, 내가 누구인지, 범인은 누구인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진실을 계속해서 달아나게 되면서 극도의 혼란이 가중되죠. 왠지 모를 <나를 찾아줘>의 결말과 비슷하리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하지만 《걸 온 더 트레인》은 이런 화자와 플롯의 시점을 흐트러트리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도 알 수 없는 경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약물, 알콜, 담배 등으로 삶의 기억들을 지배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장자의 '호접몽'처럼 '내가 꿈속의 나비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내가 된 건지' 헷갈리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작가는 혼란스러운 인간의 관계를 자각하고자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기차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소설 속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쩌면 내 모습 중 하나인 것 만 같아 뒷골이 화끈하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