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 - 나에게서 가장 멀리 뒤돌아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
김태형 지음 / 마음의숲 / 2012년 11월
평점 :



언제부턴가 하루하루에 조바심내고 있다. 그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현듯한, 그러니까 으레 안고 살아가는 '흔한' 불안이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 그러니깐 정말로 삶의 지속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길이 내게 요구하는, 하루하루 무언가 어제보다 달라져야만 하는 강박감은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았던 반복적인 패턴에서 나를 더욱 채근했다. 거기다 최근에는 전개가 빠르거나 혹은 적어도 분량적인 부담이 적거나, 이해 자체가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로 만났었기 때문일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책을 만났을 때는 한장 한장, 문장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가는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느릿느릿 쉬엄쉬엄 읽다 내려놓다를 반복하고 나니, 한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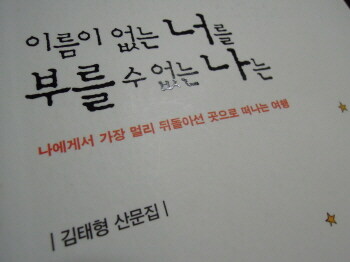
처음에는 책에 대한 순수한 받아들임 보다는, 이런 질문들이 더 강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왜 이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시인이 쓰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나의 언어적 사고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물론 그것들은 기본적인 이유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에 대한핑계를 붙들고 있어야 할지, 조금은 한심스럽고 막연한 심정이지만 어쨌든 그랬다. 반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왜 이 책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못하는지. 왜 너무도 쉽게 길을 잃어 버리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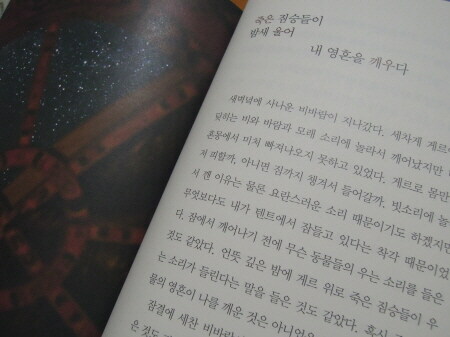
두번을 다녀온 사막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이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은 사막위에서, 그리고 수많은 별 아래에서 시인 김태형이 느낀, 사막에 대한 기록이면서 헌사이고, 자신에 대한 성찰이자,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막을 여행하면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막에 대한 정보, 혹은 사막에 대한 흔한 예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내겐 그것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야기. 한 곳에 잠깐 머물며 그곳에 대하여 풀어놓고, 또 이동하여 다른 곳을 예찬하는, 그것이 많이 느렸다. 김태형의 기록은, 달려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읇조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동하는 곳에서, 긴 시간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막의 모래를 바라보거나, 혹은 서서히 저물어 가는 황혼을, 그리고 영원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였다.

뉘엿뉘엿 펼쳐지는 언어에서 나는 조금은 빠른 이야기의 전개를 원했던가. 아, 나름의 고민끝에 나를 돌아본 바로는 그랬다. 김태형의 이야기는 사막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지 않았다. 때로는 모래 바닥에 바짝 웅크려 바라보고, 때로는 몸을 곧게 펴서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앞으로 나가야하는, 그래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멈춰있는 이야기 같으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느릿한 발걸음은 앞으로 향하는 것보다 더 값진, 안으로 향하는 이야기였다. 얼핏보면, 삶을 움직일만한 대단한 깨우침도, 거창한 예찬도 없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아보는 고백들은 너무나 솔직하고, 또 아름다웠다. 물은, 음료보다 자극이 없지만, 질리지 않고 늘 하루의 일부를 구성하듯, 김태형의 이야기들은 그랬다. 모래폭풍의 스펙터클함을 침튀기며 설명하는 것이 아닌, 고요한 태풍의 안쪽에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이야기와 같았다.
이 별 아래에서 나는 내 한마디 말을 삼키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잊지 않기 위해, 사막의 황량한 아름다움에 미쳐 온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내 가슴속에 남은 한마디 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황량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281)
그것을 느끼자, 시선은 아주 약간 달라졌을 뿐인데도, 그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 사실 그의 움직임은 그렇게 느리지 않았었다!)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가 무슨말을 하는 지, 조금씩 더듬어 볼 수 있었다. 그는 포기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자꾸로 안으로, 안으로 하는 말들이 주는 묵직함을 조금은, 그러니깐 아주 약간은 더듬어볼 수 있게 되자,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그리고 그가 손끝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그리고 그가 언어로 빚어내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인류와 지구와 생명을 묶어내는 초월적인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이유로 책장을 넘기기가 힘들어졌다. 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시처럼 강렬해서, 그만큼 소중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다. 차를 타고 먼저 달려가 바라보길 바랐던 내가, 그의 뒤 꽁무니를 최대한 천천히 따라잡기 위해서 책을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사막의 형태와, 모래,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과 순수. 그로인해 그 어느때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그가 그만큼 오래도록 바라보았던 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마음의 허기와 그리움을 눌러담았을 그의 글을 이뤄놓은 글자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신과 나, 그리고 무엇인가를 마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막이었다. (314)
가치있고, 좋았던, 그동안 접했던 몇권의 여행에세이들이 내게 주는 감정이 '저 곳에 가보고 싶다'는 것이었다면, 김태형의 글이 내게 준 감정은, '저 곳을 느껴보고 싶다.' 였다. 비록 그처럼 풀어내는 것은 어불성설 일지라도 말이다.

사막이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사막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모래와, 동물과, 사람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눌러 담은 그의 이야기. 느릿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의 '느낌'들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수록, 내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깊고 맑은 눈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사막을 두번째로 찾은 이유는, 첫번째 여행에서 보았던, 버려진 신발이 큰 이유였다 한다. 내게 강하게 남은 기억은, 그의 이야기와, 그가 보여준 별들 이었지만, 아마도 내가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다시한번 이 책을 펼칠때는, 남들은 시시하게 생각될 그 무언가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은, 사막으로 들어가기전 눈을 씻어낼 바위샘물과도 같은게 아닐까... 눈을 멀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 같은.
나 역시 그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을까. 나를 찾아서, 다시 한 번 자기가 되기 위해서. (298)
이 책은 내게 우연찮게 찾아왔다. 전혀, 정말로 예기치 못하게. 의아했던 처음의 기분과는 달리, 이제는 그것이 참 고맙다. 사막의 모래 사이, 밤 하늘의 별들 사이, 그리고 사람과 세계, 자신과 자신 사이의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것이 일생이라면, 그 일생이 비로소 아름다움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자신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그림자로 뒤덮인 밤하늘을 맞이할 것이다. 그 아래 나는 밤새 별을 보며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다. (326)

언젠가 이 길을 지나갈 것이라는 오랜 예감마저 이제는 나에게 옛 이름으로 남을 것이지만, 나는 들판을 향해 자꾸만 뒤돌아보고 있었다. 누가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을까. 내 이름은 뒤돌아보는 순간 저 멀리에서 무한이 되고 있었으리라.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