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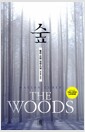
-
숲 ㅣ 모중석 스릴러 클럽 33
할런 코벤 지음, 최필원 옮김 / 비채 / 2012년 10월
평점 :




영국산(産) 우울록의 정점을 찍은 오아시스 曰, 「지난 일은 후회하지 마(don't look back in anger).」 ㅡ 노엘 갤러거가 최악의 작사가에 이름을 올렸건 말건 간에 일단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테지만, 어디 삶이 그러한가. 만약 온 지구인이 후회 없는 삶을 착실히 살아가고 있다한들 또 어딘가의 철학자들이 그럴듯한 구실을 들어 우리로 하여금 시험대에 오르게 했을 것이다. 『숲』은 첫 문장이 아주 가관이다. 「삽을 든 아버지가 보인다.」 그렇지, 작가가 할런 코벤이고 장르가 스릴러라면, 과거의 진실이 될 만한 뭔가를 묻거나 파헤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미 죽였거나. 삽을 든 아버지가 보인다, 라. 그저 어떤 남자 하나가 삽을 들고 서있을 뿐이다. 이 문장 하나로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음습함도 표현해내지 못한다. 그의 아버지는 날이 맑은 어떤 날 정원을 가꾸기 위해 양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는 중일지도 모르며, 혹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갖다드리려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뛰어가는 주인공의 시선을 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야기를 아우르는 단어가 '숲'이라는 것을 말이다. 생각해보라. 숲에서 삽을 쓸 이유가 대체 얼마나 있을지를. ……일단, 시작은 여름 캠프다. 도저히 평범한 인간처럼은 안 보이는 흉측한 살인마나 오로지 금요일에만 활동하는 제이슨이 나타나서, 우리가 공포물을 보는 이유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는 왕가슴 언니들 혹은 친구들 중 가장 까불대는 녀석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워버릴 것만 같은 할리우드의 캠프. 어느 정도 예상했듯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여동생을 포함한 네 명의 아이들이 사라진다. 단, 두 명은 시신으로 발견되지만 나머지 둘은 어디에도 없었다. 20년 후 그들 중 하나가 성인이 되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게다가 『숲』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까지 마련되어있는데 분명히 재미있다고만 느끼기에는 주인공이 받는 협박의 강약이 짜증날 정도로 심각하다. 협박의 당사자는 주인공인 검사의 반대편인 피고의 아버지이다(맙소사, 또다시 '아버지'로의 회귀군). 그는 사건이 종결되어갈 때 주인공에게 말한다. 「난 당신 아이를 노리고 달려든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 과거만 파헤쳤을 뿐입니다. 당신 동서도 흔들어봤지만 당신 아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선만큼은 확실히 지켰단 말입니다.」 어쩐지 이 말에서 묘한 기시감 같은 것이 든다. 리암 니슨의 돌주먹을 볼 수 있는 무지막지한 영화 《테이큰》에서 여자들을 납치해 팔아버리는 파트리스 상 클레어 역시 납치된 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개인감정은 없다고, 그건 다만 사업일 뿐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맞받아쳤다. 「내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야.」 이 소설에서 주인공 검사 폴 코플랜드는 그 피고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응수했을까? 「성인군자이시군요.」
스릴러다. 확실히 그렇다. 주인공 코플랜드 검사의 여동생은 차치하더라도 그녀와 함께 사라졌던 길 페레즈는 실종된 지 20년 만에 나타나자마자 죽어버렸다. 코플랜드는 외모와 숨길 수 없는 흉터로 길 페레즈를 확신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페레즈의 부모는 시체공시소에서 아들의 시신을 보고는 자신들의 자식임을 부정한다. 20년의 시간을 감안한다손 해도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는 이 가족, 뭔가 미심쩍다. 게다가 코플랜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밀, 이와 맞물리며 동시에 진행되는 법정 공방, 20년 전 숲에서의 계획과 거짓말,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는 수감자, 캠프장 주인이었으며 과거 여자 친구 루시의 아버지까지, 다종다양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건들이 즐비하다 ㅡ 물론 발단은 단 하나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지만. 읽다 보면 코플랜드의 아버지의 전력(前歷)에 대한 부분이 좀 핀트가 어긋나 보여 꼬투리를 잡으려면 무리도 아니겠으나 이것마저도 어느 정도(백 퍼센트라고는 못하겠다) 그럴듯하게 반죽되어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도무지 스릴러의 냄새가 나질 않는다는 거다. 조여 오는 느낌이 없었는데도 읽는 속도를 늦출 수 없는 건, 스릴러가 아닌 스릴러라는 건가 아니면 이게 '코벤 스타일' 스릴러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