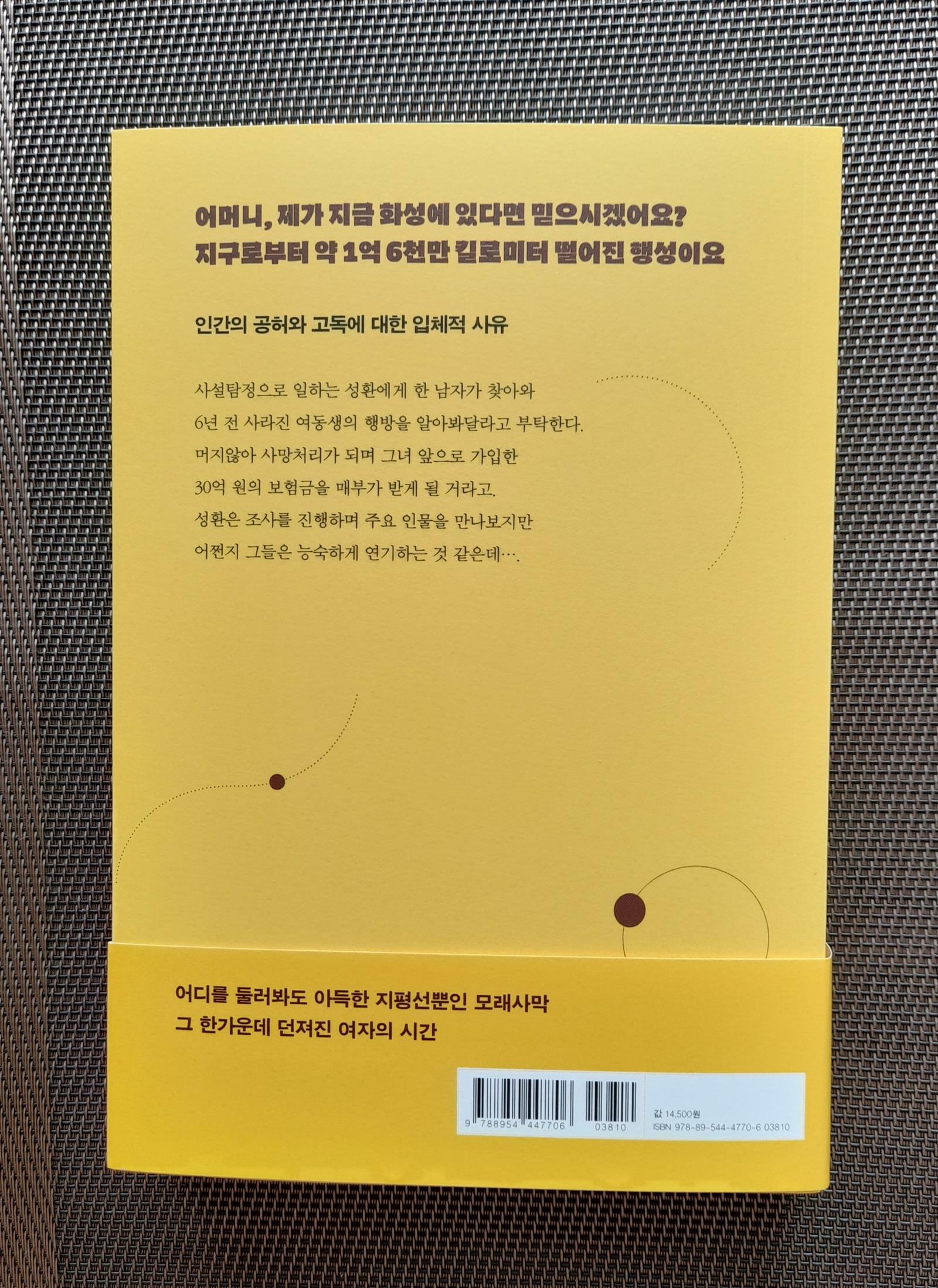이 문장 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이 나오긴 하지만 표지그림에 딱 어울리는 문장은 이 문장이 아닐까 싶었다.
초췌한 얼굴일지언정 오후의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칼을 볼 수 있듯이 그녀의 피폐한 삶에도 한줄기 햇살이 내리쪼일 수 있을까.
사건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 성환은 50대의 수사관으로 짐작되는데 성환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소설은 그래서인지 그나이대의 아저씨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노련하지만 예상되고 느리지만 차근차근 정확히 진행하면서 묵묵하면서도 묵직한 중년남자의 그런 심상함...
그닥 새로운 전개는 아니었지만 한줄한줄 빼놓지 않고 천천히 읽게 되는, 작가가 무척 공들여 쓴 작품임이 느껴지는 소설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자기만의 폐허를 목격하기도 하고 화성에 뚝 떨어진듯 고독에 헤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늘의 별도 보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도 볼수 있는 지구에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되곤 한다. 그 시간들을 헤쳐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