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본능'을 처음 읽었을 때는 언어를 다루면서, 언어학, 영어문법, 뇌과학 최신 성과를 보여주는 참신하고, 엄청나게 풍부한 지적 향연이라고 느꼈었던 거 같다. 그러면, 보통 그 저자의 나머지 책들을 한권씩 뒤적이고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감흥이 조금씩 떨어졌던 거 같다.'빈 서판'에서 좋았던 점은 nature vs. nurture 이런 관점을 풍부하게 넓혀 준 점이었지만, 영역에 따라서는, 참신함 없이, 정리를 위한 정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제일 실망한 책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였다. 폭력성에 대한 두꺼운 책이었는데, 폭력에 대한 인식을 주로 다룬 책이었고, 양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감흥을 정말 주지 못했다.
본인이 잘하는 영역-언어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설득력이나 참신함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 같다.
다만, 어느 글이나 풍부한 문헌과 현란한 수사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단순해서 지루하지는 않고, 원서를 보면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영어표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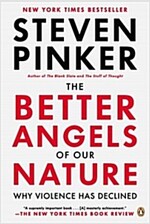
그리고 요새는 'the Stuff of Thought' 를 읽고 있다. 대강 전반부까지 읽었는데, '언어본능'을 읽었을 때의 좋은 느낌이 올라 오고 있다. 핑커는 영어동사를 중심으로 촘스키의 보편 문법같은 것이 실제로 어린이들이 언어를 익힐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는지 혹은 활용되는지를 기술하면서, the stuff of thought 가 어떤 모습일지를 하나씩 하나씩 제시해준다. 한참 유행을 떨었던, 은유 중심의 the stuff of thought 보다 훨씬 생생하고 합리적이며 일반적인 일상 생활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설명이었다.

그의 면모는 달변의 과학자 같은 인상이다. 감정과 공감이 풍부한 인문학자보다는 정교한 이야기를 즐기면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언어 과학자 같다.
의외로, 스티브 핑커의 목소리는 얇았다. Ted 강의를 찾아보면 핑커의 것이 몇개 보이는데, 얼굴 사진과 목소리 매치는 낯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