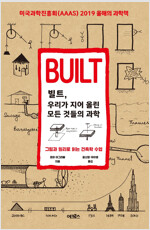34. 빌트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건축학에 대한 아주 얄팍한 동경 같은 것이 고등학생 때 있었다. 건축학과 간다고 하면 뭔가 멋있을 것 같고, 내가 그린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멋있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안다. 수많은 이익이 개입하고 또 조율의 단계를 거쳐 현실 가능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도. 건축학자 한 명의 작품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이 책은 구조공학자인 저자가 건물을 만들 때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각 장의 이름을 보면 층, 힘, 화재, 벽돌, 금속, 바위, 하늘, 땅, 지하, 물, 하수도, 우상, 다리, 꿈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장의 이름에서 이미 이 책의 매력을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건축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치를 알게 되면 새삼 그 소중함과 고마움에 감동을 받을지도 모른다.
요즘 우리 집 앞에 건물 하나가 새로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 지어질 때만 해도 저 시끄러운 놈들, 이라는 생각으로 민원을 넣었다. 최소한 퇴근 시간 이후로는 공사를 멈췄으면 좋겠다고.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게 권고사항이긴 하단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공사 현장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저 철근이 왜 들어가는 건지, 시멘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에 쓰이는 것인지, 저 호스는 왜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등등. 하나의 건물 안에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건축가와 구조공학자의 노력이 담겨 있다. 그 섬세한 배려심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35.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박상영 작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다. 나와 비슷한 또래라는 점에서 호기심이 있기도 했고 몇몇 단편집에서 이름을 봤기에 더 궁금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본 작품이 이 책에 실려 있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인데, 그땐 이보다 더 뛰어나고 커 보이는 작품들이 있었던지라 이 작품이 잘 쓰인 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제 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대상을 받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문창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서 우럭을 먹는 과정을 우주를 맛본다고 쓴 것인지 그것 참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근데 제대로 알고 쓴 건가? 하는 의심도 살짝은 들었던 듯 하다. 어쨌든 그 작품을 계기로 그의 단편집을 구입한 것이 이 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가볍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런 가벼움 속에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력있는 작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라믹이나 조의 방 같은 작품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사유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도무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작가든 화가든 그 어떤 예술가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은 사유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 또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의무’라는 말은 강제성의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작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에 가깝다. 최소한 자신의 책을 산 독자에게만큼은 이 작품이 뭘 말하려는 것인지 오롯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라믹이나 조의 방 같은 작품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사실 세라믹에 대해서는 더 논할 수가 없는 것이, 더 이상 읽고 싶은 의지가 들지 않아 읽다가 관두었다. 재미도 없었고, 그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얻지 못했다. 아니, 13,500원에 인생의 해답을 알려달라면 사기꾼이지.. 그래.. 해답은 아니어도 최소한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야 맞지.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쓴 작품인지 궁금하다.
그의 작품집을 읽으며 느낀 그의 글의 특징은 성관계인데, 그 또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사실 소설에서 그런 장면들은 때로는 꼭 필요하기도 하다. 이를 테면 아니 에르노의 ‘집착’에서 화자가 남자의 성기를 잡으면 안도감을 가진다는 장면은 맥락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떤가. 두 인물의 깊은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 관계 맺는 것 말고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읽을 때까지만 해도 이 책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 그리고 박상영 작가에 대한 믿음도 스믈스믈 생겨날 듯 했다. 그가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래서 누군가 그의 작품세계를 비판했을 때 당당하게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뒤의 작품을 읽으면서 아차, 했다. 지지하지 말 걸.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작품을 쓸 것 같다고 말했는데. 아,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했다.
최근에 나온 대도시의 사랑법은 어떨까. 좀 더 나아진 그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을까. 아직은 읽고 싶지 않다. 차후에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다시 그를 읽어 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