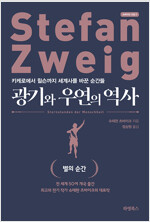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내 등도 내어주고 향기마저 고소한 커피는 호로록 호로록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상상을 한다. 핸드폰 속 대기질 ‘나쁨’ 소식이 현실을 알려주는 지금.
슈테판 츠바이크에 매료되어 다시 그의 책을 두 권 구매하였다. 아직 북타워에서 얌전히 나를 기다리는 책들을 보며 당분간은 ‘장바구니에 넣어만 둬야지.’하고 맘먹었는데 어지럽혀진 마음을 비워내듯이 구매 버튼을 눌러 자발적으로 장바구니를 말끔히 시원하게 비워냈다. 다만 지름신에게 굴복당해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더불어 나를 매료시킨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이 곧 온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지금. 그럼 됐다. 찡긋.
점잖은 말투로 차분하게 들려주는 말들 속에 그의 유머가 취향 저격이다. 2주 전에 읽었던 <감정의 혼란> 속에서 말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교수님을 두고 그의 제자 롤란트가 “병마개 위에 달린 병뚜껑처럼 그는 느닷없이 잽싸게 튕겨 나간 후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혼자 빵 터졌었다.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알겠으나 내가 상상한 느긋하고 고루해 보이는 모습의 교수님이 병뚜껑처럼 뾰~옹!! 하고 냅다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만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길래 진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책 내용 속에서도 혼자 끅끅거리며 웃게 하는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작정하고 의도한 유머가 아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그 매력.(자주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더 매력 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능수능란하게 감정들을 휘젓다가 우아하게 실크를 펼치는 듯한 기술적인 묘사가 주는 섬세함. 그래서 현재 상품 준비 중이라는 주문 현황이 날 너무 설레게 한다. 또 찡긋.
작년 이맘때쯤을 떠올려보니 많은 변화가 있더라.
여러 일을 겪고 난 이후로 점점 더 염세적으로 변하여 책을 읽어도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는 것은 분명 소설은 아니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는 분야의 폭이 조금씩 넓어짐을 느낀다. 그건 나의 심적 변화가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긍정적으로 와 닿았다.
여러모로 뒤숭숭한 3월도 차근히 열심히 잘 살아 내야겠다. 그럼 해준 것은 하나 없어도 저절로 우리를 위해 예쁘게 피워주는 꽃들과 함께 더 화사한 4월을 안정적으로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