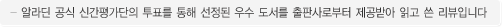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 박범신 논산일기
박범신 지음 / 은행나무 / 2012년 4월
평점 :



에세이라 하면, 작가의 특수한 체험이 개성적인 문체와 어울려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박범신 작가가 논산에서 2011년 겨울을 보내며 쓴 이 글들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쓴 '일기'다. 페이스북에 널리 공개된 일기. 청년작가답게 새로운 매체 안에서 연륜 있는 필력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서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는 것이나 일 주일, 한 달 전의 생각의 흐름을 이어보는 것이 어려웠다면, 종이에 인쇄되어 한 권으로 묶여 나와준 책이 고맙다.
작가 스스로 '취북일기'라고 하며, 반쯤은 취해서 쓴 글들이라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논산 조정리 집에서 지내며 평범하게 쓴 하루의 기록이라기엔 모자라다. 그 취했다는 것이 고작 술 몇 잔에 취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박범신 작가가 논산에 대한, 문학에 대한, 그리고 삶과 세상에 대한 사랑에 취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사랑은 끝나지 않은 셈이다. 아니, 끝날 수 없는 것이다.
작가는 스스로 '왜 논산으로 가는 것일까' 의문을 품고 떠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고 했다. 고향이라는 이유보다는 그리워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이 맞는지 모른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결혼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짐을 싸고 걸핏하면 '떠나겠다'고 대책 없는 유랑의 슬픈 노래를 불렀다.'(28쪽)고 한다. 중국, 아프리카, 히말라야 등, 오지로 떠나는 여행은 수도 없이 많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작가이자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드러나는 순간들마다 그는 짐을 싼다. 버리기 위해 자유를 찾아 짐을 싸고 떠났다가, 이내 다시 채워지면 또 골방에 틀어박혀 자신을 비워내는 일의 반복. 떠나거나 틀어박히거나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인데, 그 어느 순간에도 그는 마음 편히 놓인 적이 없는 것이다. 비워지고 채워지고 하면서 그 간극을 견뎌내는 것이 작가의 삶이라 했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머물 수 있어 글을 쓴다. 삶의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것도 욕망이고, 그 흔적을 물새처럼 아무 것도 없이 다 지우고 싶은 것도 욕망이다."(91쪽)
"그런데 여기, 딜레마가 있다. 창조적인 작업은 내 안의 나를 더 극적으로 분리해서 저희끼리 싸움을 시키는 게 좋은데, 내 안에서 그런 내적 분열이 상시로 일어나면 개인적 일상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 내적 분열은 방부제와 같아 우리 삶을 매순간 생생하게 만들지만, 대신 일상을 가지런히 유지하려면 자기 억제의 고단함을 견디어야 한다는 것이다."(157쪽)
박범신 작가는 39년여의 세월동안 50권 이상을 썼다. 그러니 그 손가락이 글쓰기의 습관과 지향을 가진 것처럼, 그의 삶에도 그러한 반복되는 무늬가 생겼을 것이다. 책에 실린 것은 하루하루 단편적으로 태어난 글이지만, 근 3개월 동안의 글 속에는 반백년 가까운 시간에 깃들었을 외로움과 그리움이 보였다. 유랑에 대한 갈망을 져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무침이 있는 자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을까. 작가는 외로움, 그리움, 사무침을 원동력으로 긴 세월을 지내며 삶의 열정을 녹인 글을 써 왔으리라.
작가는 소설 쓰기에 대하여 '오욕칠정의 진흙밭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소설쓰기는 정글 속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한 말했다. 소설을 사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다.
"어떻게 해도, 나 자신을 변화시켜 보다 높은 지점으로 삶을 계속해서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다시 직면한다."(219쪽) 이건 삶에 대한 통찰력이다.
물고기, 아내, 아버지, 가끔 집에 찾아 오는 손님들, 호수를 거닐다가 혹은 비가 내리는 날의 상념들, 입체적으로 남은- 젊은 시기의 추억들, 많은 이야기들이 책 속의 호수 사진처럼 잔잔히 흐르고 있다. 쓸쓸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를 달래기 위해 많은 이야기들이 스스로 조정리 집에 깃든 것이 틀림 없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홀로 가득 차고, 수시로 따뜻이 비어 있는 그곳'에서 써내려간 이 글들과, 같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작가가 아침에 눈을 떠서 괴테의 이 시구를 떠올리는 것은, 그의 삶이 온통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사랑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이야기 덕분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사랑해야 함을 배웠다. 마음이 식어갈 때마다 다시 열어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