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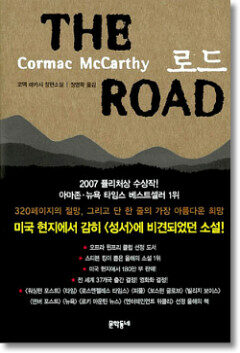
" 할 일의 목록은 없었다.
그 자체로 섭리가 되는 날. 시간. 나중은 없다. 지금이 나중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는 것들은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슬픔과 재 속에서의 탄생. 남자는 잠든 소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는 네가 있는 거야." (본문 p.64)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이 없어졌다. 아니 세상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진 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 단어인 '남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가슴 속에 살아있는 불꽃을 안고...
암울한 소설. 너무나 어둡고 암울해서 습기가 눅진거리는 지난 여름의 계절감마저 잊게 했던 소설이었다. 책장을 넘기는 초반에 '이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려놓았다. '좋은 것도 다 못보고 죽는 세상, 싫은 건 억지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는 소신으로 살아온 내게 '우울한 기분'은 딱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왜 였을까? 지리한 장마비가 처량하게 들렸던 탓일까?
며칠 후 늦은 밤 나는 또 이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밤이 하얗게 된 후에야 마지막 책장을 덮었다. 차라리 죽음이 나을 법한 곳에 어린 자식을 홀로 두고 죽어간 아비가 불쌍해서, 내가 그곳에 없다는 것이 다행이란 안심에 눈물이 흘렀다. 그런 날이, 그런 상황이 내게도 닥친다면 난 어떻게 할까? 좋은 사람이 될까, 나쁜 사람이 될까? 내게도 불꽃이 남아 있을까, 그럼 난 어디로 갈까? 내 옆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소설의 리뷰 - http://blog.daum.net/tobfreeman/7162723
무수한 여운과 자문을 던져준 소설, 로드The Road는 내게 그런 소설이었다.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개봉을 기다렸다. 개봉한 첫 날, 그 어두운 세계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다시 <더 로드the Road>를 만났다.




좀처럼 소설을 읽지 않는 편이지만 '영화화 된 소설'은 애써 찾아 읽는 편이다. 그 말은 곧 글 속에 '충분한 영상미'를 가지고 있고, 통속적이지만 무시하지 못할 '흥행성'을 갖춘 작품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원작인 소설과 각색된 영화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찾는 재미도 있다.
하지만 '형만한 아우없다'는 말처럼 원작을 따라가는 영화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영화를 볼 요량으로 소설을 우선 읽지만(영화를 본 후에는 절대로 소설은 읽지 않는다), 잘된 작품을 만나면 영화를 보기가 두려워진다. 원작을 얼마나 잘 소화해 낼지 감독이 의심스럽고, 배우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부러 영화를 보러 갔다가 '원작에 누가 된 영화'를 본다면 그 실망감은 분노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참고로 지난 해 봤던 연을 쫓는 아이와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원작에 비교적 충실한 작품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영화 <더 로드> 역시 원작이 보여준 영상을 그대로 소화한 보기드문 영화였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개성파 배우 비고 모텐슨의 풍부한 감정연기는 특별할 것 없는 대사를 대신하기에 충분했다.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감정표현은 울음, 눈물이었다. 그리운 아내가 그리워도 울고, 깊은 밤을 편히 보낼까 하는 두려움에도 눈물이 흘렀다. 우연히 찾은 지하대피소에 그득한 음식들을 대한 그 때도 어김없이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희노애락을 대신했던 눈물을 비고 모텐슨은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던 윌 스미스의 <나는 전설이다>가 전형적인 헐리우드식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시종일관 '동일시'하게 하는 묵시록적인 영화였다. 암울한 배경, 두려움이 벗어나지 않는 배우들의 표정에 한기를 느껴 앞섬을 추켜올리게 했다. 그렇다, 동일시同一視. 영화 속에 내가 들어 있었다. 내가 그라면, 저 세상아닌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라는 그녀의 명쾌한 대답에 모두 벗어버리고 떠나간 아내(샤를리스 테론)이 떠올랐다.
"그건 아니지. 개똥 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목숨이 있는 한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뭐 할껀데? 아무런 희망도 목표도 없는데 뭐할려고? 오빠도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
딱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튼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데, 왜냐면 답할 말이 없다.
그냥 살고 싶단 말 밖에는...

"난 오랫동안 불을 보지 못했소. 그뿐이오. 나는 짐승처럼 살고 있소.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을 거요. 저 아이를 봤을 때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소.
천사인 줄 아셨나요?
뭔지는 몰랐소. 그냥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저 아이가 신이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그런 건 다 넘어섰소. 오래 있었거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신도 살 수가 없소. 당신도 알게 될 거요. 혼자인 게 낫소.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오. 마지막 신과 함께 길을 떠돈다는 건 끔찍한 일일 테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요. 모두가 사라지면 좀 나아지겠지."
아이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 희망이 담긴 불꽃이 없는 세상이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아비는 평소대로라면 남겨진 자식의 미래가 두려워 함께 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남쪽으로 가거라, 얘야." 바로 살아있음이, 아이의 생명이 '가슴 속에 불타는 불꽃'인 것이다. 신도 포기한 듯한 버려진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은 실존이다. 살아있기에 살아야만 한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아남는 것이 생生에 남겨진 숙제인 것이다.
무서울 만큼 놀라운 영화, 원작에 견줄만한 영화였다.
코맥 메카시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그가 그리는 세상을 볼 기회다.
비고 모텐슨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그만의 완벽한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투 썸즈 업Two Thumbs Up !" 최고의 영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