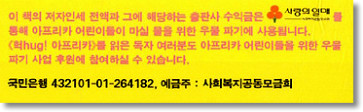-

-
헉hug! 아프리카
김영희 지음 / 교보문고(단행본) / 2009년 6월
평점 :

품절

PD 쌀집 아저씨, 아프리카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다!
대한민국에서 몸과 맘이 가장 바빴던 사내가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가 몸과 맘을 바쁘게 했던 이유는 한가로운 주말 저녁 국민의 웃음과 감동을 책임졌었기 때문이다. 김영희라는 이름보다는 ‘쌀집아저씨’로 더 잘 알려진 이 사내의 사연 깊은 아프리카 여행이야기는 <헉! 아프리카Hug Africa>에 고스란히 담겼다.
내가 이 책을 든 단 한 가지 이유는 ‘예능에 능한 사내가 예능이 없는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점이었다. 왜냐고 묻고 싶었다. 그 답을 알 방법은 책을 드는 수 밖에 없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양심냉장고’를 비롯 ‘칭찬합시다’, ‘21세기 위원회’,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느낌표!’ 등 국내에 많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을 넓혔던 그에게 어느 날 ‘아이디어’가 고갈됨을 느끼게 된다.
그에게 봉착한 문제는 다름 아닌 그가 성공으로 이끌었던 프로그램들에 있었다. 단순히 흥미를 던져주는 오락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사회성’이 권력화勸力化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몸과 마음이 바닥을 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화두 삼아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는 왜 아프리카로 떠났을까? 저자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이 싫어진 때문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목젖이 드러난 웃음 뒤에 페이소스같은 여운을 남겨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계기를 삼고자 했다. 하지만 그 반향과 더불어 사람들의 뜻이 변하고, 움직임이 변하는 큰 흐름 뒤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만나게 되었다. 자유로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생각을 저지당하고,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온전히’ 저 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는 사람이 싫어졌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뭉쳐사는 ‘시스템’이라는 문명에 학을 뗐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자연의 대륙 아프리카로 떠났을 것이다. 갑자기 그가 떠난 이유를 짐작함은 참으로 실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책을 읽는 내내 그것을 짐작하게 했다. 이 책에서 그는 ‘광활한 자연’과 ‘순수한 사람’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질리도록 만끽하고 돌아왔음을 알게 된다.
책 읽는 재미가 여간 쏠쏠하지 않다. 우선 기존의 여행책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대륙을 말한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 책의 주인공이 생각 많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맨이라는 점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글만큼이나 재미있고 상상력 높은 그림들이다. 책 한 권 전부가 몇 시간짜리 오락 다큐멘터리였다.
이야기의 절반은 그가 본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문명인을 웃기는 조금 더 문명인 셈인 쌀집 아저씨가 자연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 속에 사는 자연인을 만나니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다. 검은 대륙의 검은 사람들도 신기하다. 특유의 냄새와 낯선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들에게 가졌던 편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에피소드들이 이 종종 눈에 띈다. 기다림에 익숙하고, 교통수단보다는 도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시간의 유한함’은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런 그들을 본 저자는 처음 ‘몇 푼 안되는 차비가 없는 그들’에게서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생에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몸으로 느끼며(심지어 맨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 본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면 동물animal은 움직이는animate 생물creature여야 정상인 것이다. 오히려 시계라는 인조물에 갇혀 24시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문명인이 실은 사람이 아닌 ‘쳇바퀴 속 다람쥐’였음을 알게 된다. 그는 말한다.
“문명은 더 이상 인간을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므로...인간은 걷지 않는 한 더 이상 동물이 아니다.“ 34 쪽
재미있는 것은 그는 ‘문명화 덜된 자연인’에게서 느꼈던 연민을 느끼는 반면, ‘너무나 문명인스러운 자연인’에게는 지나친 반감을 갖더라는 것이다. 대자연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인이 됨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가 아프리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여행책자 <론리 플레닛>이다. 김영희는 처음 책이 말하는 바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그럴까?’ 아니었다. 검은 피부에 검붉은 눈자위를 가진 무서운 그들이 사실은 웃을 때 드러나는 ‘흰 이’만큼 순수했다. 그는 동부 아프리카 최대의 슬럼, 키베라에 들어가 돈 한 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준 풀 카트를 함께 씹어 먹고 악수하고,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의 말을 듣고 따라할 건 아닌 듯. 쌀집 아저씨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경계할 만큼의 외모와 풍채를 지녔기 때문이다. 한 날은 칼을 든 강도를 두 번이나 만나는 데 욕을 해대는 그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물리치는 대목을 보면 아무나 따라할 건 아니지 싶다.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은 자연이다. 십여 시간을 버스로 달려도 지평선인 대지, 검붉은 노을, 끝없이 쏟아지는 빅토리아 폭포, 위로 흐르는 나일강, 바다 같은 사막까지... 가는 곳곳 마다 자연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했다. 김영희는 자연 속에 자신이 있음을 감탄한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태고의 자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감탄했다. 또한 그 속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감탄했다. 사람도 자연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글 꼭지의 마지막엔 그가 느끼는 감상이 요약되었다. 글을 읽다보면 그 대목에 주목하게 된다. 꿈보다 해몽이라 했던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그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대목은 다분히 시적詩的이었다. 그는 아이디어맨이 확실했다.
그는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살아있는 대륙의 자연을 만끽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통해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느끼고 돌아왔다. 그 소감을 마지막 글 ‘나는 왜 아프리카에 왔을까? 에 대한 대답’편에 잘 드러냈다.
“아프리카 여행이 끝나가는 날, 쿠마시의 노천 시장에서 나는 그 답을 찾았다. 바글거리는 시커먼 그들에게서 나는 꿈틀거리는 생명을 보았다. 실아있다는 것! 마치 갓 건져 올린 생선이 펄떡이듯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펄떡였다. 날것처럼 살아 있었다. 생명의 힘! 내가 살아온 곳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원초적 생명이 거기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꿈틀거림이었다.
그렇다!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해 나는 그토록 먼 길을 달려와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내 안의 꿈틀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나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오도록 한 그 무엇이 그토록 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아프리카에 온 이유였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인거야! 살아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353 쪽
아마도 그는 잃었던 소신所信을 얻어왔을 것이다. 자연自然이 스스로自 그렇듯然 존재하는 것이 자연인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것임을 배웠을 것이다. 자신을 믿는다면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꿈틀거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에게 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를 통해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껏 상상하지도 않았던 아프리카 대륙을 그를 쫓아 밟아보고 싶어졌다. 올해 다시 PD로서 브라운관으로 복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제 그가 연출한 프로그램을 보면 화면 뒤에 숨은 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멋들어진 기행문이었다.
P.S : 그가 ‘꿈틀거리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 책에서 시작했다. 쌀집 아저씨라는 인간, 멋진 동물anima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