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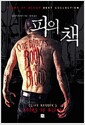
-
피의 책
클라이브 바커 지음, 정탄 옮김 / 끌림 / 2008년 7월
평점 :

품절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제껏 한번도 만나본 적 없던 호러소설!
호러의 대가, 스티븐 킹은 이 책의 저자를 이야기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까지 공포에 떨게 만든다. 그의 책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십 년간의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어떤 단편들은 너무 오싹해서 읽을 수 없었고, 또 어떤 단편들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클라이브 파커, 그는 호러의 미래다."
그렇다. 이 책은 스티븐 킹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호러소설이다. 스티븐 킹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감춰진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공포를 탁월하게 묘사한다는 평을 듣는 작가이다. 그가 가족간의 불화, 집단 따돌림 같이 일상에 자리한 사소한 문제들이 언제라도 생명을 위협할만큼 커다란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스피디한 필치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 내 주변에 있을 지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이 책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끌어온 공포를 쏟아낸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적 공간적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국 판타지 문학상]과 [세계 판타지 문학상]을 받을 만큼 '판타지풍'의 냄새도 짙게 지니고 있다. 작가가 직접 메가폰을 잡았고, 기괴한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는 영화 [헬레이저]가 그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 실제 구미에서는 그의 소설을 소재로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이 제작된다고 하니 그 면면을 알 듯도 하다.
이 책은 그가 지금껏 펴낸 피의 책Books of Blood의 단편들 중에서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작품들을 따로 모아 실은 책이란다. 그런 덕에 단편 하나 하나가 '끔찍하게' 무섭다. 클라이브 파커의 책, [피의 책Books of Blood]다. 모두 열 편의 단편들을 한 권으로 묶었는데,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내가 한꺼번에 읽기에는 버거울 만큼 무서워서 한 달 전에 읽기 시작해서 사흘에 한 편씩 어제야 마칠 수 있었다(실제로 소설을 읽은 내용으로 꿈을 꾼 적이 세 번 이었고, 가위도 한 번 눌렸다).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덜덜덜~' 끔찍했다.

열 편의 작품 중에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과
[피그 블러드 블루스] 그리고,
[섹스 죽음 그리고 불빛]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은 지난 달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상영된 바 있다. 뉴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하철 살인사건에 주인공 카우프만은 피상적인 관심만 갖는다. 마치 우리가 신문을 통해 사건과 사고를 접하는 것처럼. 가해자인 연쇄 살인범 마호가니는 스스로를 선택받은 인간이라 여기며 매일 밤 벌이는 살인에 신성한 의무감마저 느낀다. 그리고 이 운명의 두 인물이 어느 날 한밤의 식육 열차 속에서 만난다. 상상속의 귀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자와 조우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피칠갑'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만큼 책을 읽으면서도 비릿한 '피냄새'가 나는 듯, 읽기조차 끈적거렸다.
[피그 블러드 블루스]는 퀴퀴한 땀 냄새와 음침한 공기가 진동하는 청소년 갱생원에 파견되어 온 전직 경찰, 레드먼가 겪는 이야기인데, 색다른 느낌의 레이시와 그곳 사람들 그리고 석연치 않은 아이들의 행동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다. 판타지적인 그의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단편이었다.

원한과 복수으로 비롯된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의 억울한 사연으로 첨철된 귀신이야기와 그와 대적하는 퇴마사들의 한판승부여서 결국은 결말이 원인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한국적 공포라면 이 소설은
꿈에 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상밖의 사물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원인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놀람과 공포는 배가가 된다. 인간의 상상력과 잔혹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책을 읽는 독자나 호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잔인하다 또는 성격이 이상한 것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둘 수 있는데, 저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일상에서 억제된 문화적 요구를 모처럼의 기회에 표출하려는 사람이다. (...)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 영혼에 깃든 어둠과 마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원시 자아, 요컨대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에 존재했을 , 그리고 세상은 거대한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자아와 재회하는 방법이다."
책이라고 해서 항상 윤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교훈적일 수는 없다. 이 책을 통해 그것을 느끼려 한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활자 속에서도 악몽을 꾸는 듯 겁먹고 싶다'면, 그러기를 즐긴다면 꼭 한 번 권하고 싶은 책이다. 역자의 변에서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으로 암시한 바 있어 자못 기대도 된다. 공포소설을 즐기는 독자라면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