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리대왕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9
윌리엄 골딩 지음, 유종호 옮김 / 민음사 / 2002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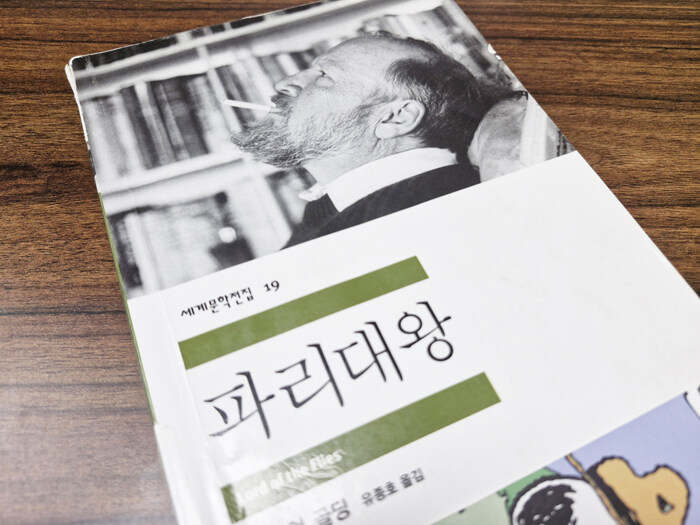
궁금해 하던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을 읽었다. 사실 하도 그전에 여기저기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작 읽어본 적은 없는 그런 고전이라고 해야 하나. 도서관에 들러서 <육두구의 저주>를 찾다가 눈에 띄어 빌려서 바로 다 읽어 버렸다.
미국 대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하던데, 읽기 쉽고 주제가 비교적 뚜렷해서 인기가 있지 않나 싶다. 책은 1954년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번역이 많이 아쉬웠는데, savage를 오랑캐로 번역한 건 좀 아닌 듯 싶다.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영국 출신의 소년들이 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남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고립된 장소, 부족한 먹거리 그리고 분출하는 갈등, 뭐 이 정도 설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는가 말이다.
6살부터 대략 12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처음에는 그나마 민주적인 방식으로 랠프를 지도자로 선출한다. 소라를 불어 소년들은 모은 랠프가 대장이 되는데는 지독한 현실주의자 돼지(피기)의 역할이 컸다. 다른 소년들이 쾌락주의자라고 한다면, 돼지는 상당히 자신들이 처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나름 최선을 도모하는 그런 인간형이다.
랠프와 돼지 그리고 사이먼이 이성을 대변하는 한 패라고 한다면, 성가대 출신으로 사냥부대를 자처하는 잭과 로저 일당이 반대편을 구성한다. 장발족 랠프들은 우선 탐험을 통해 고립된 섬의 지형을 파악하고, 산꼭대기에 봉화를 피워 지나가는 배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조받는다는 계획을 세운다. 자력으로 섬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타당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무인도에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머물 수 있는 오두막을 지어야 한다는 랠프는 어린 친구들에게 설파한다.
반면, 유희적이고 쾌락적인 인간형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야만으로 치닫게 되는 잭이 이끄는 사냥부대는 섬에 사는 야생 멧돼지를 잡아 배를 채우자고 주장한다. 전자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이라면 후자는 당장 입에 채워지는 즐거움과 군중을 자극하는 단선적 계획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의 후손으로 랠프들이 문명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진다면, 잭 일당은 그에 반하는 이단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랠프와 돼지가 우연히 얻은 소라 나팔은 권위를 상징한다. 누구든 회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소라를 들고 말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든다. 하지만, 이 또한 잭 패거리의 횡포로 나중에 가서는 별다른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대중을 즐겁게 해주고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문명이든 야만이든 상관 없다는 게 윌리엄 골딩이 말하고 싶은 바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소설에서 잭의 사냥부대가 결국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되고, 잭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아니 랠프는 자신의 동지들인 사이먼과 돼지를 차례로 잃게 되면서 재기불능에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실 불 피울 도구조차 없는 아이들이 돼지의 안경을 화경으로 사용해서 불을 붙이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잘 알 수가 있다. 내가 랠프라면, 아이들을 동원해서 비행기에서 추락한 잔재들을 끌어 모아 오두막 짓는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 거의 광기에 미쳐 날뛰는 잭 패거리를 초기에 제압하는 방식은 또 어떨까. 소년들의 회합에서 정한 합의와 규칙 그리고 통제에서 벗어난 잭들은 오로지 사냥에만 미쳐 날뛰다가 결국에는 동료들조차 죽이게 되는 비극에 도달하게 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사실 짧지만 강렬한 성장소설의 외피를 두른 <파리대왕>은 영국 모험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어떤 비극을 부르게 되는지 강렬한 서사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미 소년들이 아무런 도구나 장비 없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한 광기의 폭발은 예정되어 있었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한편, 소설에서 폭력과 광기를 담당한 잭 역시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 야생 멧돼지로 대변되는 식량이 결국 소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잭은 사냥 부대의 리더가 되어 먹을 거리로 그들을 지배한다. 물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짐승의 실체에 대한 규명 없이,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조차 자신의 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가. 꼬마들의 무섬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모습은 또 어떠한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이먼은 하늘에서 떨어진 짐승의 실체가 사실은 죽은 조종사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직접 확인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이먼이 광기의 축제가 한창 진행되는 순간에 등장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다음 타자는 돼지였고, 그나마 이성의 끈을 놓치 않았던 랠프마저 그들의 죽음이 살해가 아닌, 어쩌면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설정에 그저 놀랄 따름이었다.
<파리대왕>에서 윌리엄 골딩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야만과 문명은 한 끗 차이라는 게 아니었을까. 아무리 우리가 문명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극한에 내몰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소설에 등장하는 '새비지' 무리와 다를 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아직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새비지 무리의 소년들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고, 즐거울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알 게 뭐냐는 식이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권력을 가진 어른들의 부재에서 오는 아노미적 상태에서라면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70년 전에 나온 책이고, 또 그 후로 비슷한 상황 설정을 가진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들을 보다 보니 입소문만큼의 강렬한 무언가는 없었던 것 같다. 어쩌면 소년들과 비슷한 나이에 이 책을 읽었다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려나. 너무 무게를 주지 않고, 가볍게 읽은 것으로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