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더 많이 책을 읽는가 보다.
이상하다 그치.
날이 더워지면 책에 집중하게 되는 건가? 이제 누가 뭐래도 여름이다.
지난 주말에 사서 읽은 요네자와 호노부의 <흑뢰성>이 촉발시킨 사무라이물에 빠져서 어제는 제목부터 아주 샤~한 <사무라이 윌리엄>을 사서 읽었다.
얼마나 재미졌는지 어제 오늘 딱 이틀만에 독파해 버렸다. 슬슬 발동이 걸리는가 보다.
예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읽을 적에 등장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리뷰를 찾아 보니 일본 이름 미우라 안진으로 자주 등장했었다. 미우라 안진과 윌리엄 애덤스가 동일인물이었구나 그래.
일본 천하의 쟁패를 가른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던 해인 1600년 일본에 도래해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국인 자문관이자 하타모토로 발탁되어 사무라이가 된 사나이가 바로 윌리엄 애덤스였다.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담겨 있긴 하지만, 서양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17세기 일본에 대한 서술이 인상적이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책이었는데 가일스 밀턴 작가의 모든 책들이 절판이라 그 점이 좀 아쉬웠다. 어때, 사냥꾼 이 저자의 책들 사냥에 나설텐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대학로에 갔던 길에 사들인 책들이다.
일단 얼마 전에 알라딘 동지 미미님이 화장실에서조차 손에서 뗄 수 없다는 말로 자극한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다.
미미님의 글을 읽고 나서 당장 도서관에 가서 달려가서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아숩게도 이 책 역시 절판되어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읽기 시작했다가 <사무라이 윌리엄>에게 밀렸다. 오늘부터 다시 읽는다.
예전에는 책 읽을 적에 메모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읽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4B 연필로 밑줄도 좍좍 긋고 메모도 마구하면서 책을 읽는다. 이래서 책을 사서 읽어야 하나 보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 말이다.
책과 혁명에 대한 밤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책은 고저 밤에 읽어야 제 맛이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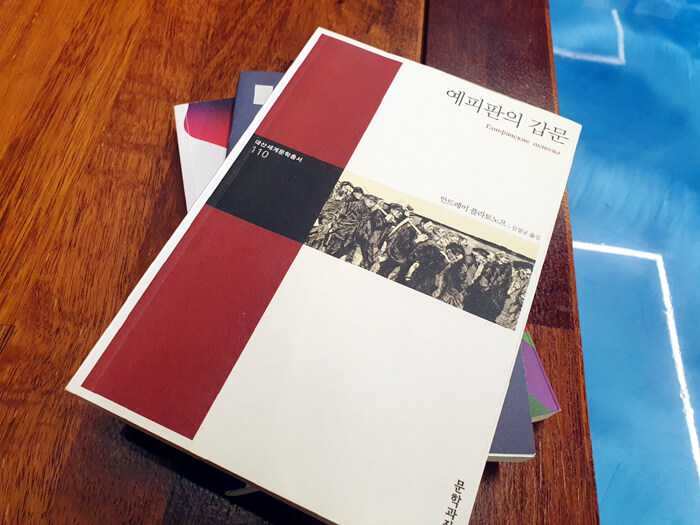
다음 주자는 소비에트의 조지 오웰이라는 별명을 가진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예피판의 갑문>이다.
이 저자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는데, 나의 고질병인 일단 어느 작가에 꽂히게 되면 당장 읽지 않더라도 사재기 병이 도져서 바로 구입을 결정했다. 사실 대산세계문학총서는 중고 책방에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는 대로 사는 게 옳다.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구덩이>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다 지었다. <구덩이>랑 <코틀로반>이 같은 작품이라고. 아마 쏘련말로 구덩이가 코틀로반인 모양이지.
플라토노프의 중단편 7편이 실린 소설집이다. 오늘 샀으니 몇 쪽이라도 읽어주어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마리즈 콩데 여사의 책까지 해서 이렇게 3권 그리고 어제 <사무라이 윌리엄>,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 5권을 들였다. 차례차례 읽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