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tt
Album: Vapen och Ammunition
Lyrics: Joakim Berg
Music: Joakim Berg
I got mail
A real letter with a stamp
A postcard from long ago
When the future was ours
And as you wrote
About your search for freedom
Words with wings like a butterfly
And I think I understand
That slowly, slowly, oh so slowly
You won your nights back
Slowly, slowly, oh so slowly
We slid into oblivion where the light is weak
Into what we were
I wrote a letter
About living with the curse
I gave you my version of the truth
To make you understand
That slowly, slowly, oh so slowly
So we won our nights back
Slowly, slowly, oh so slowly
So we slid into memories, hidden far behind
That was what we were
Slowly, slowly, oh so slowly
We won our nights back
Slowly, slowly, oh so slowly
We slid into oblivion where the light is weak
What we were
(kentfans.com)
책 몇 권, 음반 몇 장, 어떤 목소리,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말. 계절이 바뀌기 전. 계절이 다가오기 전. 매일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을 때. 어떤 시간은 멈추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그냥 떠오르는 수도 있지만, 종종 어떤 사물이나 종잇조각, 먼 곳의 기차표, 트램 티켓이나 심지어는 초콜릿 포장지를 타고 오기도 한다. 마치 아기 거미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듯이. 그러다가 종종 공기가 맑게 들뜨거나 비구름 아래 가라앉고, 좋아하는 계절이 사그라지고 나면 어느덧 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의 계절맞이를 했다는 것이 떠오른다. 커피가 식어버릴 때, 내 앞에 놓인 허망한 스테이크 한 접시를 바라볼 때, 사우어 크림을 얹은 감자를 바라볼 때 나는 종종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뚱보'를 떠올린다.

나는 다른 테이블의 시중도 들어야 했어. 요구가 많은 사업가 네 명이 앉은 테이블하고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앉은 테이블, 그리고 노부부의 테이블이었지. 리앤더가 그 뚱뚱한 남자에게 물을 따라주었고, 나는 그 남자가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그 테이블로 갔어.
안녕하세요? 주문 받을까요? 내가 말했지.
리타, 그 남자는 덩치가 컸어. 정말 크더라구.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네요, 우리 이제 주문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하고 그가 말했지.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이상하지 않니? 그리고 때때로 조금씩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더라.
시저 샐러드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괜찮으시다면 수프에 빵과 버터를 곁들이구요.양고기 요리가 좋을 것 같군요. 사워크림 얹은 구운 감자하고요. 디저트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 메뉴를 건넸어.
세상에, 리타. 그 손가락이라니.
나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루디에게 주문서를 내밀었어. 그는 인상을 쓰면서 그것을 받았어. 너도 알잖아. 그 사람 일할 때면 늘 그런 얼굴이지.
주방을 나오는데 마고가-마고 이야기 한 적 있지? 루디 쫓아다닌다는 애-그애가 묻는거야. 저 뚱땡이 누구니? 라고. 그 사람 진짜 뚱보야.
여자는 몹시 뚱뚱한 남자의 식사 시중을 한다. 덩치가 큰 뚱뚱한 남자. 그는 시저 샐러드, 빵과 버터, 사워크림을 듬뿍 끼얹은 감자, 양고기 요리, 그리고 초콜릿 시럽을 한 방울 떨어뜨린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소스를 얹은 푸딩 케이크를 모두 먹어치운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그러나 레이먼드 카버의 묘한 필치는 거리와 관계를 급하지 않게 조절한다. 처음 시저 샐러드를 준비하던 그녀는 실수로 컵의 물을 엎지르고, 얼른 치운다. 뚱뚱한 그 남자는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사우어 크림을 더 많이 얹은 감자를 그에게 가져다준다. 주방으로 가서 직접 디저트를 챙기는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서커스단의 뚱보를 받았다며?' 라고 묻자 그녀는 '루디, 저 사람은 뚱뚱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라고 대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뚱보가 이 단편소설에서 사라지기 전, 그러니까 여자가 뚱보의 테이블에 스페셜 디저트와 아이스크림을 놓을 때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하게 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서 살이 좀 찌면 좋겠다는 여자의 말에 뚱뚱한 그 남자는 '안 돼요. 선택할 수 있다면 찌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것이 끝이다. 뚱보는 식사를 마쳤고, 여자는 집으로 가고, 여자의 남자친구와 침대에 누운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뚱뚱해졌다고 느낀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벌써 그녀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느낀다.
그의 다른 단편과 마찬가지로 '뚱보'에서도 풍경은 늘 말없이 흘러간다. 이야기는 간단하고 짧고, 어찌 보면 커다란 갈등도 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 간결한 한두 가지 색채를 바탕으로 허기와 절망, 다툼과 쇠락, 슬픔과 고독, 감정의 연대가 무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잠시 빠져나와, 옆 사람의 심장 소리, 다른 이들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이를 잃고 생일 케이크를 가지러 가서 밤새 갓구운 빵을 먹던 젊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 저녁 내도록 약간은 목소리를 높이던 그 남자와 여자는 앞으로도 계속 손을 잡을까? 나뒹굴던 청구서를 아예 청소기로 빨아들여 없애 버렸건만, 청구서는 또다시 오면 그만 아닐까? 고장이 나 버린 냉장고는 다시 멀쩡해질까? 아니면 새것을 살 때까지, 그 속의 음식물을 다 어찌한단 말인가?
이야기는 짧고 우리는 그다음을 알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단편 소설의 특징. 한국에서는 '단편 소설'이라고 하지만 영미 문학권에서는 장편 소설은 노블, 중간 정도의 인간의 어떤 단면을 담은, 한국의 중장편 정도를 노벨레, 그리고 레이먼드 카버와 앨리스 먼로, 줌파 라히리, 오스카 와일드가 곧잘 쓰던 단편소설은 숏 스토리로 구분한다. 장르의 다른 특징을 생각해본 다음 다시 읽어본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은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것의 순간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는 저너머의 풍경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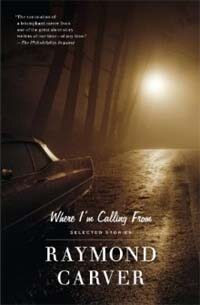
뉴요커 픽션에서 데이비드 민즈가 말하였듯, 레이먼드 카버는 여전히 몇 가지 이유에서 오해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등교육까지를 마친 작가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모든 문제에서 피하려고 할 때 빚어진 특징이 아닐까. 특징을 가장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카버의 모든 특징은 간결함에 있을 것이다. 짧은 분량으로 보는 긴 시간과 불협화음.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온갖 사물이 내는 잡음. 멈추어 버린 냉장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차. 짧은 두세 문장에 스미는 괴로움. 별로 사랑하지 않게 된 남자와 여자, 억지로 오래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써온 관계, 우리가 몇십 년을 지나야 겨우 인정하는 어떤 사실이 몇 개의 문장 속에 담겨있다. 어떤 여자의 눈을 통해, 혹은 어떤 남자의 목소리로 펼쳐진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집어넣지 않으면서도 간결하게 조금씩 공개하는 솜씨는 분명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작가의 능력.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뚱보의 말처럼, 과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은 얼마나 많은가. 신자유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 하지만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외따로 떨어져 숨 쉬는 이들이 아니다. 관계를 맺고 거리를 좁히거나 늘리고, 더 단단해지거나 더 허물어지기를 스스로 반복해서 마침내는 지금의 자신이 되었으나, 이마저도 점점 다시 변할 것이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을 읽노라면 이런 관계의 유령이 보인다. 지금 내가 보는 너의 모습은 유령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나 나 역시 내가 아니었듯 너도 네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느낌과 생각이 십자로 만나서 다른 무늬를 만들 때, 소설을 쓰는 힘과 소설을 읽는 눈이 어떻게 만나는지가 조용히 들린다. 듣는 눈과 보는 귀. 이런 겉치레 없는 상황에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올바른 대답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때. 별로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것을 가장 쉽게 알아내는 순간. 이럴 때만 나는 유령이 아닌 내가 된다. 그 밖 순간에는, 오늘과 어제가 겹치고 내일과 오늘이 엇갈려 스치는 그림자로 남는 사람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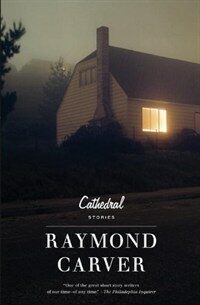
작가와 독자는 내 말에 과연 고개를 끄덕일까. 아니면 가로저을까. 나는 과연 소설을 이해하고 있을까? 혹은 하찮은 위로와 혼자가 아니라는 알량한 관심만을 목격한 것일까.
작가란 어쩌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세상을 읽어낼 수도, 사물을 만들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일 것이다. 효용의 척도는 유용함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소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용한 존재. 작가는 이 무용함을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남긴다. 이 순간 빚어지는, 무엇도 창조하지 못했지만, 저너머 무지개 너머 아련히 보일 듯한 무엇인가를 향한 동작. 가진 기억과 없는 능력을 한몸에 지니고서도 그 부조화를 자랑으로 삼는 움직임. 작가는 그 때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남김으로써 사라지는 존재, 그럼으로써 더욱 가벼워지고 간결해지는 사람. 눈먼 사람에게 조심해요(watch out!)라고 말하고 멈칫, 하는 목소리 다음 펼쳐지는 대성당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