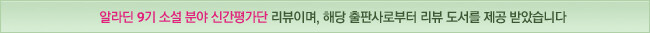[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알베르토 망구엘 지음, 조명애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1년 8월
평점 :

절판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은 좋지 않은 거라고 교육받는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은 용서될 지 모르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말은 용서되지 못한다. 누구든 소년기에 이런 따끔한 호통을 한 번은 들었을 것이다. “잘못은 해도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 자질의 문제로 치부된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자질의 문제로 들고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 모든 거짓말들은 고의성이 바탕이 된다. 누구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거짓말 탐지기가 그런 것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던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신체언어를 읽음으로써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거짓말이 고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존재할까.
알베르토 망구엘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는 이와같은 고의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다룬다. 소설을 서술하는 자는 한 기자이다. 소설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뷰의 주제는 베란다에서 자살한 한 아르헨티나의 작가 알레한드로 베빌라쿠아에 대한 것이다. 그가 죽은 지 30년 후에, 한 프랑스인 기자의 그의 죽음에 관해 그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기자의 인터뷰 대상이 된 네명의 인물들은 저마다 기억하는 베빌라쿠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선 30년이란 세월 동안 흐려지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 그것은 소설이 진행될수록 미묘해진다.
한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각차를 다루는 가장 유명한 소설은 ‘라쇼몽’이다.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인물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 소설은 진실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소멸되며, 남은 것은 목격자의 기억 속의 조작된 편린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달한다. 물론 그것은 목격자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편집된 기억일 수도 있다. 편집된 과거라는 복잡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기억은 어찌됐든 부분적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진실과 유리된다.
베빌라쿠아는 자살했다. 그리고 그와 가까웠던 네 명의 인물이 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베빌라쿠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베빌라쿠아의 이야기들은 전혀 다르다. 소설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차 새로운 인물에 의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그 전 인물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진실이야 여겼던, 기억했던 사실들을 말했을 뿐이므로. 하지만 전체를 알지 못하는, 부분은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
모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나면, 결국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거짓말쟁이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들이 말한 이야기들은 진실이면서도, 또한 온전한 진실은 아니므로.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소설의 인문들 뿐 아니라, 소설을 읽는 독자들 또한 모두 거짓말쟁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