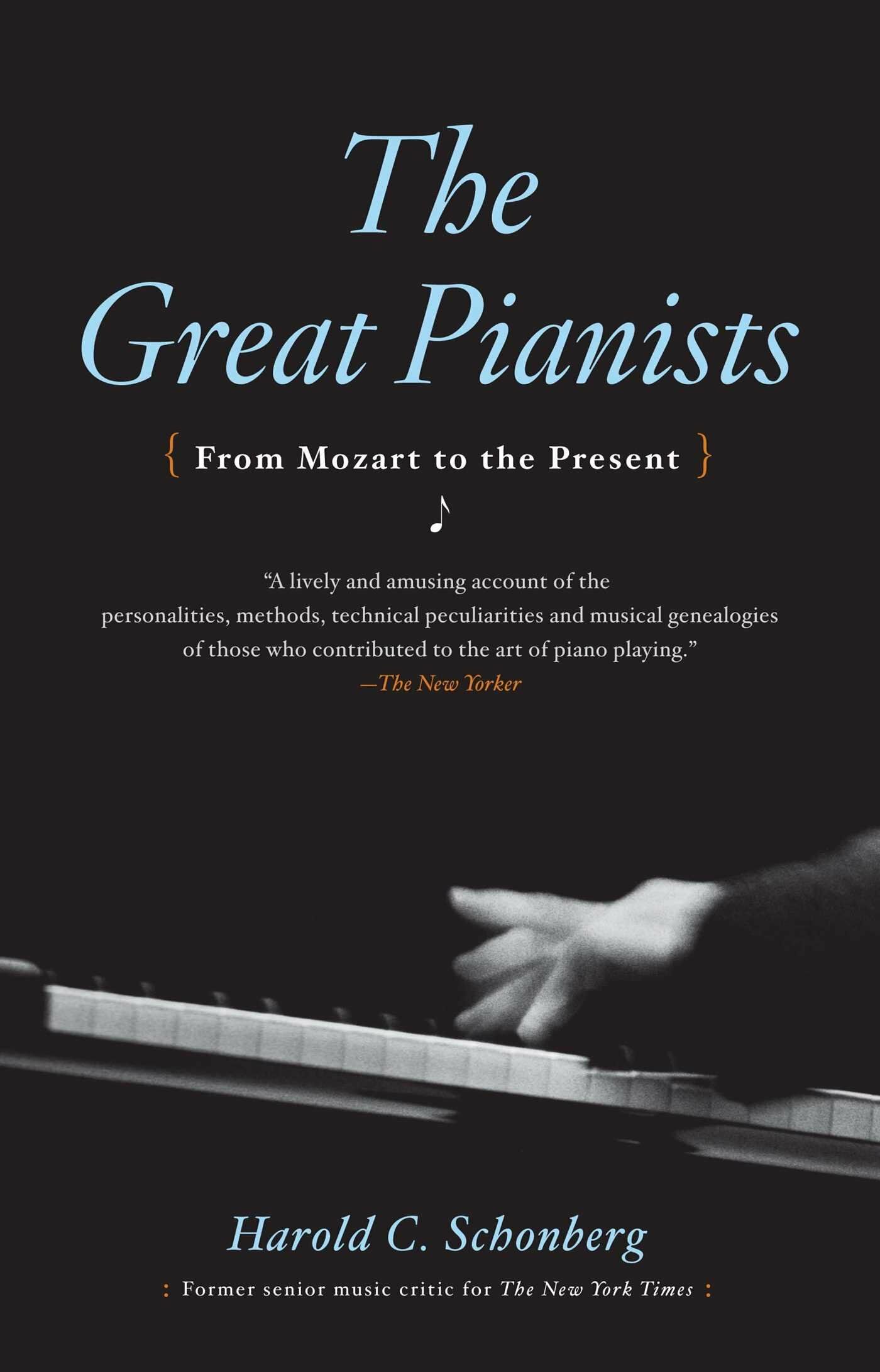
상반기 읽은 책 중 이것도 많이 감탄했던 책이다.
번역 나와 있던데 번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지만
영어로는 저 위에 "a lively and amusing account" 정말 그렇다.
재미없지 않을까.... 였다가 깜놀의 반복이었다. 아니 이 장르의 규칙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미있으면? 게다가 쓸데없이 고퀄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해롤드 쇤버그, 그의 책들을 더 사들였다.
위대한 작곡가들. 위대한 지휘자들. 그리고 '비르투오소'들을 주제로 한 책이 있다. virtuoso. 복수형, virtuosi.
이중 <위대한 작곡가들>을 옆에 두고 조금씩 보는데, 이건 <위대한 피아니스트들>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남성우월주의, 여성혐오, 이것이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은, 누가 한국어로 이 정도 되는 책을 써야 합니다.... 같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다.
그 점에 대해, 쇤버그가 영어 문장의 '비르투오소' 급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니까 문장의 거장이란 뭐냐.
그런데 <위대한 작곡가들>은, 여기도 여러 미덕이 있긴 하지만 악덕도 만만찮은 느낑미라
.......... 이 느낌 <위대한 피아니스트들>로 소급하여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 중.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됨이 나이듬과 함께 오는 해방이라고 포스팅하고 나서
이 무슨 그 누구의 관심도 아닐 가장 사소한 '느낌'에 열중하고 있음.
아무튼. <위대한 피아니스트들> 다음에 Counterpoint를 읽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위대한 피아니스트들> 이 책에 했던 감탄이 Counterpoint에서 증폭했던 것이기도 하다.
누가 한국어로 이 정도 되는 책을 써야 합니다. : 아주 강력히 그랬다. 음악과 삶에 대해 나오는 논의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낮지는 않다..........) 개인성, 주체성, 강한 자아, 이것의 면에서.
개인성, 주체성, 강한 자아. 이것의 면에서 특히 놀라운 책들이 꾸준히 나온다면
일상에서 협잡이, 협잡으로 보일 것이다. (.............) 고 생각했다. 그렇든 아니든 어쨌든
회고록의 시대...... 열리기를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