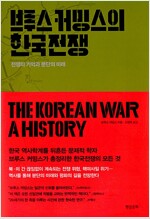알라딘 서지정보에 엉뚱한 책의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어 위와 같이 떴지만(앞의 이미지가 1996년판에 연결된 이미지, 뒤의 이미지는 맞게 올라온 2003년 개정판의 이미지.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87057033, 구글북스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D%98%84%EB%8C%80%EC%82%AC%EC%83%81%EA%B0%80_50_%EB%AC%B8%ED%99%94%EC%97%B0%EA%B5%AC%EB%A5%BC_%EC%9C%84.html?id=vOGDMQAACAAJ&redir_esc=y 에도 똑같이 잘못 올라와 있다),
1996년판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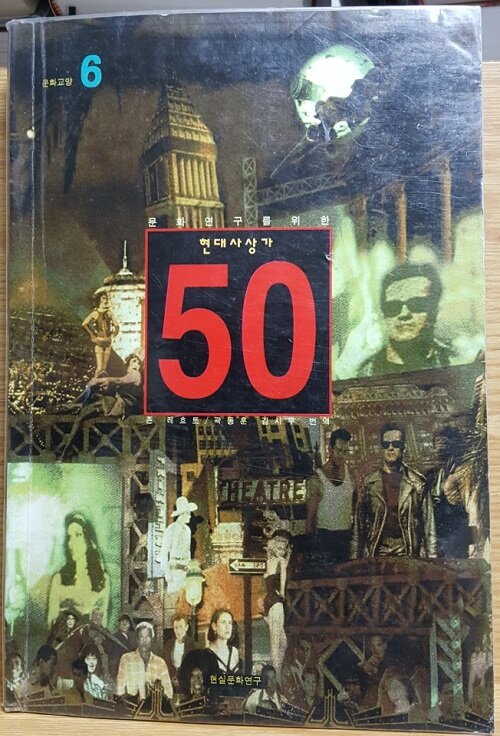
"현실문화(연구)"가 기획자(정성철, 박노영) 서문에 쓴 다음과 같은 문장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이 책은 숲 전체와 그 숲의 윤곽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몇 그루의 큰 나무들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찬탄할 만한 그물코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그 그물코는 그 윤곽이나 나무들에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상냥하다. 간간이 보이는,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해석을 깨뜨리는 저자의 독특한 해석과 예리한 비판적 안목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전기적 사항을 다루는 부분은 알맞은 양으로 요령있게 각 본문에 통합되어 있고 말미의, 원저와 영역서를 모두 포함한 서지정보 역시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다. 다루는 범위에서 서지정보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모든 장점들은 결국 이 책을 단순한 사상가 약전이라기보다는 구조주의 혁명과 그 여파에 대한 비판적 입문 '사전'으로 만든다. 이 책이 서점에서 사전류칸에 분류되더라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초기 구조주의, 구조주의와 구조주의 역사, 포스트구조주의, 기호학, 2세대 페미니즘(특히 뤼스 이리가레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모더니티, 포스트모더니티라는 분류하에 50명의 사상가를 소개한다. "나는 하이데거의 본을 따라,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얻는 데 도움을 주려 할 따름이다."라고 쓴 저자의 말처럼, 50인 사상가의 이론적 핵심에 더하여 간략한 전기와 더 읽을 문헌까지 소개되어 있어 공부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된다. 옮긴이들께서, 원작에는 포함되지 않은, 당시까지 국내에 나온 우리말 번역본과 논문까지 친절하게도 읽기 목록에 함께 소개해주셨다. 지금은 모두 절판되었지만, 2003년 개정판으로 읽으면 유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문화연구를 위한"이라는 제목을 "한 권으로 보는"으로 바꾼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에 책 소개가 실린 적이 있다(1996. 7. 6. 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3295161
지은이가 책을 구상하는 데 아래 Diane Collinson의 『Fifty Major Philosophers』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한다. 『~ 현대사상가 50』에서 다루는 시기 이전에 해당하는, 탈레스부터 사르트르까지(Thales, Pythagoras, Heraclitus, Parmenides, Zeno, Socrates, Democritus, Plato, Aristotle, Plotinus, Augustine, Maimonides, Aquinas, Duns Scotus, Ockham, Machiavelli, Bacon, Galileo, Hobbes, Descartes, Spinoza, Locke, Leibniz, Berkeley, Hume, Rousseau, Kant, Bentham, Hegel, Schopenhauer, Mill, Kierkegaard, Marx, Peirce, James, Nietzsche, Frege, Husserl, Russell, Moore, Wittgenstein, Collingwood, Heidegger, Popper, Quine, Merleau-Ponty, Ayer, Rawls, Sartre)를 다룬 책이다.

책이 다루고 있는 50인 사상가는 다음과 같다. 실존주의나 현상학 등 주체성 철학은 거의 빠졌지만, 아도르노와 아렌트, 하버마스가 (구조주의 혁명에 대한 비판적 반향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들어가 있으며, 총 50명이나 되다 보니 반드시 친숙하지만은 않은 Jean Cavaillès, Gerard Genette, Michèle Le Dœuff(이상 국내에 소개된 책이 없다), Algirdas Julien Greimas(『정념의 기호학』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다), Louie Hjelmslev (『랑가주 이론 서설』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Georges Dumézil은 『대담』 외에 해설서도 한 권 나와있다. '초기 구조주의' 장에 프로이트를, '모더니티' 장에 니체를 넣은 것이 의외인데, 역시 시대가 좀 앞서는 소쉬르를 차마 뺄 수는 없었을 테고(정작 '초기 구조주의' 장이 아니라 '기호학' 장에 포함시켰다. 그러다 보니 퍼스도 함께 들어갔다.), 나머지 사상가들에 미친 프로이트와 니체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뭐 반드시 빼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Diane Collinson의 책에도 니체와 메를로-퐁티, 퍼스가 나오기는 한다).
초기구조주의: 가스통 바슐라르, 미하일 바흐찐, 조르쥬 깡길렘, 쟝 까바이에, 지그문트 프로이트, 마르셀 모스, 모리스 메를로-퐁티
구조주의/구조주의 역사: 루이 알튀세르, 에밀 방브니스트, 삐에르 부르디에, 노엄 촘스키, 조르쥬 뒤메질, 제라르 쥬네트, 로만 야곱슨, 쟈끄 라깡, 끌로드 레비-스트로스, 크리스띠앙 메츠, 미셸 세르, 페르랑 브로델
포스트구조주의: 조르쥬 바타이유, 질 들뢰즈, 쟈끄 데리다, 미셸 푸코, 엠마누엘 레비나스
기호학: 롤랑 바르트, 움베르토 에코,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 루이 옐름슬레우, 줄리아 크리스테바, 챨스 샌더스 퍼스, 페르디낭 드 소쉬르, 츠베탕 토토로스
2세대 페미니즘: 뤼스 이리가라이, 미쉘 르 되프, 캐롤 페이트먼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테오도르 아도르노,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에르네스토 라 클라우, 알랭 뚜렌
모더니티: 발터 벤아민, 모리스 블랑쇼, 제임스 조이스, 프리드리히 니체, 게오르그 짐벨, 필립 솔레르스
포스트모더니티: 쟝 보드리아르, 마르그리트 뒤라스, 프란츠 카프카, 장 프랑스와 리오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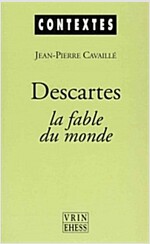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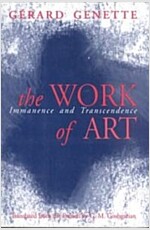















책을 지은 존 레흐트는 본인 스스로 여러 철학서를 내기도 했다. 『~ 현대사상가 50』 자체의 개정판도 2006년경에 나왔는데, 종래 부제 (Fifty Contemporary Thinkers:) "구조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티까지 From Structuralism to Postmodernity"가 제2판에서는 "구조주의에서 포스트휴머니즘까지 From Structuralism to Post-Humanism"로 바뀌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관한 연구서를 여럿 냈고, 2015년에는 아감벤에 관한 책을 냈다. 저자의 보다 상세한 연구 목록은 다음 페이지 참조 https://researchers.mq.edu.au/en/persons/john-lech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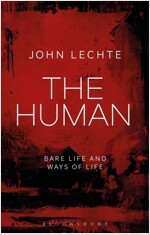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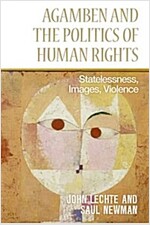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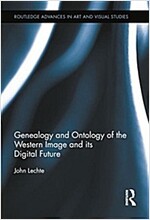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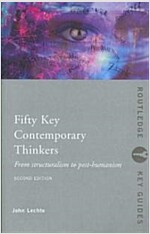


"현실문화(연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열풍(?) 중에 좋은 책들을 여럿 냈는데, 이 책 제1판과 개정판을 비롯하여 여러 책들이 절판된 것이 아쉽다. 다만, 출판사 운용에 매우 큰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스타니제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는, 1997년, 2006년에 이어 2011년 개정판이 다시 나왔고, 1999년에 나온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도 아직 팔리고 있다[위 책의 원제는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였다가 제2판에서 "An Introduction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로 바뀌고, 제3판부터는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n Introduction"이라는 제목을 쓰기 시작하여 현재 제8판까지 나와 있는데(제5판까지 나온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와는 다른 책이다), 제3판이 2004년 경문사에서 『대중문화와 문화연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2012년 제5판, 2017년 제7판이 나왔다]. 경문사에서 나온 『문화연구의 이론과 방법들』은 무슨 책을 번역한 것인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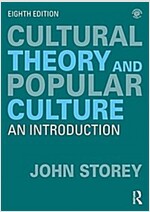





역시 "현실문화(연구)"의 대표작 중 하나로, 1996년에 나왔던 『스펙타클의 사회』는 번역 문장을 읽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2014년에 울력출판사에서 유재홍 번역으로 나온 것은 번역이 괜찮다는 것 같다.



그 밖에 추억의 책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문화연구' 시리즈가 유명한데,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1992),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1999),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1993), 『혼돈과 질서』,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1994), 『공간 문화 서울: 공간의 문화정치』, 『회사가면 죽는다』,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이는 '문화교양' 시리즈로 글로리아 스타이넘 역시 대학가에서 엄청 많이 읽혔는데, 위 책은 1995년, 1999년에 나오고 절판되었다) 등은 이미지나 책 정보가 없다. 1999년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는 올해 새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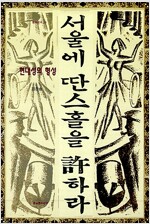

만화책도 여럿 있는데, 『설국열차』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판권이 넘어갔다(번역자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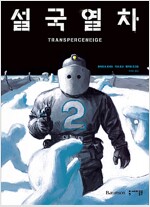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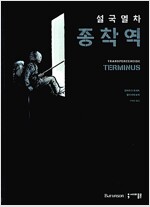




최근에 낸 여러 책들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The Korean War: A History, 2010)은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81, 1990)과는 다른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