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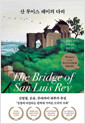
-
산 루이스 레이의 다리
손턴 와일더 지음, 정해영 옮김, 신형철 해제 / 클레이하우스 / 2025년 5월
평점 :



사고가 나면 왜 하필 나의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을까, 우리는 생각한다.
무의미한 의문이다. 사고가 났을 뿐, 그 사고에서 죽어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왜 사람은 죽는가일 것이다.
사람은 죽는다. 생명체는 유한한 목숨이란 것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 의문도 답없는 질문일 뿐이다. 그저 생명체의 조건일 뿐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환기시켜 주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납득을 하면서 멈추었던 일거리를 찾아 들 수 있다면, 또는 한밤의 잠자리에서 숙면에 들 수 있다면, 또는 떠난 이의 사진을 찢어지는 마음없이 볼 수 있다면, 이 소설은 창작되지도 지금까지 읽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 사람은 그리워하고 상처입는다. 심지어 자신이 권능자이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 그리움과 상처는 때로 자연의 순리와 사고의 재난을 벗어나, 떠난 이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 정도로 깊고 가혹하다. 사람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 소설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리움과 마음의 상처에 지극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생명체에게 건네는 작은 연고와 같다.
어디에도 완전한 약은 있을 수 없다.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의 어딘가에 남은 상처를 보면서 서로의 아픔에 눈시울을 붉힐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전부가 아닐지.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가진 전부이고 유일한 의지이자 힘이 아닐지. 이 소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답은 미미하게 느껴지는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한없이 커보이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 답은 미미하고 한 명 한 명 인물들의 삶은 한없이 크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한편 깨달음을 주는 핵심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이다. 한 명 한 명의 삶은 흐릿하고 답들이 아우성치다가 어느 순간 거품처럼 꺼지고 잊혀진다.
길지 않은 분량의, 거의 완벽해 보이는 단정한 구조를 지닌 이 소설은 먼 시공을 거슬러 이제야 내 책상에 도달했다.
에스테반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방향을 잃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거리를 배회하였다. 나는 에스테반의 외로움에 공명했다. 마음의 위로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했다. 나의 위로가 가닿았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조금 위로를 받았다.